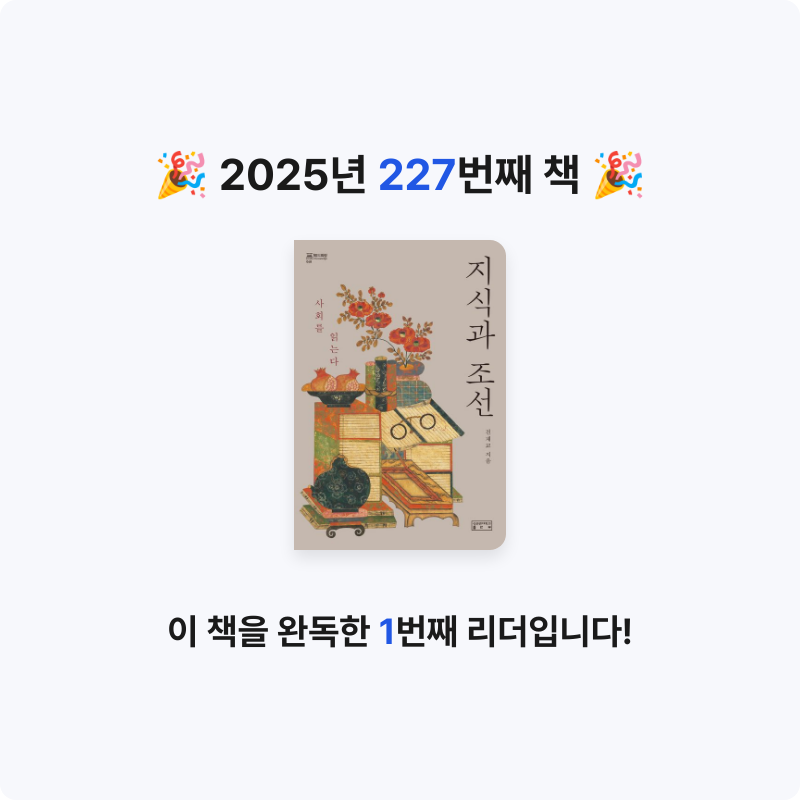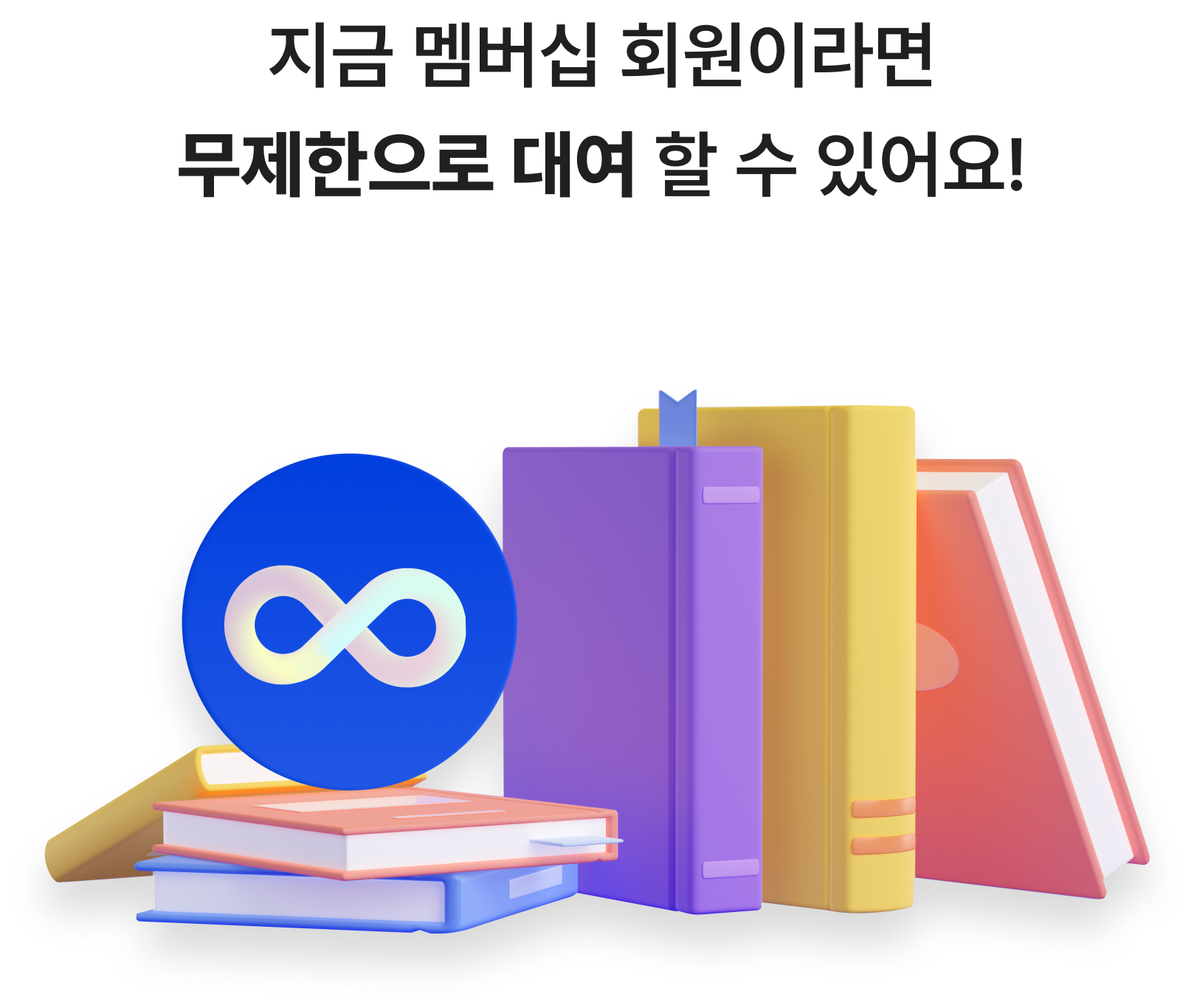지식과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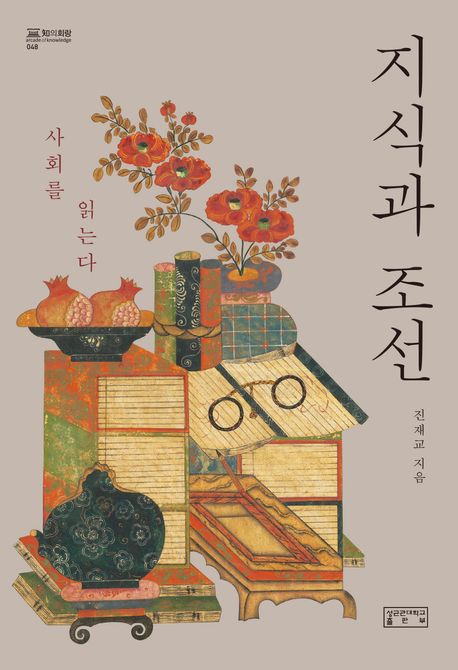
이 책을 읽은 사람

1명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두꺼운 책
출간일
2025.3.30
페이지
824쪽
상세 정보
근대 전환기, 역사의 흐름에서 뒤처져버린 조선에 문제의식을 품고 조선 후기 지식과 정보의 주체와 대상, 생성과 유통 그리고 그 사회사적 의미를 촘촘히 되짚어나간 시도다. 연이은 전란을 거치며 전 방위로 접속되기 시작했던 이문화 교류의 현장과 통신사와 연행사, 역관과 중간계층 등 신지식 탄생의 중추 세력들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집적해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져 나오던 서적들을 분석하면서 당대 문화가 살아 숨 쉬던 사회 공론장의 실체를 밝혀나간다.
저자는 국내외 공간에서 견문ㆍ체험ㆍ독서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그 축적 방식과 다양한 저술들, 한문 지식인 계층과 지식ㆍ정보와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으며, 개인과 지식ㆍ정보의 관계를 다루는 사적(私的) 영역은 물론, 사회와 지식ㆍ정보의 관계를 다루는 공적(公的) 영역에도 공히 시선을 두었다.
하지만 자유롭게 유통되던 지식과 정보들이 시간이 갈수록 공고화한 사족체제와 세도정치의 굴레 속에서 점차 독점화ㆍ위계화되어갔거니와 책의 종장은 이러한 지식의 권력화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지식 국가 조선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을 언급한 게시물1

프네우마
@pneu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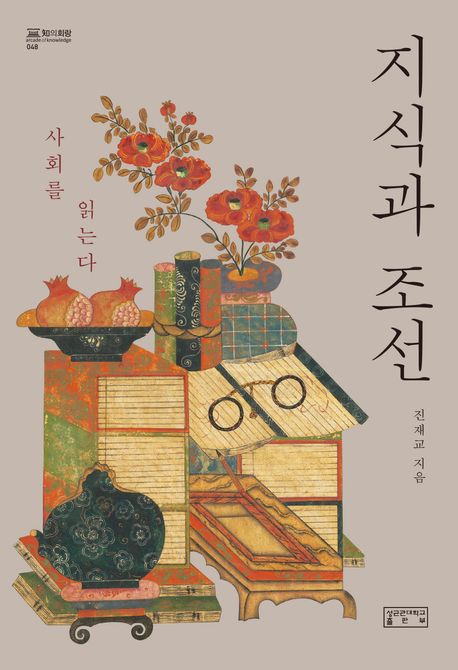
지식과 조선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상세정보
근대 전환기, 역사의 흐름에서 뒤처져버린 조선에 문제의식을 품고 조선 후기 지식과 정보의 주체와 대상, 생성과 유통 그리고 그 사회사적 의미를 촘촘히 되짚어나간 시도다. 연이은 전란을 거치며 전 방위로 접속되기 시작했던 이문화 교류의 현장과 통신사와 연행사, 역관과 중간계층 등 신지식 탄생의 중추 세력들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집적해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져 나오던 서적들을 분석하면서 당대 문화가 살아 숨 쉬던 사회 공론장의 실체를 밝혀나간다.
저자는 국내외 공간에서 견문ㆍ체험ㆍ독서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그 축적 방식과 다양한 저술들, 한문 지식인 계층과 지식ㆍ정보와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으며, 개인과 지식ㆍ정보의 관계를 다루는 사적(私的) 영역은 물론, 사회와 지식ㆍ정보의 관계를 다루는 공적(公的) 영역에도 공히 시선을 두었다.
하지만 자유롭게 유통되던 지식과 정보들이 시간이 갈수록 공고화한 사족체제와 세도정치의 굴레 속에서 점차 독점화ㆍ위계화되어갔거니와 책의 종장은 이러한 지식의 권력화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지식 국가 조선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도 주목하고 있다.
출판사 책 소개
세상이 근대의 문을 열어젖히던 시대 전환기
우리는 왜 그 궤도에서 이탈해버렸을까
당대 지식인들의 행보에 초점을 맞춰
조선 후기 지식의 공론장을 재조명해나간
지식과 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관한 문화사회학
이 책은 근대 전환기, 역사의 흐름에서 뒤처져버린 조선에 문제의식을 품고 조선 후기 지식과 정보의 주체와 대상, 생성과 유통 그리고 그 사회사적 의미를 촘촘히 되짚어나간 시도다. 연이은 전란을 거치며 전 방위로 접속되기 시작했던 이문화 교류의 현장과 통신사와 연행사, 역관과 중간계층 등 신지식 탄생의 중추 세력들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집적해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져 나오던 서적들을 분석하면서 당대 문화가 살아 숨 쉬던 사회 공론장의 실체를 밝혀나간다.
저자는 국내외 공간에서 견문ㆍ체험ㆍ독서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그 축적 방식과 다양한 저술들, 한문 지식인 계층과 지식ㆍ정보와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으며, 개인과 지식ㆍ정보의 관계를 다루는 사적(私的) 영역은 물론, 사회와 지식ㆍ정보의 관계를 다루는 공적(公的) 영역에도 공히 시선을 두었다.
하지만 자유롭게 유통되던 지식과 정보들이 시간이 갈수록 공고화한 사족체제와 세도정치의 굴레 속에서 점차 독점화ㆍ위계화되어갔거니와 책의 종장은 이러한 지식의 권력화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지식 국가 조선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선 후기 지식 사회의 한 독법을 제시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술기획총서 ‘知의회랑’의 마흔여덟 번째 책.
견문과 체험, 서적과 독서
저자가 이 책에서 조선 후기 견문과 체험의 통로로 집중한 건 전란(戰亂)과 사행(使行)이다. 물론 타국과의 전란은 비극적 사건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異)문물의 교차와 교류가 폭발하면서 새롭고 특이한 견문 체험의 총량이 급증했다. 사행을 통한 이문화의 실체험과 서적의 유입 또한 그간의 지식과 정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계기였다.
무엇보다 18~19세기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촉발한 것은 서적의 대량 유입과 유통이었다. 당대 사대부 지식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하면서 그 체험을 자신의 저작에 대거 활용했다. 청조(淸朝)에서 유입된 서적들은 전례 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선취해 독서한다는 것은 문예장과 학술장에서 새로운 무기를 지닌다는 의미였다. 그렇게 당대의 독서는 학예의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저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었다.
특히 다양한 국내외 서적의 구득과 독서는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력 토대는 물론, 학예적 안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활동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두루 지니고 당대 학예장을 선도한 집단이 바로 경화세족(京華世族)이었다. 이들은 최신의 지식과 정보로 무장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의 공론장을 좌지우지했다. 심지어 새로운 서적을 서로 돌려보거나, 베껴둠으로써 자신들만의 독서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화세족은 청조에서 서적을 들여와 가문의 컬렉션을 만드는 한편, 자신만의 장서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추동했다. 또 일부 경화세족은 개성적인 독서력과 학술 역량을 발휘해 필기(筆記)를 저술하면서 유통시켰다. 이들이 저술한 필기는 당대 학술과 문예의 수준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폭과 넓이를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 이 책에서는 19세기 대표적인 경화세족인 홍석주가(家)의 인사들과 그들의 필기류를 구체적으로 짚어나간다.
지식과 정보의 주체
조선 후기 사회의 지식체계 내에서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고 발신하며 소비하는 주체는 대체로 사대부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사회 질서와 가치를 생성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ㆍ사회적 위상을 토대 삼아 국내 학술장과 문예장에서 스스로 지식과 정보의 생성 주체임을 자임했다. 그리하여 지식과 정보를 전유하고 위계화하면서 상이하(上而下)의 방식으로 유통시켰다.
하지만 일국 밖에서의 상황은 이와 사뭇 달랐다. 국내에서는 사대부 지식인들의 비중과 역할이 컸지만, 일국 밖에서는 중간계층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역관(譯官)이다. 이들은 사행 과정에서 빈번히 지식과 정보의 발신자나 주체로 나섰다. 그리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해 국내로 전파시키기도 하고, 일국 밖에서 능동적으로 발화하기도 했다. 더구나 연행사행과 달리 통신사행에서는 서얼과 역관이 제술관(製述官)과 서기(書記)로 참여해 자신의 문재(文才)를 직접 발휘함으로써 문예의 발신자로 자임한 바도 있었다.
이렇게 당시 사행에 참여한 중간계층이 지식과 정보와 관련해 보인 생각과 행동은 전 시기와 크게 달랐다. 이들이 이국에서 체험하고 견문한 지식과 정보에는 새로운 것들은 물론, 서구(西區)로부터 전해진 다양한 신문물과 이문화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기존의 사대부 지식인들이 수용해 지식과 정보 질서의 창신(創新)에 활용하거나 하이상(下而上)의 공론장 형성으로 환원하는 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들이었다. 물론 이렇게 계층별로 당대 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랐던 건 그들 각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이 서로 달랐던 데서 연유한다.
그리고 사회 공론장과 지식 권력
이 책에서 주목하려는 또 하나의 주제가 조선 후기 사회체계 내에서 지식과 정보가 생성되고 유동되는 사회적 공간, 즉 공론장의 문제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지식과 정보는 권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식과 정보를 선점하고 장악하는 일 또한 권력의 향배와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족체제와 세도정치의 독점적 지배구조는 지식과 정보의 분화(分化)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당대 새로운 지식ㆍ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담보하는 횡적 공간이 차단되어버린 것이었다. 사족체제 및 신분 질서에 따르는 완고한 사회적 관습과 위계화된 지식ㆍ정보가 여전히 공론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새로운 지식ㆍ정보와 이를 확산시키는 횡적인 사회 공간은 끝내 형성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사대부 지식인은 자신들이 생성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 소통하고 전유하며 아래로 유통시켰지만, 아래로부터 올라온 지식과 정보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가치 기준과 사유에 부합하는 것들만 일부 받아들였으며, 그나마 받아들인 것도 자기들만의 기준과 사유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재단해버렸다. 그렇게 기왕의 지식체계 안에서 재배치되고 소비된 지식과 정보는 본래 의미를 잃고 축소ㆍ왜곡되었으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활력마저 억제 당했다.
사대부 지식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식ㆍ정보를 독점하면서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실현했기에, 지식과 정보는 고스란히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푸코가 말한 “늘 지식은 권력의 효과를 낸다”라는 명제를 소환하지 않더라도 지식과 정보의 독점은 권력 그 자체를 전유하는 것이었다. 이 역시 조선 후기 지식 사회를 논하는 데 빼놓아선 안 되는 주제로, 이 책의 종장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