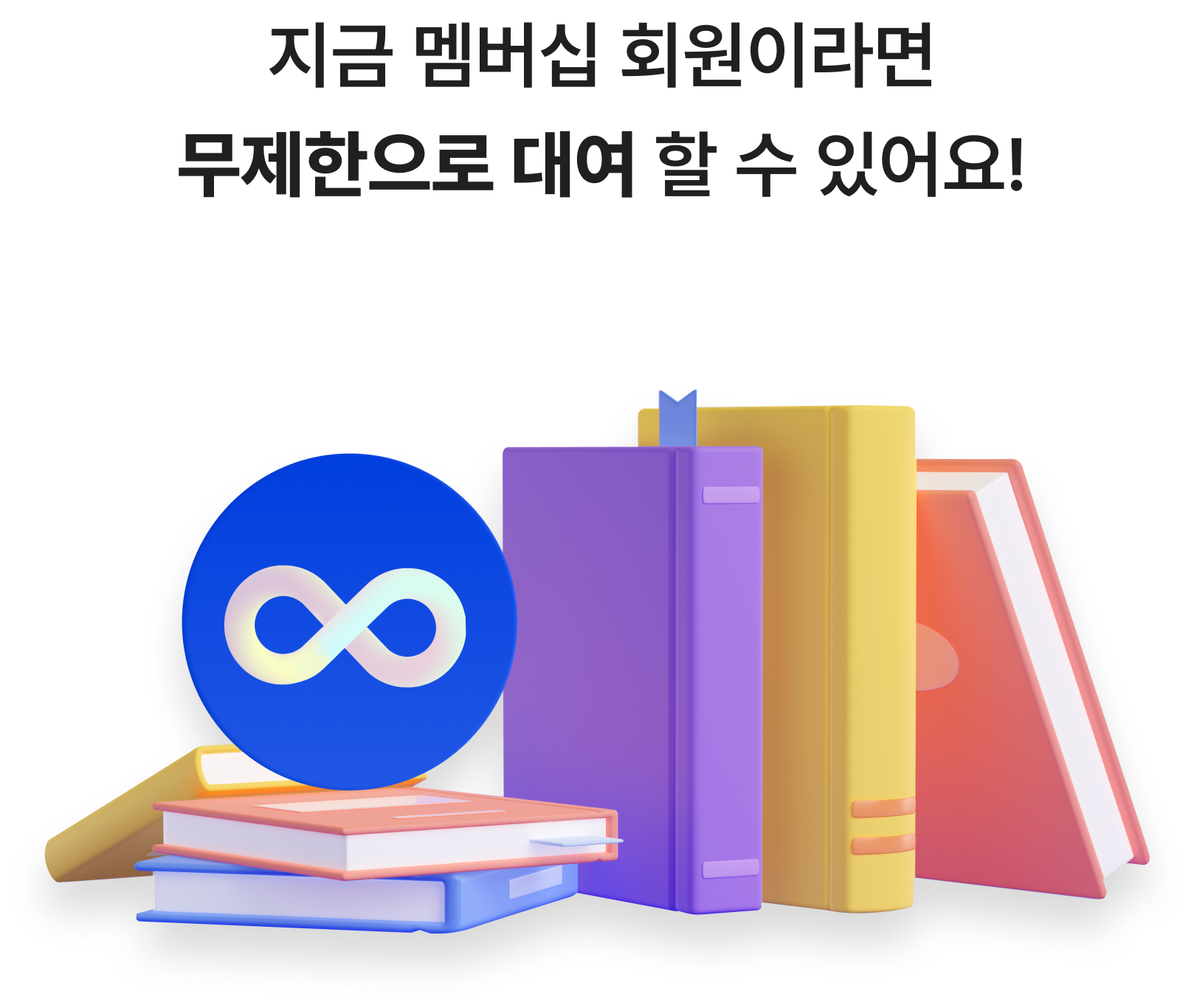모든 세계가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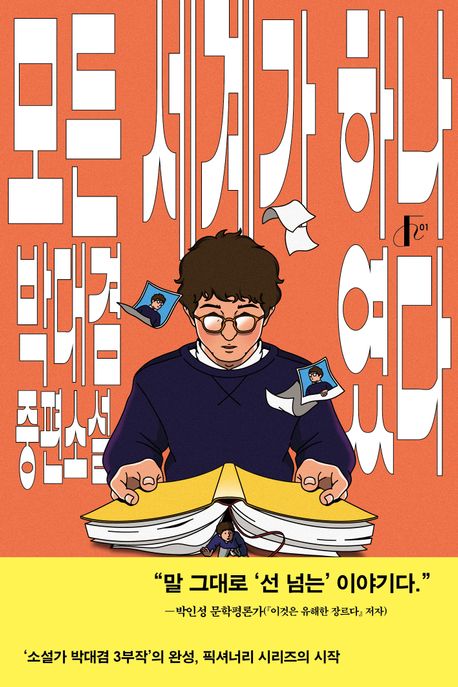
이 책을 읽은 사람

1명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얇은 책
출간일
2025.8.20
페이지
176쪽
상세 정보
박대겸의 『모든 세계가 하나였다』가 ‘북다’의 새로운 중편 시리즈 〈픽셔너리〉 첫 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픽셔너리’는 ‘픽션(Fiction)’과 ‘딕셔너리(Dictionary)’의 합성어로, ‘나’를 픽션화하는 A부터 Z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일종의 가상 사전이다. 작가는 이전 작품들을 통해 ‘소설을 쓰는 사람’과 ‘소설을 읽는 사람’ 간에 작동하는 소설의 원리를 집요하게 탐구하며, 그 관계 속에서 문학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지 보여주었다.
신작 중편소설에서는 삶과 허구, 픽션과 메타픽션의 과감한 패치워크를 통해 ‘소설을 쓰는 나’와 ‘소설로 쓰여지는 나’의 내밀한 역학관계를 드러내며 “말 그대로 ‘선 넘는’ 이야기”를 선보인다. 또한 패치워크된 이야기 조각을 또 한 번 비틀며 독자의 예상을 과감하게 넘어선다. 그 혼돈의 소용돌이를 뚫고 나오는 경쾌하고 뻔뻔한 유머는 박대겸 소설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매력에 다시금 빠져들게 한다. 『이상한 나라의 소설가』 『부산 느와르 미스터리』에 이어 이번에 출간된 『모든 세계가 하나였다』는 ‘소설가 박대겸 3부작’의 완성이자, 픽셔너리 시리즈의 시작이다.
상세정보
박대겸의 『모든 세계가 하나였다』가 ‘북다’의 새로운 중편 시리즈 〈픽셔너리〉 첫 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픽셔너리’는 ‘픽션(Fiction)’과 ‘딕셔너리(Dictionary)’의 합성어로, ‘나’를 픽션화하는 A부터 Z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일종의 가상 사전이다. 작가는 이전 작품들을 통해 ‘소설을 쓰는 사람’과 ‘소설을 읽는 사람’ 간에 작동하는 소설의 원리를 집요하게 탐구하며, 그 관계 속에서 문학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지 보여주었다.
신작 중편소설에서는 삶과 허구, 픽션과 메타픽션의 과감한 패치워크를 통해 ‘소설을 쓰는 나’와 ‘소설로 쓰여지는 나’의 내밀한 역학관계를 드러내며 “말 그대로 ‘선 넘는’ 이야기”를 선보인다. 또한 패치워크된 이야기 조각을 또 한 번 비틀며 독자의 예상을 과감하게 넘어선다. 그 혼돈의 소용돌이를 뚫고 나오는 경쾌하고 뻔뻔한 유머는 박대겸 소설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매력에 다시금 빠져들게 한다. 『이상한 나라의 소설가』 『부산 느와르 미스터리』에 이어 이번에 출간된 『모든 세계가 하나였다』는 ‘소설가 박대겸 3부작’의 완성이자, 픽셔너리 시리즈의 시작이다.
출판사 책 소개
‘소설가 박대겸 3부작’의 완성, 픽셔너리 시리즈의 시작
『외계인이 인류를 멸망시킨대』 『부산 느와르 미스터리』
박대겸 신작 중편소설
“말 그대로 ‘선 넘는’ 이야기다.”
―박인성 문학평론가(『이것은 유해한 장르다』) 추천
박대겸의 『모든 세계가 하나였다』가 ‘북다’의 새로운 중편 시리즈 〈픽셔너리〉 첫 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픽셔너리’는 ‘픽션(Fiction)’과 ‘딕셔너리(Dictionary)’의 합성어로, ‘나’를 픽션화하는 A부터 Z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일종의 가상 사전이다. 작가는 이전 작품들을 통해 ‘소설을 쓰는 사람’과 ‘소설을 읽는 사람’ 간에 작동하는 소설의 원리를 집요하게 탐구하며, 그 관계 속에서 문학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지 보여주었다.
신작 중편소설에서는 삶과 허구, 픽션과 메타픽션의 과감한 패치워크를 통해 ‘소설을 쓰는 나’와 ‘소설로 쓰여지는 나’의 내밀한 역학관계를 드러내며 “말 그대로 ‘선 넘는’ 이야기”를 선보인다. 또한 패치워크된 이야기 조각을 또 한 번 비틀며 독자의 예상을 과감하게 넘어선다. 그 혼돈의 소용돌이를 뚫고 나오는 경쾌하고 뻔뻔한 유머는 박대겸 소설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매력에 다시금 빠져들게 한다. 『이상한 나라의 소설가』 『부산 느와르 미스터리』에 이어 이번에 출간된 『모든 세계가 하나였다』는 ‘소설가 박대겸 3부작’의 완성이자, 픽셔너리 시리즈의 시작이다.
“탐정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순간,
아무리 에세이처럼 써봤자 완전히 픽션이 된다고.”
삶과 허구, 픽션과 메타픽션이 기워진 과감한 패치워크
그 혼돈의 소용돌이를 뚫고 나오는 경쾌하고도 뻔뻔한 유머
이 작품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독자는 스스로 묻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은 ‘소설가 박대겸’의 진짜 목소리일까, 아니면 ‘소설 속 박대겸’의 허구적 목소리일까. 그러나 작가는 이미 그런 반응을 예견한 듯, 첫 장면부터 미스터리적 상상력을 덧입혀 독자의 기대를 과감히 비튼다. 자정이 넘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박대겸’이 현관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낯익은 얼굴에 낯익은 복장”(11쪽)의 또 다른 박대겸과 마주하면서 소설은 마치 사건의 현장으로 독자를 이끄는 듯하다.
하지만 작품은 어느새 사건 현장을 말끔히 지워내고, 출판사로부터 청탁받은 원고 구상에 골머리를 앓으며, 신인 소설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출판사들이 밀집한 서울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부산의 부모님 댁에서 살아야 할지를 두고 갈등하는 현실적 어려움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그러나 소설가로서의 고충에 공감하려는 순간, 박대겸의 친구이자 탐정인 에른스트를 등장시키며 소설은 또 한 번 장르적 비틀기를 시도한다. “소설에 탐정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순간, 아무리 에세이처럼 써봤자 완전히 픽션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한국에서 탐정이라는 직업은, 비유하자면 유니콘 같은 존재니까.”(31쪽)
“어떤 세계를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세계도 결코 쓰일 수 없다.”
소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진심으로 믿는 일
이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였다』에서 작가는 삶과 허구, 픽션과 메타픽션의 조각들을 능숙하게 이어 붙인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패치워크 원단은 소설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재단된다. 작가는 “소설과 현실이란, 언제든 뒤섞이고 뒤엉키고, 분리되는가 싶다가도 다시 뒤범벅되는 무언가”(87쪽)라고 말하며, 어떤 세계를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세계도 결코 쓰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작가는 또 한 번의 ‘선’을 넘어선다. “그렇다면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조금 다른 시간대의, 우리와 조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는 것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발상은 더욱 부풀어 올라 어쩌면 내가 창작한 ‘소설가 박대겸’ 역시 다른 평행우주에서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다른 세계의 ‘나’ 역시 소설을 쓴다면?”(48쪽)라는 물음으로, 소설은 확장된 상상력으로 나아간다.
박대겸은 능란하게 직조한 ‘불일치의 세계’를 통해, ‘소설을 쓰는 작가’에게도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소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진심으로 믿는 일이라고. 이것은 곧 작가가 소설이라는 허구적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세계에 품는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다가온다.
부산, 서울, 일본, 어느 곳에 있든, 평행우주 속 어느 세계에서든, 박대겸은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글을 쓸 것이라 확신한다. (……) 여기 박대겸 작가가 현실의 재료를 알뜰살뜰히 가공해 만든 이 소설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보증할 수 있다. (신동화 번역가, 「추천의 글」에서)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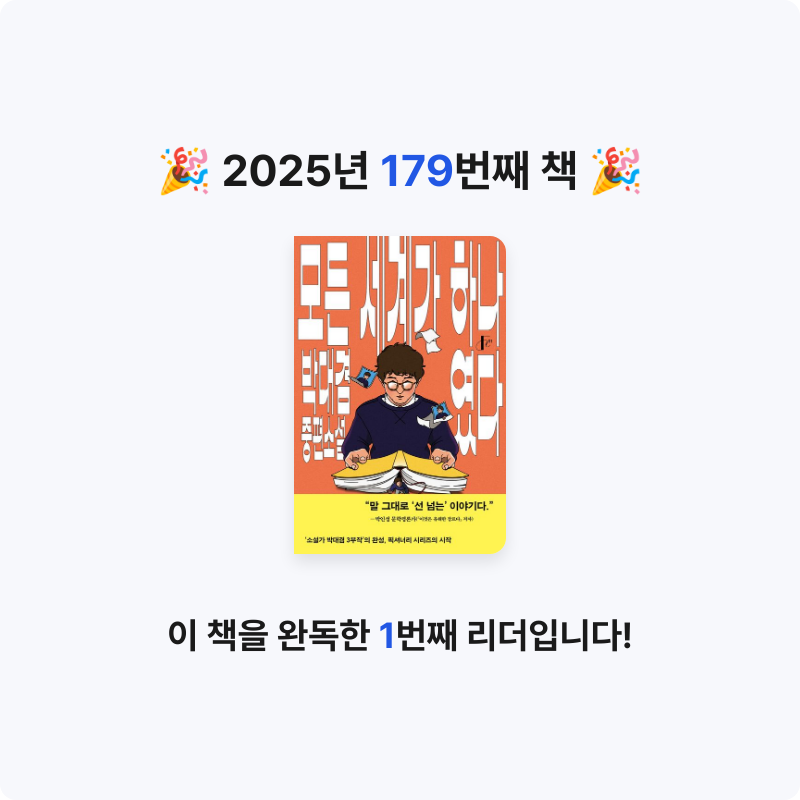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