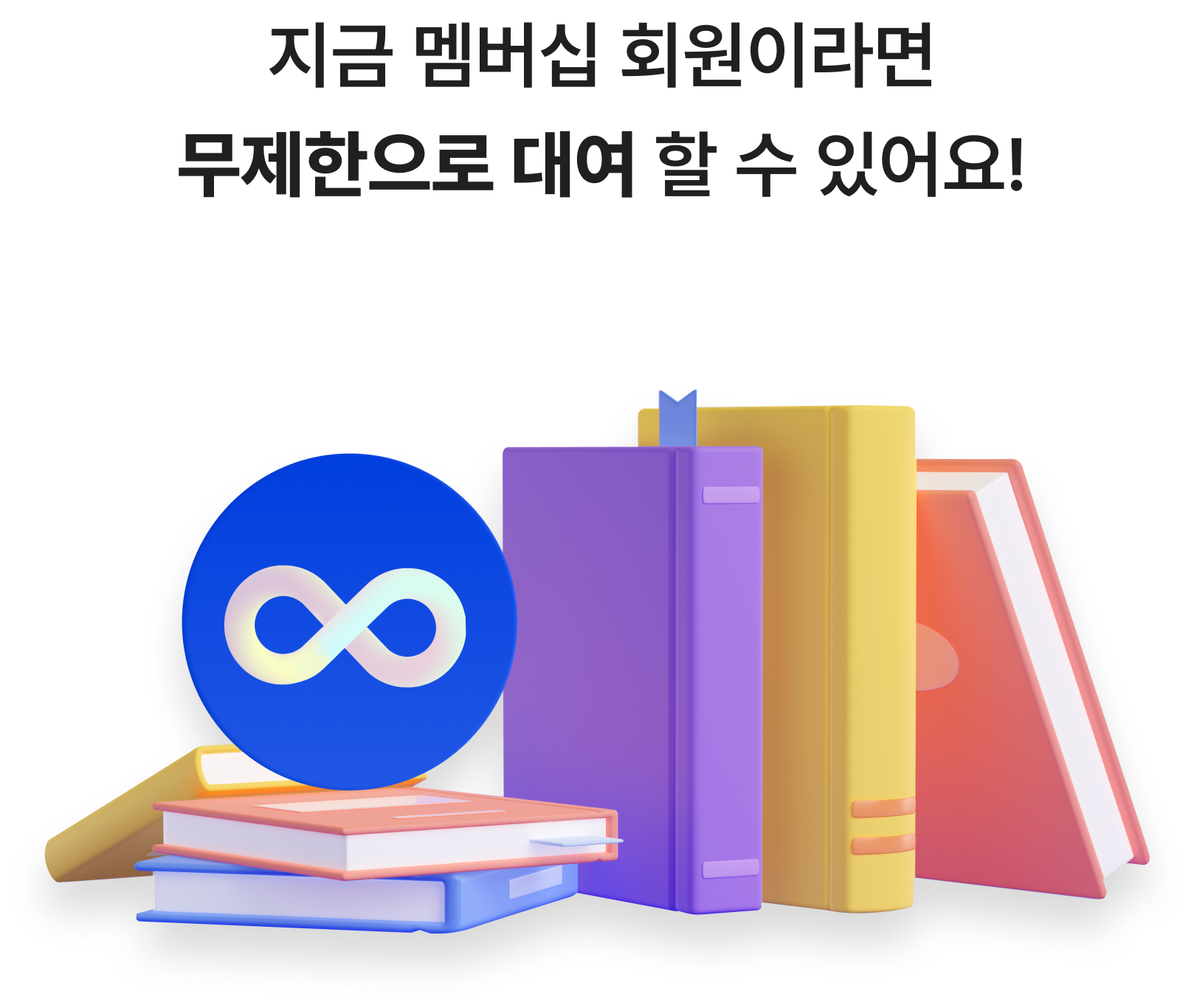올드걸의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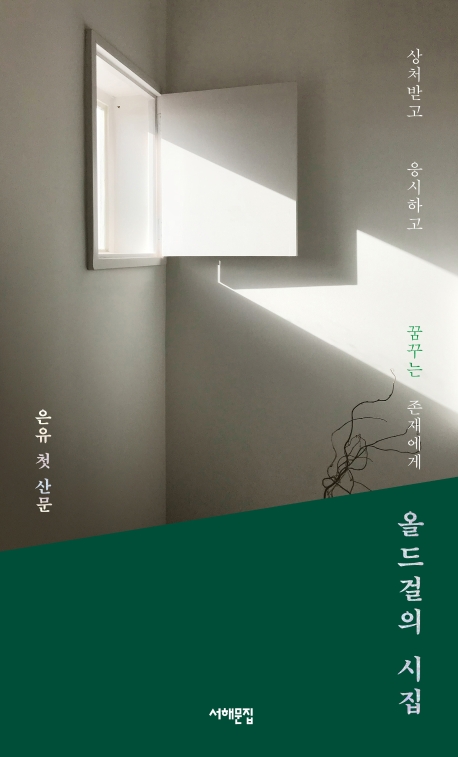
이 책을 읽은 사람



3명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보통인 책
출간일
2020.6.5
페이지
280쪽
상세 정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가오는 말들>로 타인의 입장에 서는 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작가, 은유의 첫 산문집. <올드걸의 시집>은 2012년 출간되었다가 3년 만에 절판되었다. 그 후 절반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로 세상 빛을 보았지만, 이 책은 정가의 두세 배 가격으로 중고 거래될 만큼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복간 요청이 꾸준했다.
내용 누락 없이 다시 돌아온 <올드걸의 시집>에는, 한 여자가 돈·권력·자식을 삶의 주된 동기로 삼지 않고 늘 회의하고 배우는 주체로 설 수 있게 해 준 마흔여덟 편의 시가 담겨 있다. 세상의 고통과 감응하는 에세이스트 은유의 삶과 시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절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타자의 언어를 이해하며 나를 허물어뜨린 자리에 남을 들여놓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언급한 게시물2

이주연
@yijuyeonxm0c
시집읽기의 밀도가 남다르다고 느꼈는데, 시의 문장에서 길어내는 생각의 흐름들이 많이 읽고 자신만의 해석과 시의 운율이 주는 그 울림을 자신화하는 해석들을 통해서 이런 글들을 쓰게 된 저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순서대로 하자면 가장 처음 출간작인데 그녀의 다른 책들을 읽다보니 오히려 제일 늦게 읽은 셈이다. 근래에 발표한 인터뷰집은 아직 읽지 못했으나, 이 작가만의 생각의 흐름, 사상의 배경들이 기인되는 일상과 여정을 들여다본 느낌이다.
블로그에 썼던 글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때 글을 쓰면서 달래곤 했다던 기록들이라서, 주부로서의 정체성, 독서가로서의 자기 성향, 인생 나름의 롤러콜스터를 탔던 개인사들이 함께 보여지면서 비슷한 또래로서 삶을 이어나가는 공감대와 응시를 하게 된다.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전환시키고 글로 다듬어 내는 글의 교본 같은 느낌도 받았다. 몇 편 들은 다른 그녀의 저작들에 실려서 읽었던 편이 있었는데, 나름 시점이 오래 된 글인데도 낡은 느낌이 아니라 그 나이와 그런 성향과 그런 자의식이 있는 이라면 더없이 공감했으리라. 혹여 같은 성향이 아닐지라도 글맛의 진실성과 담담함이 주는 간결미가 화려한 상찬이 아니질라도 담백한 밥을 먹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정의한 올드걸이란 이러하다.
누군가 나에게 올드걸의 정의를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돈이나 권력, 자식을 삶의 주된 동기로 삼지 않고 본래적 자아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늘 느끼고 회의하고 배우는 '감수성 주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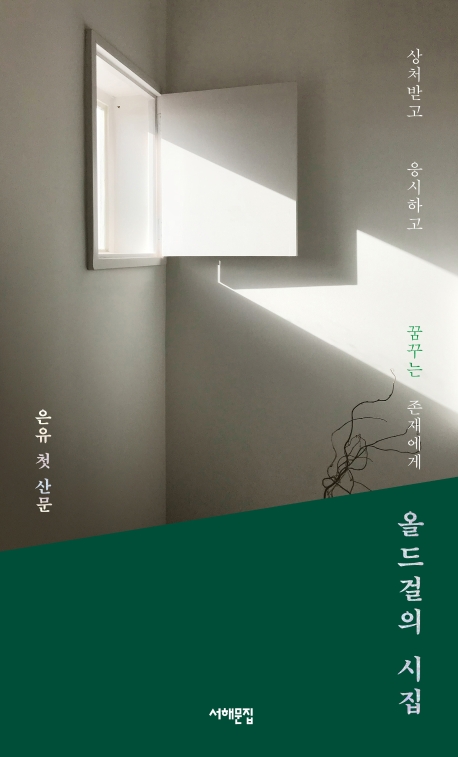
올드걸의 시집

1명이 좋아해요
 1
1
 0
0

김진경
@74hyg5q8lp2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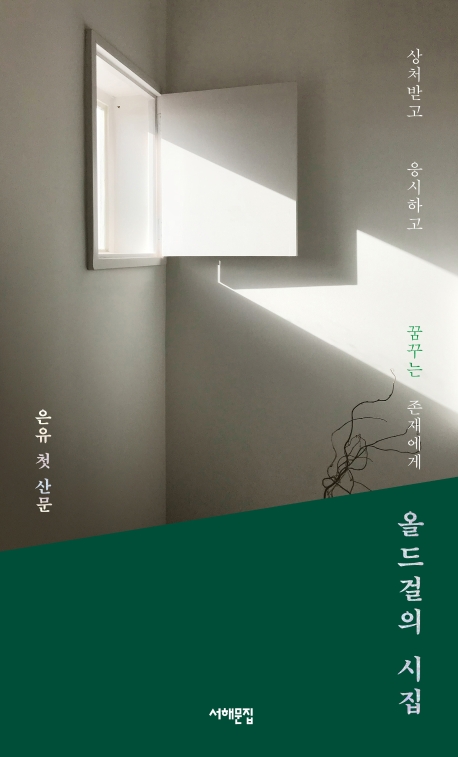
올드걸의 시집

1명이 좋아해요
 1
1
 0
0
상세정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가오는 말들>로 타인의 입장에 서는 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작가, 은유의 첫 산문집. <올드걸의 시집>은 2012년 출간되었다가 3년 만에 절판되었다. 그 후 절반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로 세상 빛을 보았지만, 이 책은 정가의 두세 배 가격으로 중고 거래될 만큼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복간 요청이 꾸준했다.
내용 누락 없이 다시 돌아온 <올드걸의 시집>에는, 한 여자가 돈·권력·자식을 삶의 주된 동기로 삼지 않고 늘 회의하고 배우는 주체로 설 수 있게 해 준 마흔여덟 편의 시가 담겨 있다. 세상의 고통과 감응하는 에세이스트 은유의 삶과 시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절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타자의 언어를 이해하며 나를 허물어뜨린 자리에 남을 들여놓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출판사 책 소개
은유는 오래 전부터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고 존재가 존재를 닦달하지 않는 세상’을 꿈꿔 왔다. “이는 아주 일상적으로는 끼니마다 밥 차리는 엄마의 고단함을 남편과 아들이 알아보는 것이고,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경비실에서 일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다.”(22쪽)
이 꿈은 12년 전 사는 일이 버거울 때 찾았던 ‘시집’과 함께 시작되었다. 시는 결혼·육아·일에서 맞닥뜨리는 불가해한 고통에 맞설 수 있게, 아내·엄마·문필하청업자로 살며 겪은 절망들을 직시할 수 있게 했다. 그리하여 “생이 가하는 폭력에 질서를 부여”하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사유하는 인간”임을 느끼게 했다. 마흔여덟 편의 시가 휘저어 화르르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사유의 지층들, 저자는 그 속에서 여자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나둘 꺼내어 모았고, 그렇게 《올드걸의 시집》이 탄생했다.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던
한 여자의 분투와 수없이 무너졌던 실패의 기록
그 휘청이는 날들 곁에 있어 준 마흔여덟 편의 시
이십 대에 엄마가 되어 정신없이 살다 마흔에 다다랐을 즈음, 저자는 일상의 아수라장 속에서 불행을 느끼는 순간마다 ‘나이 든 소녀(올드걸)’와 마주했다. 평소엔 주로 아내나 엄마로 있었기에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눈가의 물기와 사유의 탄력을 잃지 않는 존재로, 돈·권력·자식을 삶의 주된 동기로 삼지 않고 늘 느끼고 회의하고 배우는 주체로 살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한다.
올드걸로서의 욕망과 저항은 시에 기대어 천천히 언어화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 놓고 상대에게 속죄하는 영화를 향해 사랑을 모독하지 말라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함성호, 〈낙화유수〉)라고 이야기한다. 생계를 위해 식탁 구석에 밀어뒀던 책을 당겨 부산스레 글을 짓다 “밥 먹는 곳에 책 좀 늘어놓지 말라”는 남편의 말을 들은 날, 김선우의 시(〈뻘에 울다〉)를 읽고 “식탁이면서 식탁이 아니기도 했던 모호함이 나에겐 숨구멍이었”다고 쓴다. 부자유하고 부담스러운 시댁에서 무기력해질 때면 유하의 시(〈달의 몰락〉)를 빌려 “나의 쓸모없음을 사랑한다”고 되뇌인다. 아들의 고등학교 진학으로 알게 된 불공정한 계급 재생산을 비판하며 아들에게 “내가 죽어 넘어진 곳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루쉰의 말을(〈아이들에게〉) 건넨다.
시선은 나와 가족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무수한 아픔을 향해 확장된다. 김사인의 시(〈바짝 붙어서다〉)와 자주 지나다니던 동네 어귀에서 처음으로 폐지 줍는 노인을 본 기억이 만나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보는 능력이 퇴화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흐른다. 지하철 개찰구 주변을 서성이는 청소년을 불행한 애라고 단정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기형도의 시(〈기억할 만한 지나침〉)를 읽는다. 일을 하다 자본의 속도에 치여 남을 원망하게 될 때는 최영미의 시(〈행복론〉)를 보며 “자신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말”고, 주변의 것들과 어우러지는 행복한 삶의 속도를 만들어가기로 한다.
“나는 시를 통해 고통과 폐허의 자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법을 배웠다”
나이 든 여자에게 꿈이 뭐냐고, 무얼 욕망하느냐고, 어떤 슬픔이 있냐고 묻는 것은 왠지 어색하다. 하지만 저자는 시를 마중물 삼아 자신에게 끈질기게 묻고 답한다. 사회적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다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수없이 실패한다. 그 과정을 담담히 기록한다. 그리고 힘주어 말한다. 어딜 가나 치유와 긍정의 말들을 사나운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얼굴에 들이대어 삶에 눈멀게 할 때, 시는 은은히 촛불 밝혀 삶의 누추한 자리를 비춰 준다고. 배신과 치욕과 설움이라는 삶의 절반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덮어 두는 그 구질구질한 기억의 밑자리를 끝내 밝힌다고.
“흔한 기대처럼 시는 삶을 위로하지도 치유하지도 않는다. 백석 시인이 노래했듯이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할 뿐이다. 사는 일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굳이 삶을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시가 내게 알려 준 것도 삶의 치유 불가능성이다. 시를 통해 나는 고통과 폐허의 자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법을, 고통과의 연결 고리를 간직하는 법을 배웠다. 일명 진실과의 대면 작업이다. 어디가 아픈지만 정확히 알아도 한결 수월한 게 삶이라는 것을, 내일의 불확실한 희망보다 오늘의 확실한 절망을 믿는 게 낫다는 것을 시는 귀띔해 줬다.”(18쪽)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