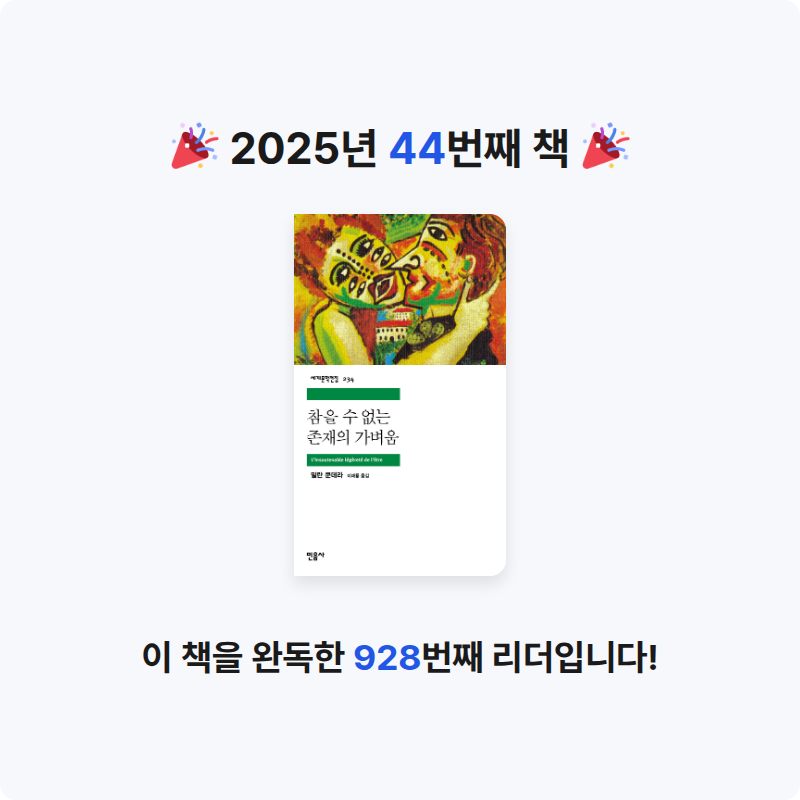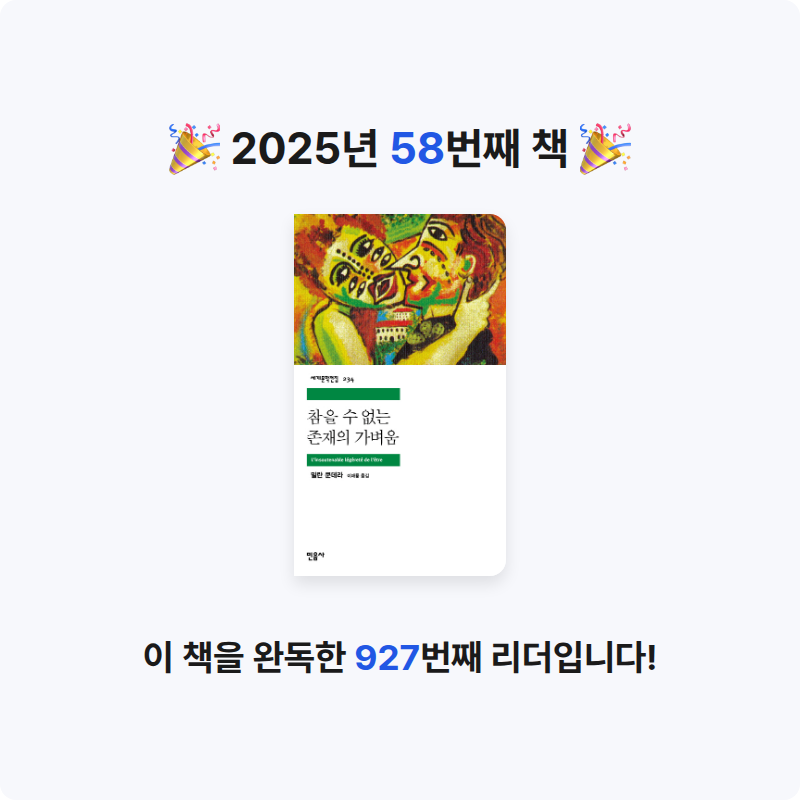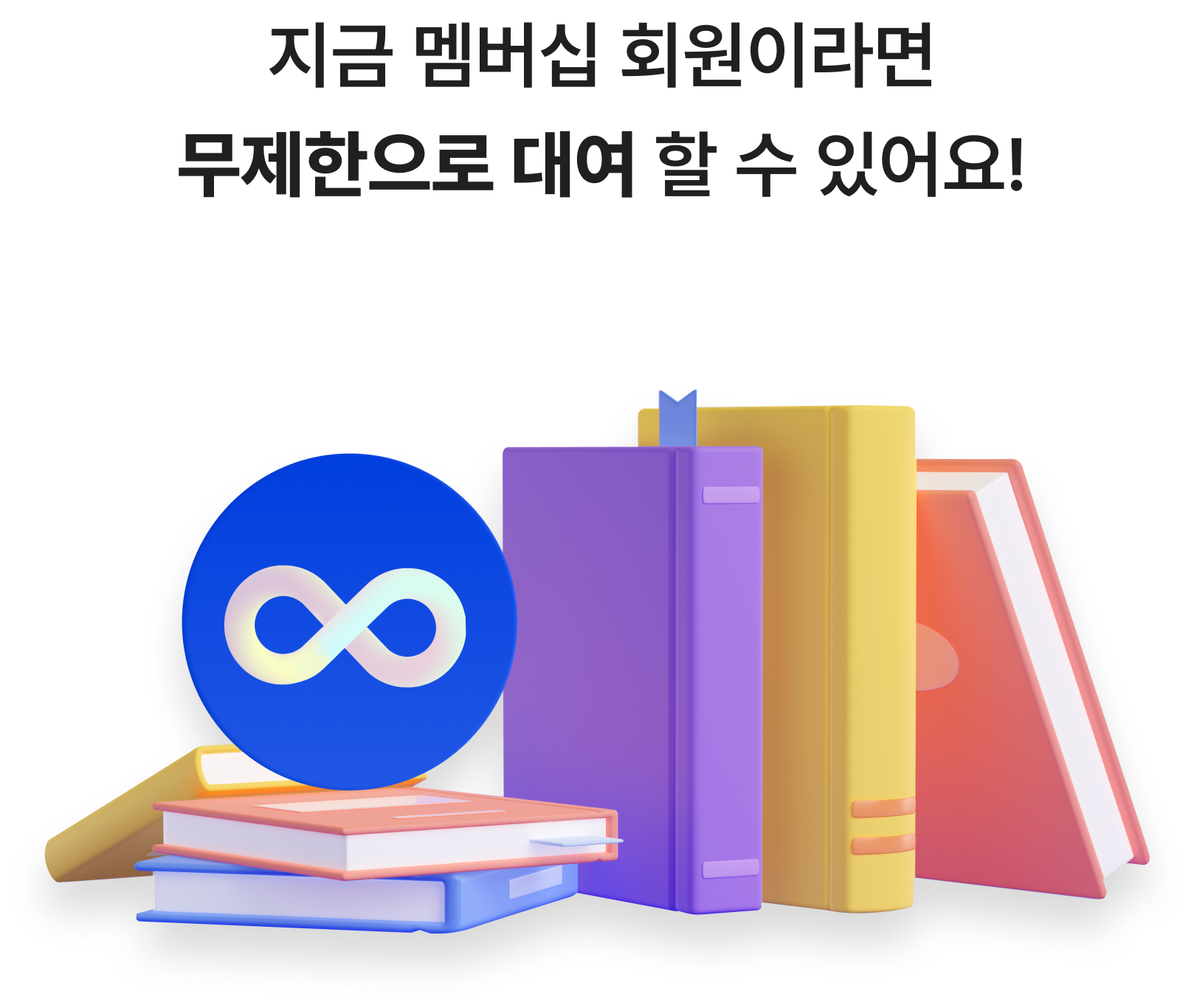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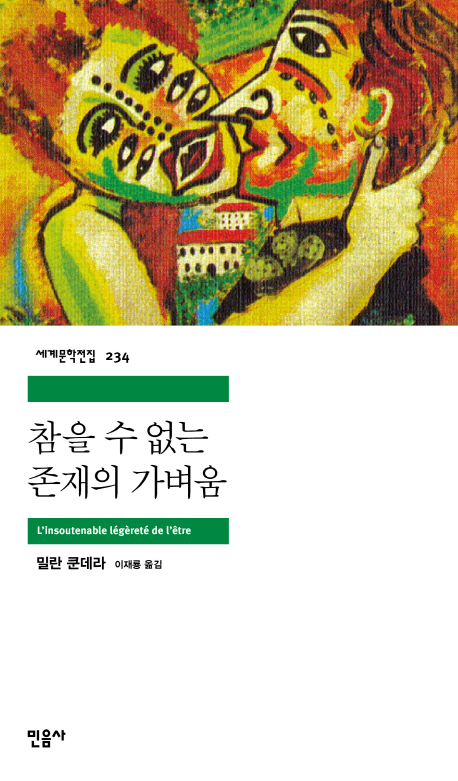
이 책을 읽은 사람



930명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두꺼운 책
출간일
2009.12.24
페이지
496쪽
이럴 때 추천!
불안할 때 , 달달한 로맨스가 필요할 때 , 힐링이 필요할 때 읽으면 좋아요.
상세 정보
사랑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네 남녀의 사랑을 통해 바라본 삶의 초상
역사의 상처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존재의 가벼움을 느껴 보지 못한 현대인, 그들의 삶과 사랑에 바치는 소설.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어느 쪽이 옳은가. 니체의 영원한 재귀는 무거움이지만 실제요, 진실이다. 반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이기에 비교도 반복도 되지 않아 깃털처럼 가볍다. 질투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약한 테레자, 사비나의 외로운 삶. 토마시에게 테레자는 무거움이요 사비나는 가벼움이다.
일인칭이면서 전지적이요 직선이 아닌 반복서술, 그리고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의 와해, 그런 메타포에서 탄생한 인물들. 쿤데라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매끄러움과 개연성을 거부하는 실험적인 기법들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아픔과 삶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을 언급한 게시물92

잇션
@twxsxyxx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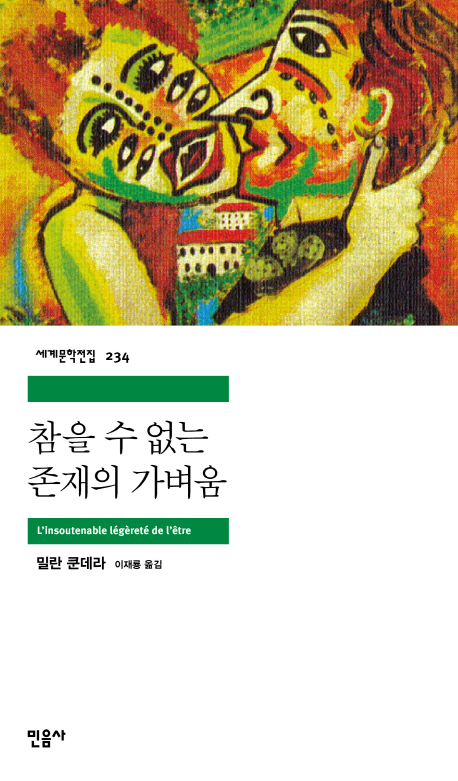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호롤로
@chw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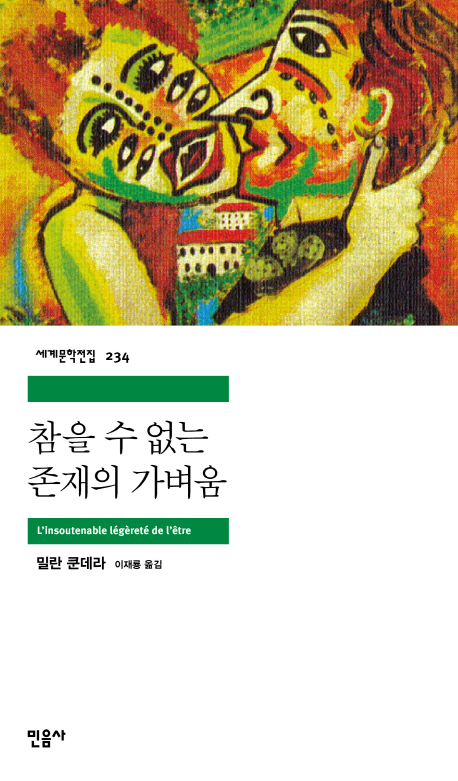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reimorange
@reimo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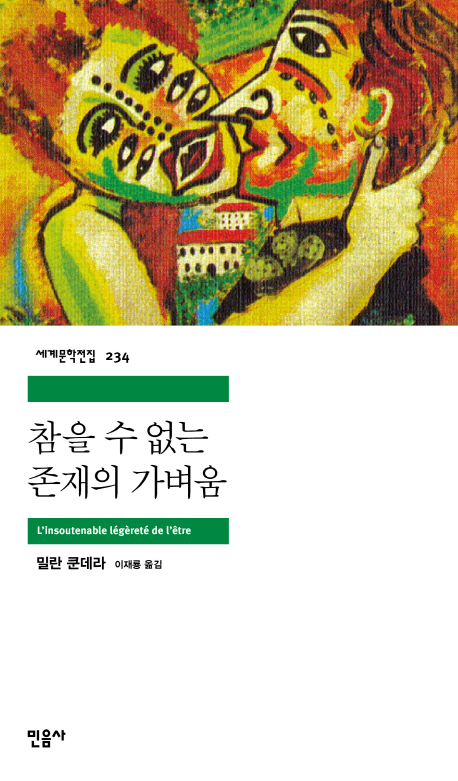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상세정보
역사의 상처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존재의 가벼움을 느껴 보지 못한 현대인, 그들의 삶과 사랑에 바치는 소설.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어느 쪽이 옳은가. 니체의 영원한 재귀는 무거움이지만 실제요, 진실이다. 반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이기에 비교도 반복도 되지 않아 깃털처럼 가볍다. 질투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약한 테레자, 사비나의 외로운 삶. 토마시에게 테레자는 무거움이요 사비나는 가벼움이다.
일인칭이면서 전지적이요 직선이 아닌 반복서술, 그리고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의 와해, 그런 메타포에서 탄생한 인물들. 쿤데라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매끄러움과 개연성을 거부하는 실험적인 기법들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아픔과 삶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출판사 책 소개
‘참을 수 없는’ 생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오가는 우리들의 자화상
토마시와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테레자는 고향을 떠나 그의 집에 머문다. 테레자는 토마시를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지한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던 토마시는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 스스로가 ‘에로틱한 우정’이라고 이름 붙인 그 ‘가벼움’을 토마시는 버릴 수가 없다. 소련의 침공으로 체코가 자유를 잃은 후, 두 사람은 함께 스위스로 넘어간다. 체코를 벗어나면 토마시의 연인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테레자는, 그 믿음을 잃은 후 홀로 국경을 넘어 프라하로 돌아간다. 질투와 미움이 뒤섞인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점차 무게를 더해 간다.
한편 토마시의 연인 사비나는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조국과 역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밥을 먹어도, 그림을 그려도, 거리를 걸어도 자신에겐 ‘조국을 잃은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그녀는 견딜 수 없다. 사비나는 체코에서 멀리,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떠난다. 학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안정된 일상을 누리던 프란츠는 그런 사비나의 ‘가벼움’에 매료되고, 그는 보이지 않는 사비나의 흔적을 좇듯 역사의 흐름에 몸을 던진다.
1968년 프라하의 봄, 역사의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네 남녀의 사랑은, 오늘날 ‘참을 수 없는’ 생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오가며 방황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20세기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밀란 쿤데라의 대표작
한 사람의 인생이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소한 우연이든 의미심장한 우연이든, 우리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쿤데라는 베토벤의 곡을 빌어 해답을 찾고자 한다. “Es Muss Sein!"(그래야만 한다!)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따라 흘러가는 이 소설의 배경에는 1960년대 체코와 1970년대 유럽을 뒤흔들어 놓은 시련이 깔려 있다. 지금은 멀어져 버렸지만 쿤데라의 작품 한복판에 주인공인 양 요지부동으로 박혀 있는 체코. 작가의 근원은 체코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쿤데라는 그의 최근 에세이 『커튼』을 통해 사회 운동, 전쟁, 혁명과 반혁명, 국가의 굴욕 등 역사 그 자체는 소설가가 그려야 할 대상, 고발하고 해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설가는 “역사가의 하인”이 아니며 소설가를 매혹하는 역사란, 오직 “인간 실존에 빛을 비추는 탐조등으로서의 역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역사로서의 예술, 혹은 예술의 역사는 덧없으며 “예술의 지저귐은 영원할 것”이라는 쿤데라의 말처럼, 이 작품은 역사에서 태어났으되, 역사를 뛰어넘는 인간의 실존 그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받는 불멸의 고전으로 남을 것이다.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