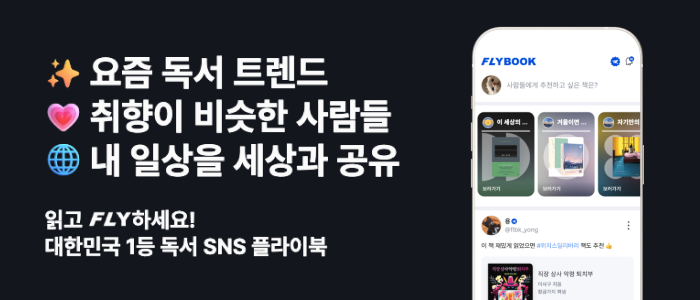패션 MD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보통인 책
출간일
2017.9.11
페이지
253쪽
상세 정보
추천 게시물

에버네버
@yhkles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책장에 꽂힌 채로 한참이나 들여다 보다가 (<맡겨진 소녀>보다 훨씬 더 큰 책인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 후에 집어들었다. 소설가의 온전한 이야기가 아닌,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임으로 훨씬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다.
첫 문단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읽어내려갔다. (그러니까 옮긴이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 알아채지 못했다.ㅠㅠ) 펄롱의 이야기를 따라 읽다가 이 짧은 책이 언제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려나...걱정되기 시작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 <맡겨진 소녀> 또한 뭔가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따윈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 <이처럼 사소한 것들> 또한 마찬가지다. 말도 안되는 사건(아일랜드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을 그저 바깥의 마을 사람들과 그나마 인간적인,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펄롱을 따라가기만 한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그저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소설은 ...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섦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은,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도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119p
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손해 보기 싫어서, 뭔가 피해를 입을까봐 나서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나이가 드니 좀 용감해진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용기에 오히려 젊을 적 소리소리 지르던 남편이 말릴 지경. 나 혼자 잘 살아봤자 뭐 하겠나~ 내 뒤를 이어 내 자식이,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지금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잃더라도 옳지 않은 것들은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
소설을 읽으며 울컥거리는 건, 바로 이런 감정들 때문일 거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임을 알겠다. 또 읽고, 또 읽어서 작가가 숨겨놓은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싶다. 역시 훌륭한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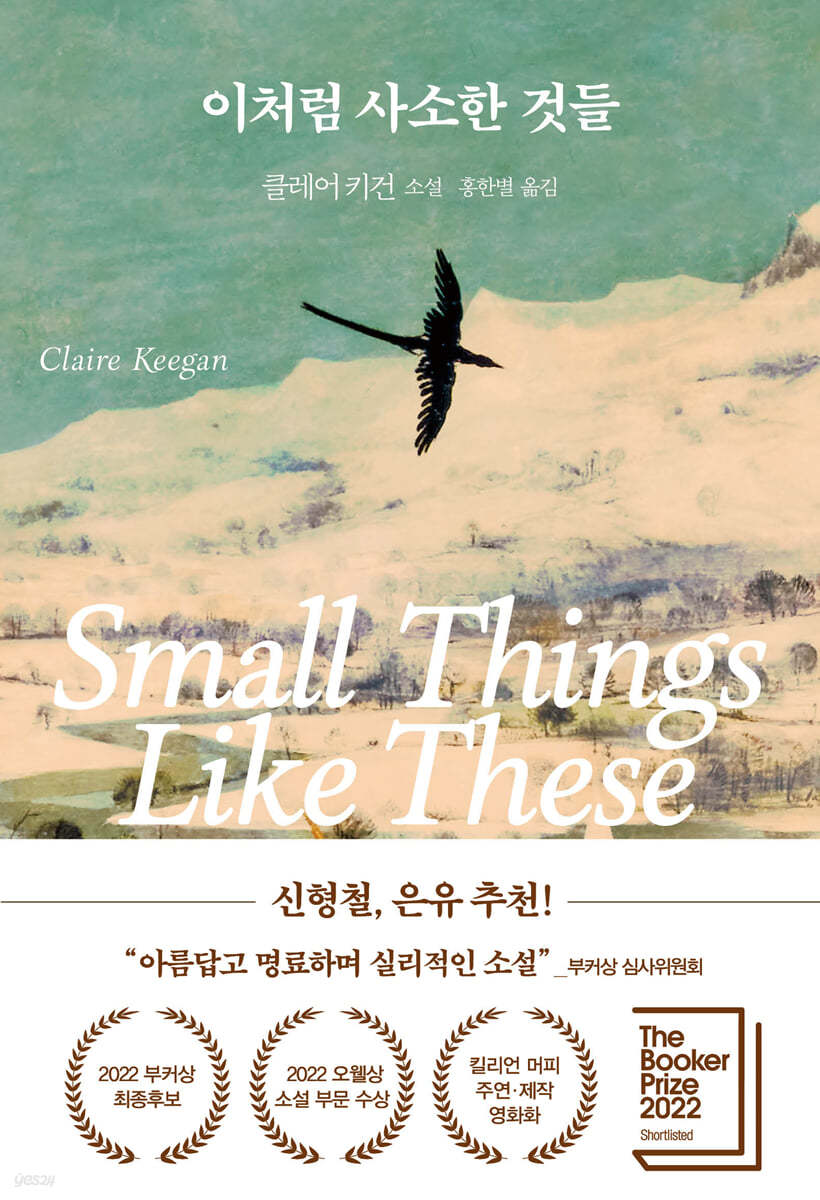
이처럼 사소한 것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카나페
@canape0809
<안네의 일기>- 책 리뷰
https://m.blog.naver.com/canape0809/223862917756

안네의 일기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카나페
@canape0809
<안네의 일기>- 책 리뷰
https://m.blog.naver.com/canape0809/223862917756

안네의 일기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이런 모임은 어때요?
-

정모/행사 주말 독서 챌린지
5월 12일 (월) 오전 12:00 · 무료 · 3 /3명
-

2025년 상반기 독서 챌린지(경기도청 북부청사)
무료 · 89 /제한 없음
-

정모/행사 아침독서챌린지 테스트(도서부용)
5월 7일 (수) 오전 12:00 · 무료 · 22 /23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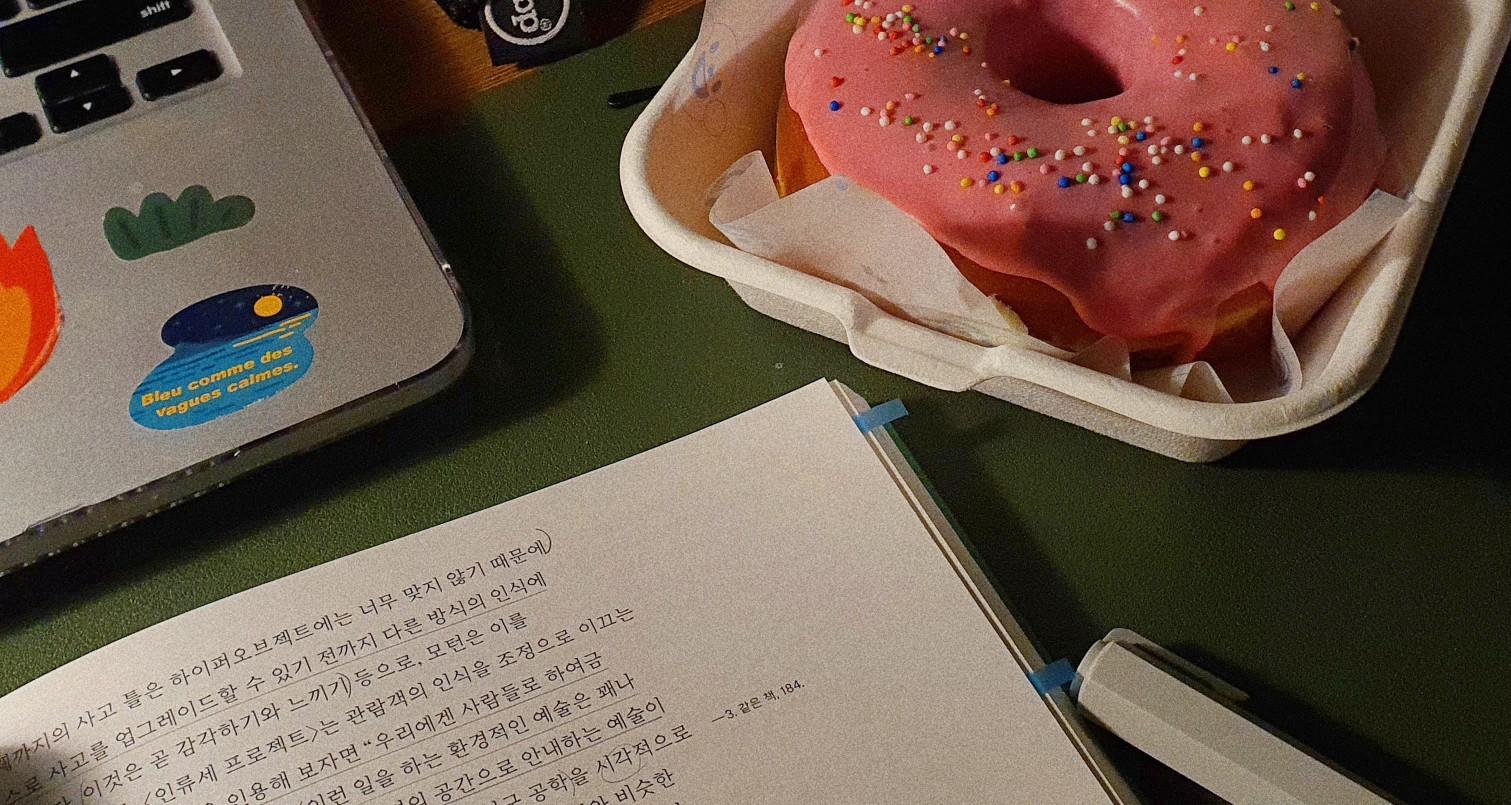
소소서가 : 하루 10쪽 책읽기
무료 · 705 /제한 없음
-

책읽는 즐거움
무료 · 1 /제한 없음
-

책읽는우리집
무료 · 1 /4명
-

매주 한 권
무료 · 3 /제한 없음
-

정모/행사 고양이책 읽기
5월 1일 (목) 오전 12:00 · 무료 · 3 /3명
-

정모/행사 새벽 독서
5월 9일 (금) 오전 12:00 · 무료 · 1 /1명
-

게으르지만 책은 읽고 싶엉🥱
무료 · 3 /10명
상세정보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