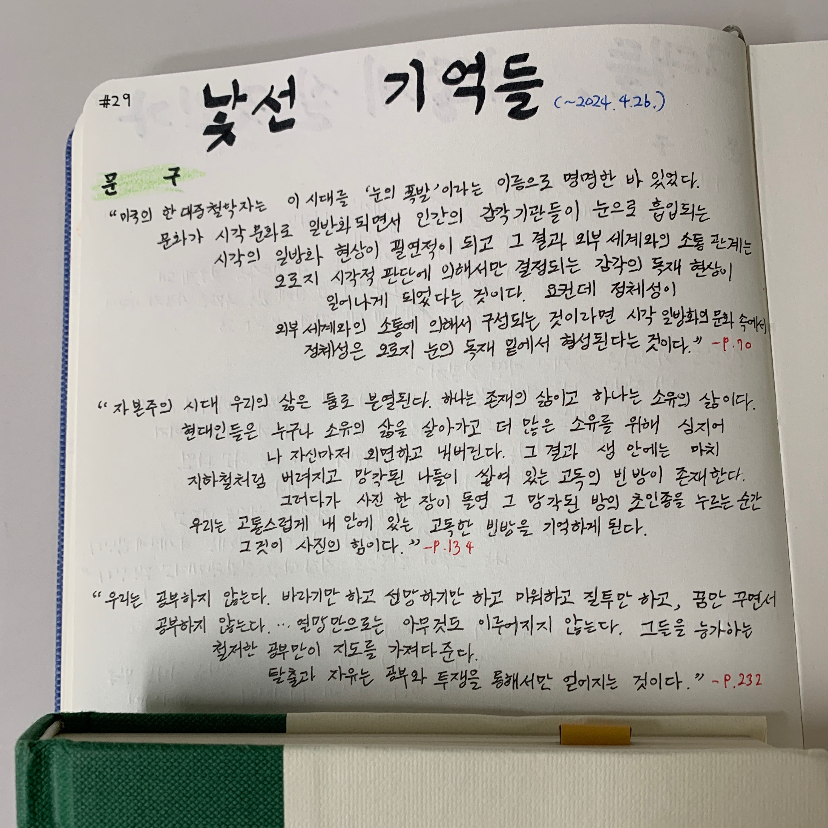낯선 기억들 :철학자 김진영의 난세 일기
김진영 (지은이)|한겨레출판

이 책을 담은 회원





58명
이럴 때 추천!
답답할 때,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인생이 재미 없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읽으면 좋아요.
분량보통인 책
장르한국에세이
출간일2020-09-24
페이지276쪽
10%14,000원
12,600원분량보통인 책
장르한국에세이
출간일2020-09-24
페이지276쪽
10%14,000원
12,600원분량보통인 책
장르한국에세이
출간일2020-09-24
페이지276쪽

 요약
요약이 책에 대한 요약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독서 가이드
독서 가이드
1. 이 책은 30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2. 답답할 때일 때 읽으면 도움이 돼요.
3. 여유로운 저녁 시간에 몰입해서 읽기 좋은 분량이에요.
작가

김진영
(지은이)

상세 정보
호주머니에서 죽음을 꺼내면서도 삶을 말하고, 아픈 이별을 떠나보내면서도 사랑을 껴안았던 철학자 故 김진영의 세 번째 산문집. 시끄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써 내려간 용기 가득한 문장들이 담겨 있다.
이 책 어때요?
Q&A이 책의 한줄평
0아직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게시물
1이 책이 담긴 책장
아직 이 책이 담긴 책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