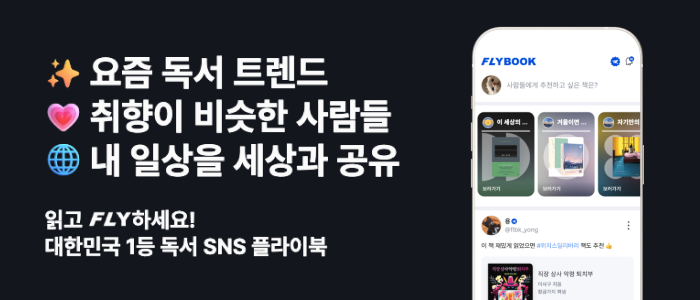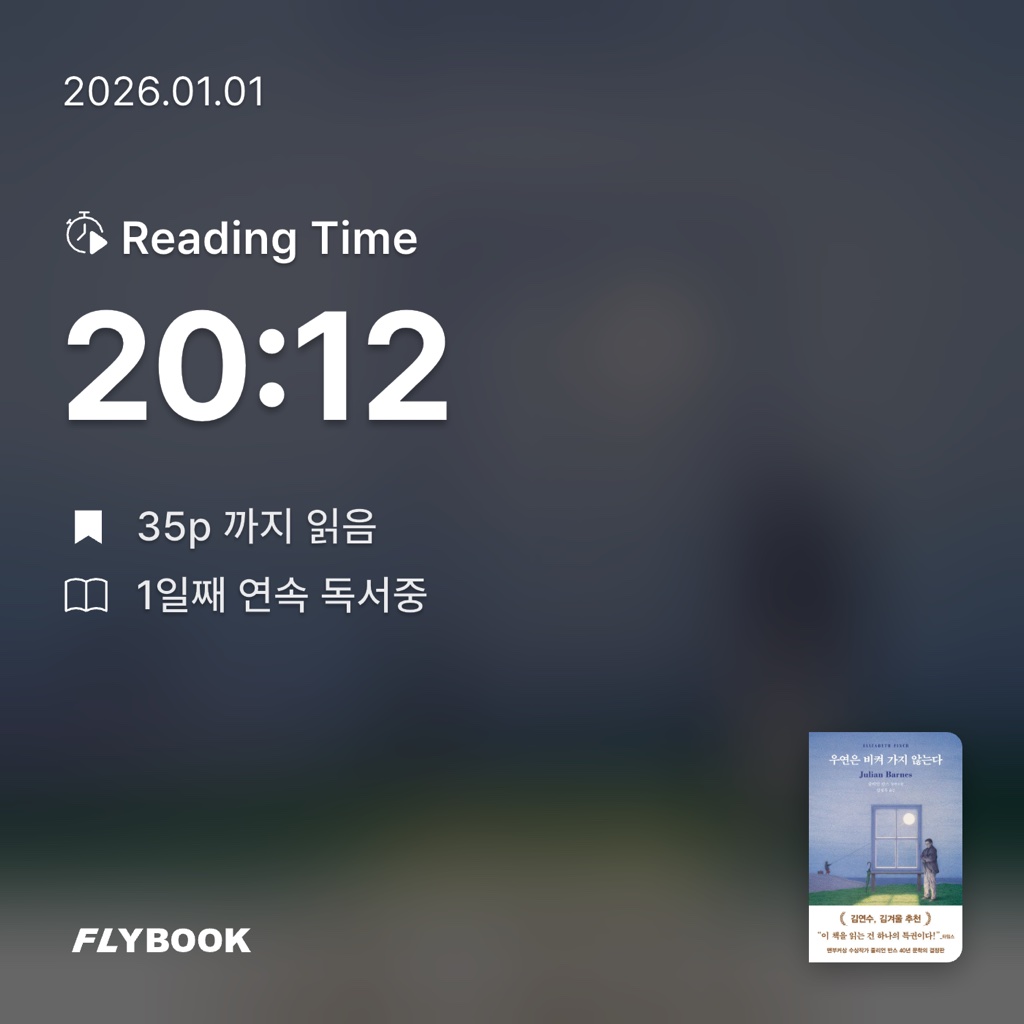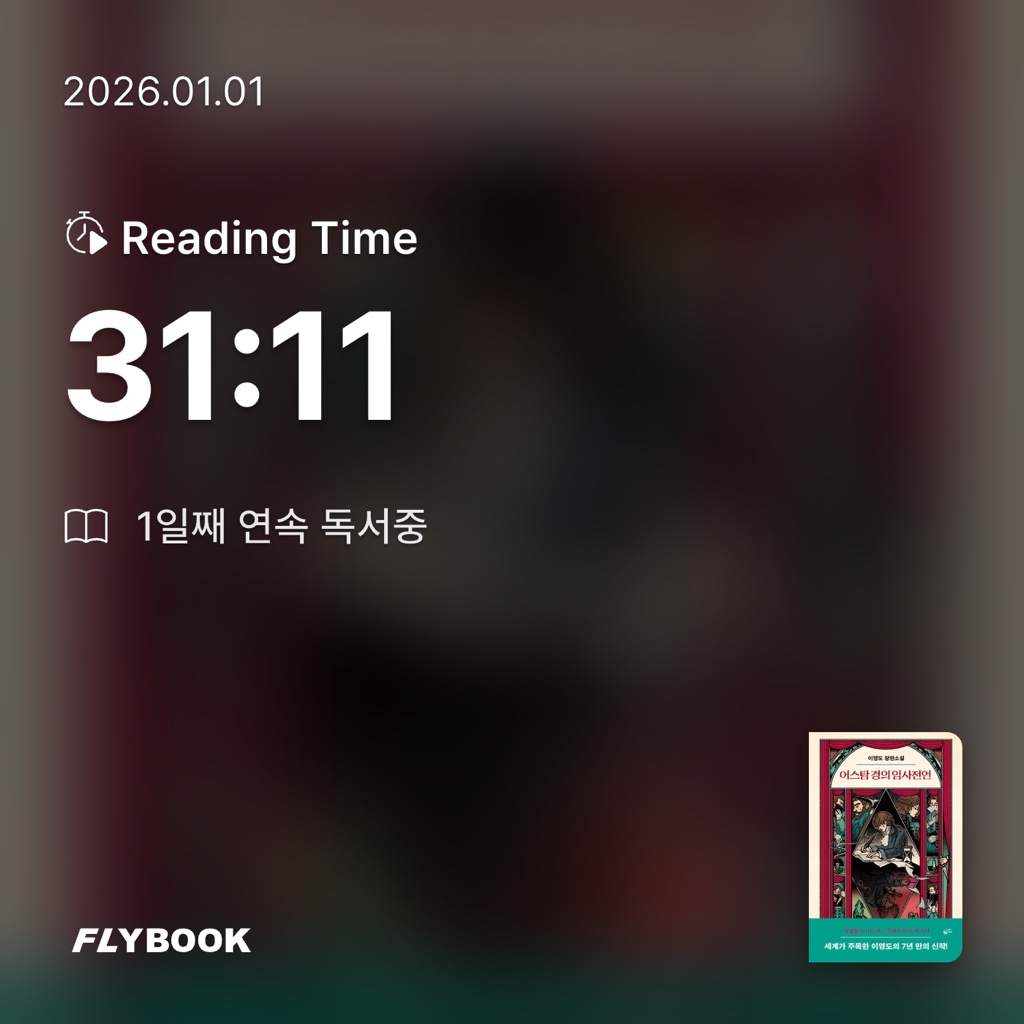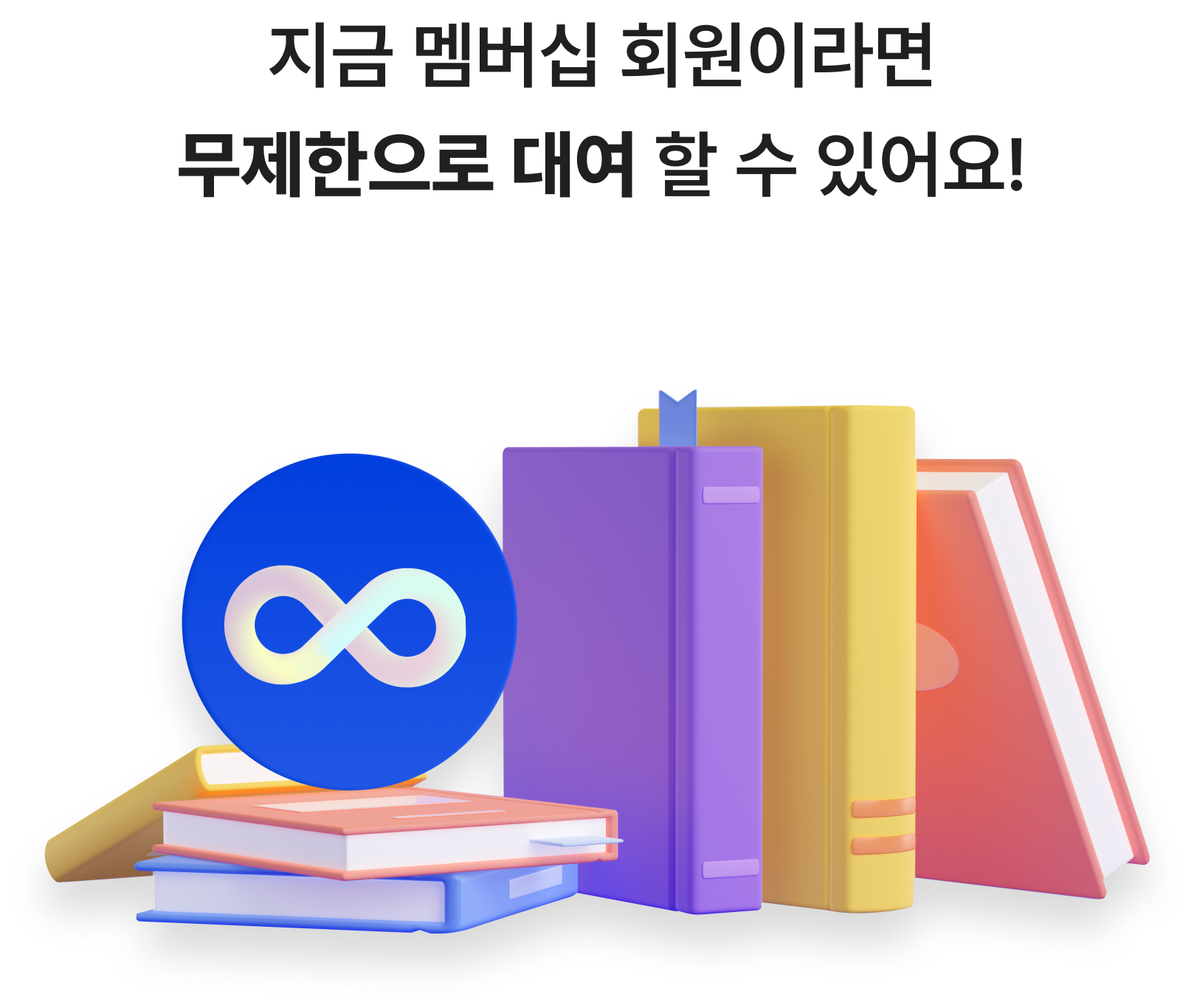우리 한시 삼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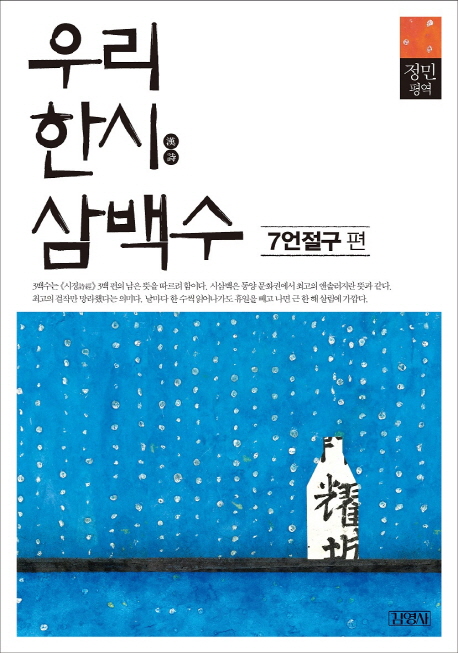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두꺼운 책
출간일
2013.12.29
페이지
660쪽
상세 정보
시와 멀어진 세상에 정민 교수가 던지는 단 일곱 자의 깊은 울림. 오래된 장처럼 깊은 고전의 감성과 정수가 배어든 우리 한시 삼백수. 삼국부터 근대까지 우리 7언절구 백미를 가려 뽑고 그 아마득하고 빛나는 아름다움을 망라하면서 오늘날 독자들의 정서에 닿을 수 있게 풀이했다.
원문에는 독음을 달아 독자들이 찾아보기 쉽게 했으며 우리말로 번역한 시는 3.4조의 리듬을 타고 읽히도록 했다. 원시元詩를 방불할 만큼 아름다운 평설은 순수한 감성 비평으로 국한했고 구조와 형식 미학에 대한 비평, 고사에 대한 서술은 할애割愛했다. 부록에서 시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서술했다. 날마다 한 수씩 읽어나가도 휴일을 빼고 나면 근 한 해 살림에 가깝다.
추천 게시물

벼리
@st0ry
#야금야금독서단 #플라이북챌린지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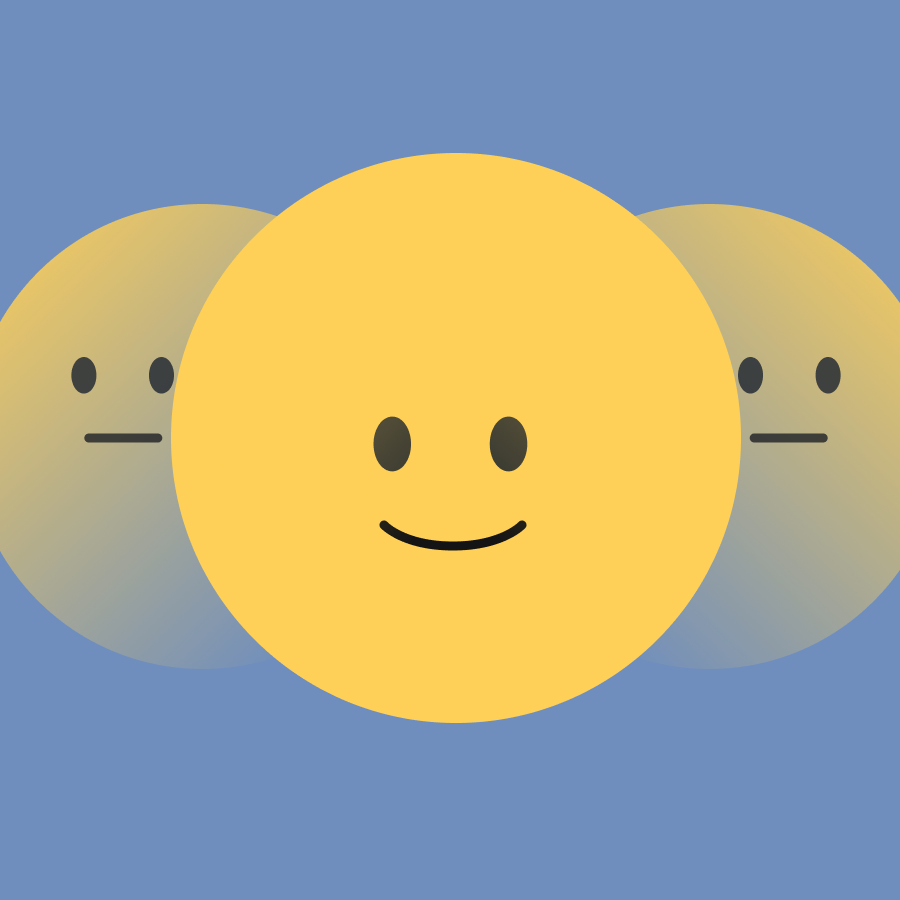
nana
@naome

우연은 비켜 가지 않는다
 읽고있어요
읽고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차님
@chanim
작가님을 늦게 알게 되니까 읽을 게 많다는 좋은 점이..? #오독완 #독서습관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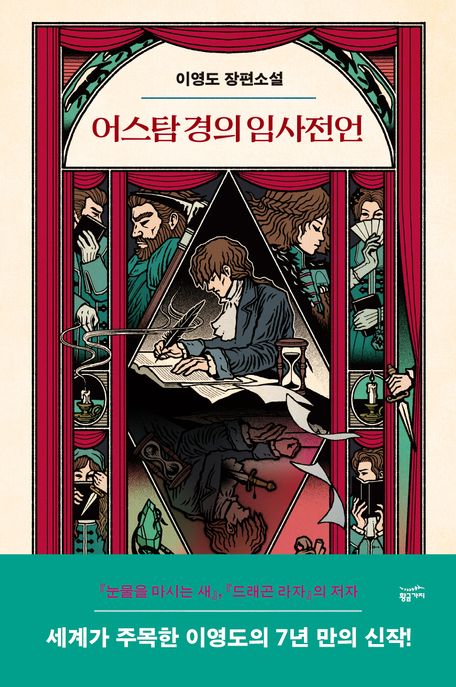
어스탐 경의 임사전언
 읽고있어요
읽고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이런 모임은 어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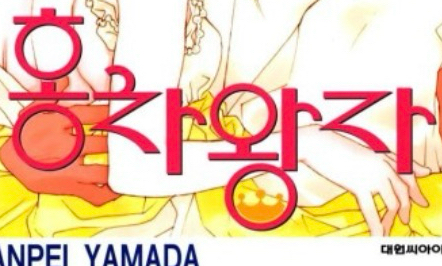
정모/행사 홍차왕자 챌린지
10월 20일 (월) 오전 12:00 · 무료 · 5 /5명
-

개인단톡(지원)
무료 · 2 /2명
-

정모/행사 10분 시간내기!
1월 1일 (목) 오전 12:00 · 무료 · 2 /제한 없음
-

코미 단톡
무료 · 3 /5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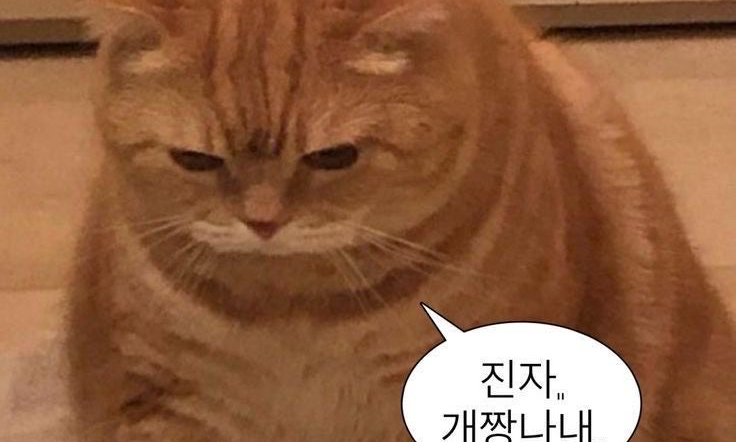
갠단톡(미지누나)
무료 · 1 /2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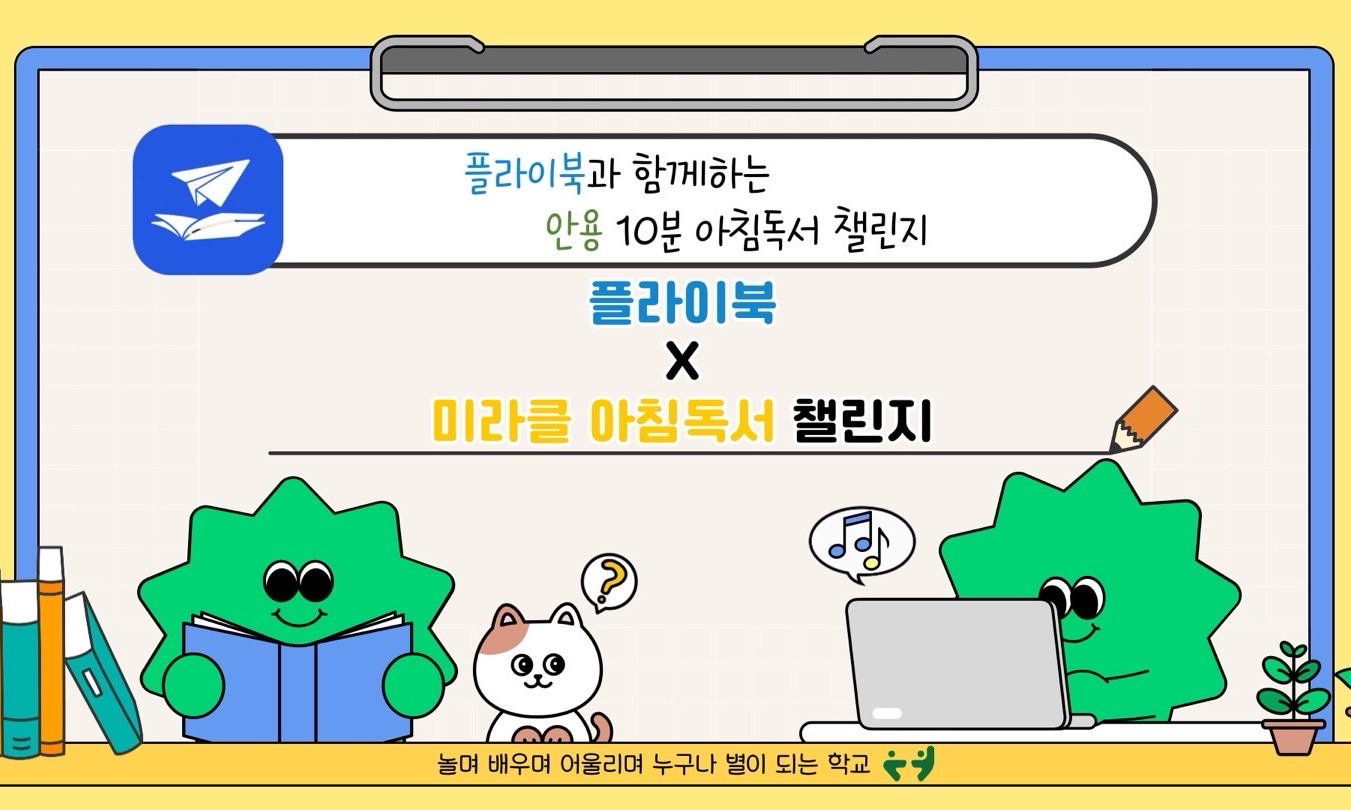
정모/행사 안용 아침독서 챌린지(1-1)
5월 22일 (목) 오전 12:00 · 무료 · 33 /18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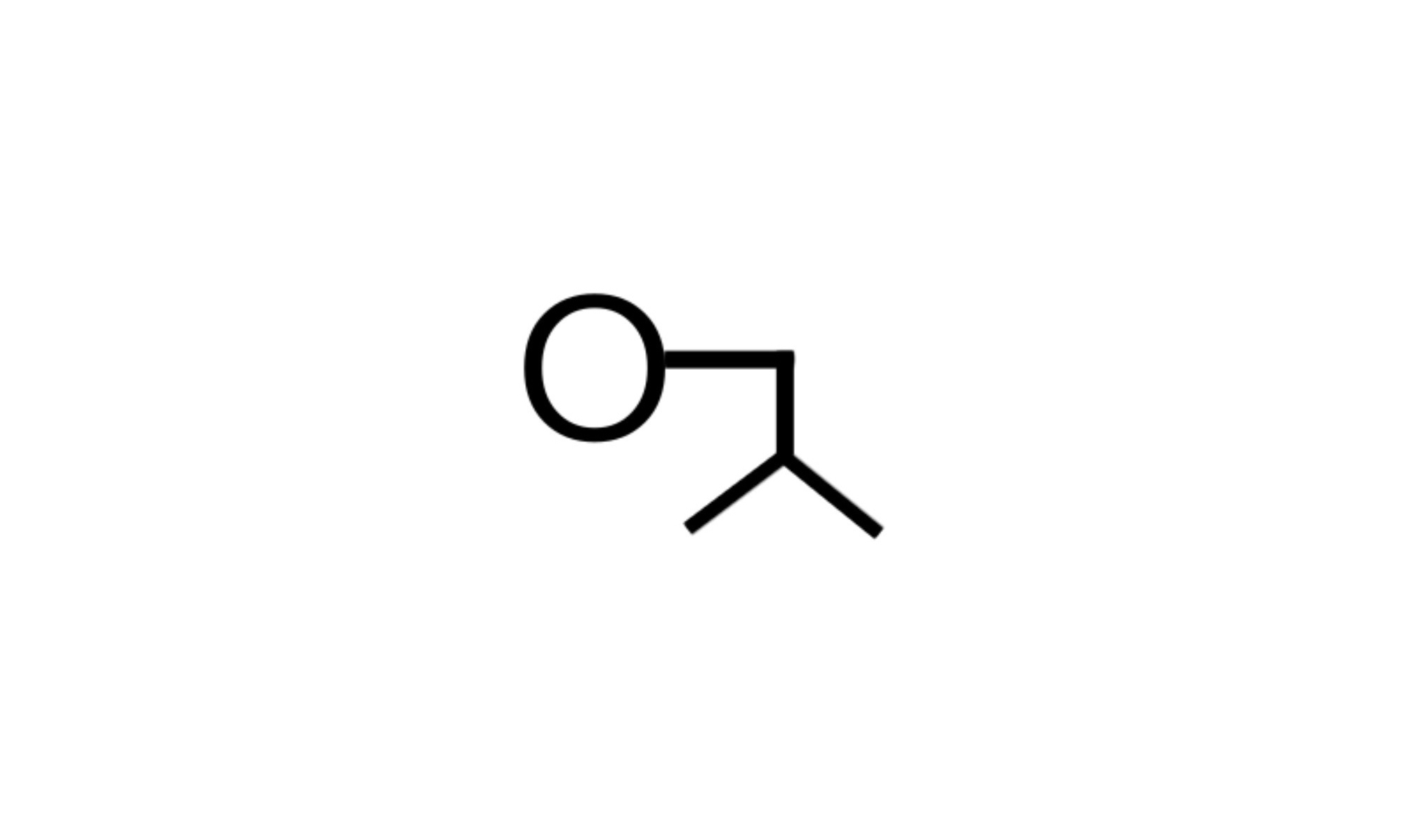
엇음이랑 읽겟음
무료 · 226 /제한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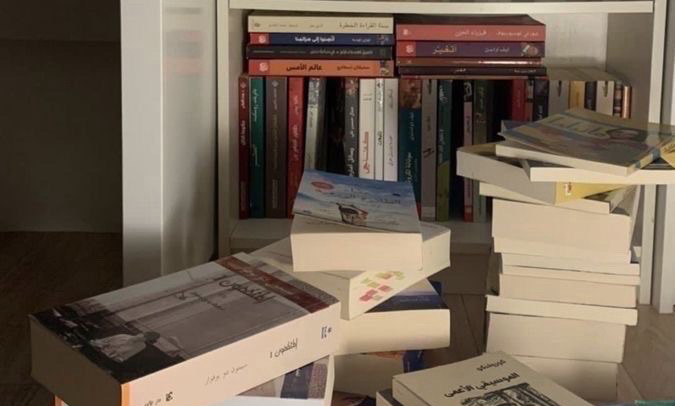
문장수집생활
무료 · 1 /제한 없음
-

정모/행사 📈금융 및 투자 서적 읽기 챌린지📚
9월 22일 (월) 오전 12:00 · 무료 · 7 /제한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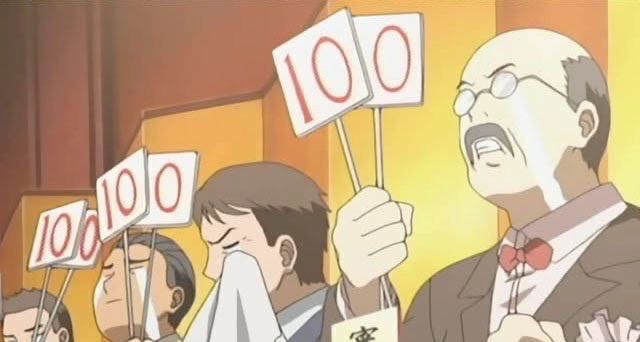
책 추천 방
무료 · 842 /제한 없음
상세정보
시와 멀어진 세상에 정민 교수가 던지는 단 일곱 자의 깊은 울림. 오래된 장처럼 깊은 고전의 감성과 정수가 배어든 우리 한시 삼백수. 삼국부터 근대까지 우리 7언절구 백미를 가려 뽑고 그 아마득하고 빛나는 아름다움을 망라하면서 오늘날 독자들의 정서에 닿을 수 있게 풀이했다.
원문에는 독음을 달아 독자들이 찾아보기 쉽게 했으며 우리말로 번역한 시는 3.4조의 리듬을 타고 읽히도록 했다. 원시元詩를 방불할 만큼 아름다운 평설은 순수한 감성 비평으로 국한했고 구조와 형식 미학에 대한 비평, 고사에 대한 서술은 할애割愛했다. 부록에서 시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서술했다. 날마다 한 수씩 읽어나가도 휴일을 빼고 나면 근 한 해 살림에 가깝다.
출판사 책 소개
“단 일곱 자에 마음밭 물꼬가 터진다!”
시와 멀어진 세상에 정민 교수가 던지는 일곱 자의 깊은 울림!
시의 시대가 있었다. 김수영과 고은, 이성복과 김남주, 곽재구와 기형도… 대학 문 앞 서점에 꽂힌 신간 시집의 표지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대던 시절. 지금은 아무도 지하철에서 빛바랜 종이의 시집을 펼치지 않는다. 이 책은 비수처럼 예리한 감성을 지닌 인문학자가 시와 멀어진 시대, 인간다움을 점점 잃어가는 세상에 던지는 일곱 자의 웅숭깊은 울림이다. 그 인문학자는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지식 경영에서 한국학 속의 그림까지 고전과 관련된 전방위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정민 교수다. 한시는 간결한 언어의 가락 속에 깊은 지혜와 감성을 숨긴 고전 인문학의 정수다. 삼국부터 근대까지 우리 7언절구 삼백수를 가려 뽑고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망라했다. 원문에는 독음을 달아 독자들이 찾아보기 쉽게 했으며 우리말로 번역한 시는 3·4조의 리듬을 타고 읽히도록 했다. 원시元詩를 방불할 만큼 아름다운 평설은 순수한 감성 비평으로 국한했고 구조와 형식 미학에 대한 비평, 고사에 대한 서술은 할애割愛했다. 부록에서 시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서술했다. 삼백수는 《시경詩經》 삼백 편의 남은 뜻을 따르려 함이다. 시삼백은 동양 문화권에서 최고의 앤솔러지란 뜻과 같다. 최고의 걸작만 망라했다는 의미다. 날마다 한 수씩 읽어나가도 휴일을 빼고 나면 근 한 해 살림에 가깝다.
‘우리 한시 삼백수’에는 사랑과 인간, 존재와 자연, 달관과 탄식, 풍자와 해학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모든 감성과 생각들이 녹아 있다. 그중 정포鄭誧의 <이별>(96쪽)은 날것처럼 선득한 슬픔을 고즈넉한 풍경에 빗대어 살며시 드러낸 명편이다.
새벽녘 등 그림자 젖은 화장 비추고
이별을 말하려니 애가 먼저 끊누나.
반 뜰 지는 달에 문 밀고 나서자니
살구꽃 성근 그늘 옷깃 위로 가득해라.
五更燈影照殘粧 欲語別離先斷腸
오경등영조잔장 욕어별리선단장
落月半庭推戶出 杏花疎影滿衣裳
낙월반정추호출 행화소영만의상
창밖이 아슴아슴 밝아온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헤어짐이 안타까운 두 사람은 밤새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퉁퉁 부은 눈, 화장은 지워져 부스스하다. 그녀는 자꾸 울기만 한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 것을 둘 다 잘 안다. 이제 가야겠노라고 말하면서 내 애가 마디마디 끊어진다. 달빛도 다 기울어 이젠 마당의 반도 비추지 못한다. 지게문을 밀고 나선다. 차마 뒤돌아볼 수가 없다. 살구꽃 성근 그림자가 내 옷 위에 가득 어리는 것을 본다. 사랑하는 사람아! 아, 끝내 돌아보지 못한다.
한편 삼백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용운韓龍雲의 <종소리>(612쪽)에서는 서릿발처럼 쩌렁쩌렁한 시대의식을 만날 수 있다.
사방 산 감옥 에워 눈은 바다 같은데
찬 이불 쇠와 같고 꿈길은 재와 같네.
철창조차 가두지 못하는 것 있나니
밤중의 종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四山圍獄雪如海 衾寒如鐵夢如灰
사산위옥설여해 금한여철몽여회
鐵窓猶有鎖不得 夜聞鐘聲何處來
철창유유쇄불득 야문종성하처래
철창으로 내다보면 온통 푸른 산에 포위당해 그 너머 바깥세상은 보이지 않는다. 산속에 눈이 펑펑 쏟아지자, 창밖은 어느새 광풍 노도에 일렁이는 바다가 된다. 얼음장보다 더 찬 홑이불 속에서 벌벌 떨다 보니, 아련하던 꿈길은 재처럼 싸늘히 식어 이빨만 덜덜 떨린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육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깊은 밤 종소리가 철창을 넘어들어온다. 어디서 온 종소리냐? 누가 보낸 종소리냐? 육신이야 비록 갇혀 영어囹圄의 신세라 해도, 깨어있는 내 자유로운 정신의 푯대만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다.
탄식과 달관의 두 경계를 보여주는 시로는 성운成運의 <단절>(226쪽)과 신광한申光漢의 <강 길>(202쪽)을 꼽을 수 있다. 이상하게도 두 시가 보여주는 경계는 서로 다른 듯 닮아 있다.
여름 해 그늘 져서 대낮에도 어두운데
물소리 새소리로 고요 속에 시끄럽다.
길 끊어져 아무도 안 올 줄을 알면서도
산 구름에 부탁하여 골짝 어귀 막았다네.
夏日成帷晝日昏 水聲禽語靜中喧
하일성유주일혼 수성금어정중훤
已知路絶無人到 猶倩山雲鎖洞門
이지로절무인도 유천산운쇄동문
- <단절>
깎아지른 절벽이 십리에 걸렸는데
강을 끼고 한 줄기 길 가늘고 구불구불.
안위(安危)의 나뉨은 평생에 조금 알아
발아래 풍파쯤은 놀라지 않는다네.
截壁嵯峨十里橫 緣江一路細紆縈
절벽차아십리횡 연강일로세우영
平生粗識安危分 脚底風波未足驚
평생조식안위분 각저풍파미족경
- <강 길>
<단절>은 속리산에 숨어 살며 자신의 뜻을 슬쩍 내비친 시다. 구름이 해를 가리자 여름 대낮이 어둑하다. 일없는 숲속은 마냥 고요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시냇물 소리와 지저귀는 새 소리로 숲은 나름대로 부산스럽다. 세상으로 통하는 길은 뚝 끊어져 몇 날이 지나도 속세의 발자취는 이르지 않는다. 이쯤 하면 되겠지 싶다가도 혹시 몰라 산골짝 구름에게 부탁하여 내 집으로 들어서는 골짜기 입구를 마저 봉쇄한다.
<강 길>에서는 월계협 세찬 물살이 흘러가는 물길 위로 깎아지른 벼랑을 끼고 소롯길이 열려 있다. 아차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골짜기로 쓸려갈 판이다. 비바람은 길 가는 나그네를 후려치고, 길은 미끄럽고, 물살은 거세다. 길은 가도 가도 끝없이 희미하게 이어지고, 숨을 몰아쉬며 앞을 봐도 끝은 보이지 않는다. 흡사 험난한 인생길을 건너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안위(安危)의 갈림에는 나도 이골이 났다. 편안함이 편안함이 아니고, 위태로움 속에 깃든 편안함도 맛볼 줄 안다. 엔간한 풍파쯤은 겁나지 않는다.
비장하고 아픈 감성만을 옛 시인들이 노래한 것은 아니다. 자연을 따르고 순리를 따르려는 따뜻한 감성(<들풀>, 118쪽)과 목화밭 가는 길에 길손을 만난 아가씨의 설레는 마음(<목화밭>, 486쪽), 변방 수자리를 사는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속 깊은 배려(<편지를 부치며>, 370쪽) 등 평화롭고 가슴 뛰며 푸근한 옛 감성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들풀>
가녀린 들풀에 저절로 꽃이 피고
돛 그림자 용인 듯이 수면 위에 빗겼구나.
저물녘엔 언제나 안개 물가 기대 자니
대숲 깊은 곳에 인가가 묻혀 있네.
纖纖野草自開花 檣影如龍水面斜
섬섬야초자개화 장영여룡수면사
日暮每依烟渚宿 竹林深處有人家
일모매의연저숙 죽림심처유인가
하루해가 저물면 나는 또 안개 짙은 강가 대숲에 배를 묶어두고 또 하루를 접는다. 저 푸른 대숲 너머로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나도 저 따스한 식탁에 함께하고 싶다.
<목화밭>
푸른 치마 아가씨 목화밭에 나왔다가
길손 보곤 몸을 돌려 길 가에 서 있구나.
흰둥개가 누렁이를 멀리 따라 가더니만
다시금 짝 지어서 주인 앞에 달려온다.
靑裙女出木花田 見客回身立路邊
청군녀출목화전 견객회신립로변
白犬遠隨黃犬去 雙還更走主人前
백견원수황견거 쌍환갱주주인전
암컷 누렁이가 새침을 떨며 저만치 앞서 가자 수컷 흰둥개가 같이 놀자며 ㅤㅉㅗㅈ아간다. 길 위에선 나그네와 아가씨의 탐색전이 한창인데, 제 주인 보란 듯이 뒹굴며 놀던 개 두 마리가 아가씨 앞으로 짝을 지어 내닫는다. 새침데기 아가씨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그만 붉어지고 말았다.
<편지를 부치며>
집에 보낼 편지에 괴로움 말하려다
흰 머리의 어버이가 근심할까 염려되어,
그늘진 산 쌓인 눈이 깊기가 천 길인데
올겨울은 봄날처럼 따뜻하다 적었네.
欲作家書說苦辛 恐敎愁殺白頭親
욕작가서설신고 공교수살백두친
陰山積雪深千丈 却報今冬暖似春
음산적설심천장 각보금동난사춘
황막한 변방의 추위는 맵다 못해 뼈를 저민다. ‘어머님! 이곳은 너무 춥고 힘들어요.’ 집에 보낼 편지에 이렇게 쓰려다가, 흰머리의 어버이께서 자식 걱정에 잠 못 드실까봐 이렇게 고쳐 쓴다. “어머님! 올겨울은 정말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저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곧 뵐게요.” 아! 지금쯤 전방에도 칼바람 속에 흰 눈이 쌓여가겠지.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 그런데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니다. 먹먹한 일상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마음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정민 교수는 단 일곱 자에 실린 웅숭깊은 울림으로 그 메마른 마음밭에 힘찬 물꼬를 튼다. 그리고 옛것이 지금 것보다 오히려 더 새로울 수 있다는 도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지천명의 나이에 홍안의 청년처럼 싱푸른 감성을 지닌 인문학자의 아련한 옛 노래가 자꾸 귓전을 맴돈다.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