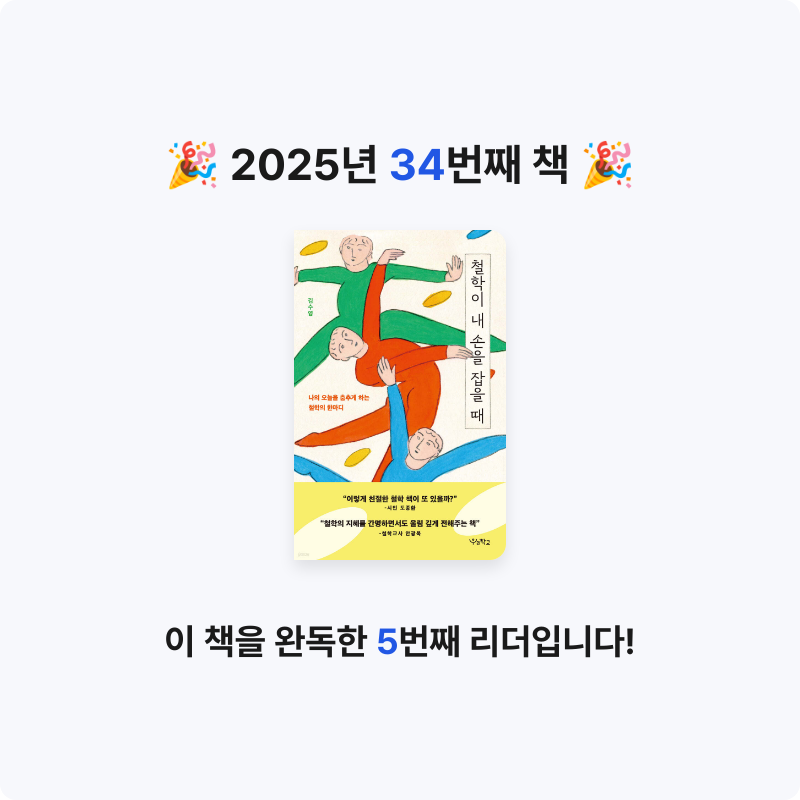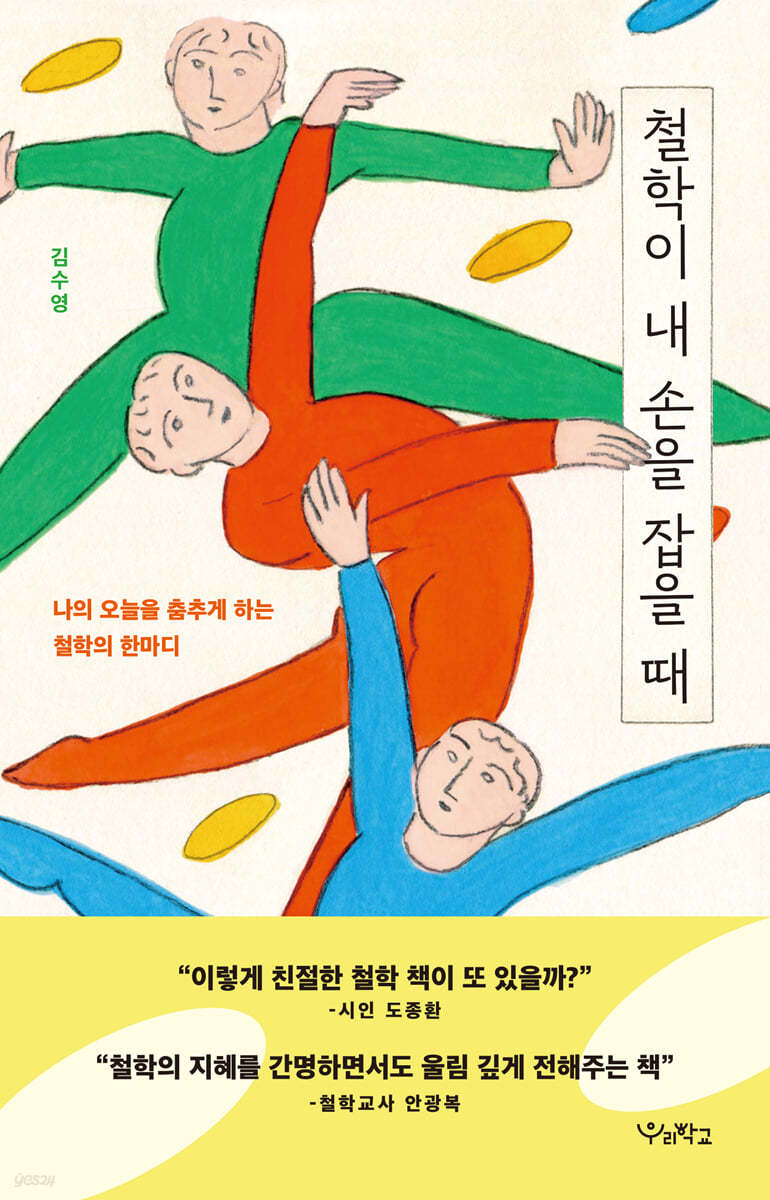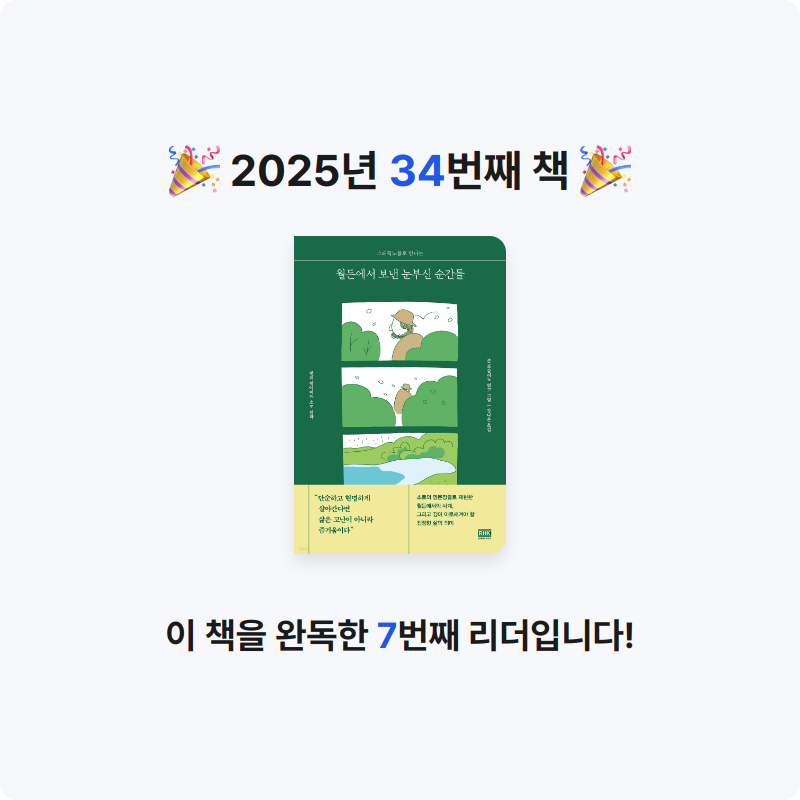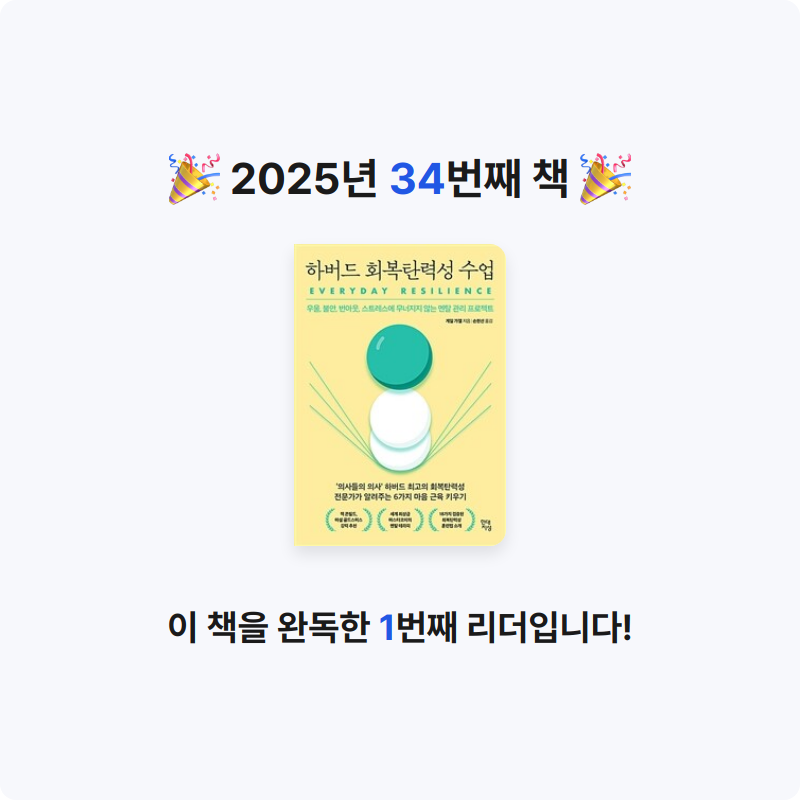muje1117님의 다른 게시물

muje1117
@muje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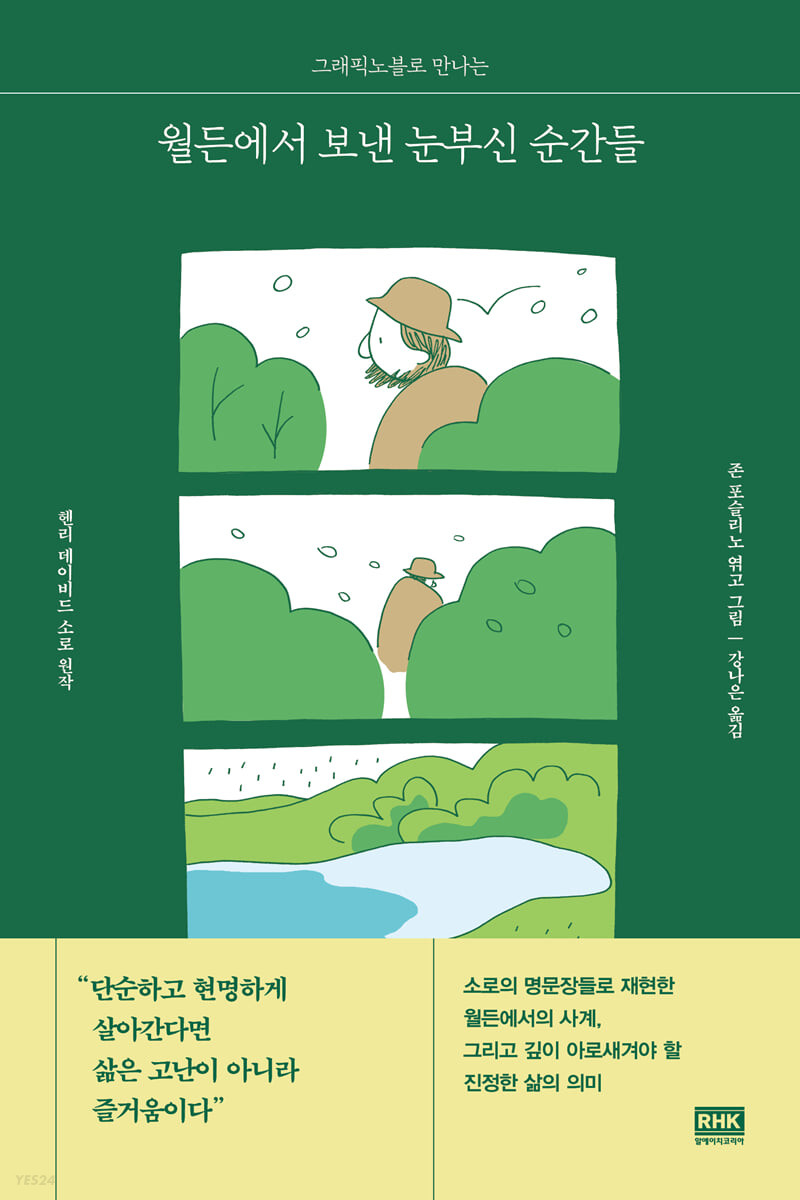
월든에서 보낸 눈부신 순간들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6일 전
 0
0
 0
0

muje1117
@muje1117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주 전
 0
0
 0
0

muje1117
@muje1117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앎의 문제를 다룬 철학서인 미셸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을 쉽게 풀어 낸다.
시대에 따라 인정받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패러다임―단절을 통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완전히 교체되는 지식의 성질을 천동설과 지동설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또한 철학이 역사학적 관점에 갇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바슐라르의 상상력과 깡길렘의 전략적 선택―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해석한 것이므로 순수한 자료란 없다는 주장―을 빌려 앎의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고자 했으며 그것이 바로 고고학적 방법론―해석을 멈추고 정해진 맥락 없이 대상을 다루며, 기록되지 않고 과거에 묻혀있는 사물들을 연구하거나 이미 조직화된 기록의 요소를 풀어내는 작업―이다.
푸코는 지식이 언표로 구성되는 담론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고 『광기의 역사』에서 광기가 지식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담론적 사건, 즉 광기를 보는 시각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정신 병리학의 대상이 된 것을 지적하며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지식과 권력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시와 처벌』에서는 지식이 권력과 결탁하여 담론을 움직이는 것을 밝히고 『성의 역사』에서는 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권력 장치가 담론의 확산을 통해 성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언표, 담론 등 언어철학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피상적으로만 다루어져 아쉬웠고 고고학적 방법론이 구조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기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미셸푸코의 철학을 얄팍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대에 따라 인정받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패러다임―단절을 통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완전히 교체되는 지식의 성질을 천동설과 지동설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또한 철학이 역사학적 관점에 갇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바슐라르의 상상력과 깡길렘의 전략적 선택―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해석한 것이므로 순수한 자료란 없다는 주장―을 빌려 앎의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고자 했으며 그것이 바로 고고학적 방법론―해석을 멈추고 정해진 맥락 없이 대상을 다루며, 기록되지 않고 과거에 묻혀있는 사물들을 연구하거나 이미 조직화된 기록의 요소를 풀어내는 작업―이다.
푸코는 지식이 언표로 구성되는 담론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고 『광기의 역사』에서 광기가 지식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담론적 사건, 즉 광기를 보는 시각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정신 병리학의 대상이 된 것을 지적하며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지식과 권력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시와 처벌』에서는 지식이 권력과 결탁하여 담론을 움직이는 것을 밝히고 『성의 역사』에서는 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권력 장치가 담론의 확산을 통해 성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언표, 담론 등 언어철학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피상적으로만 다루어져 아쉬웠고 고고학적 방법론이 구조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기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미셸푸코의 철학을 얄팍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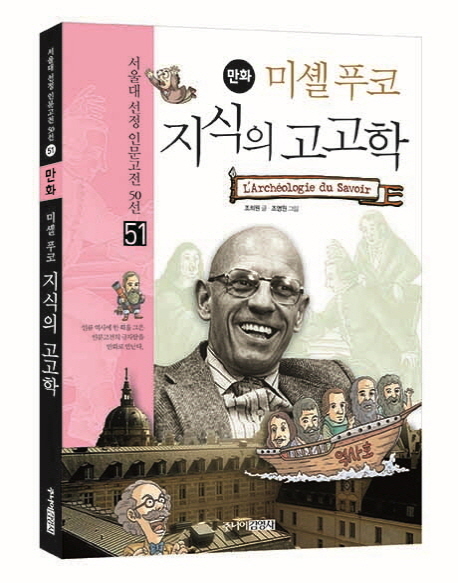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1명이 좋아해요
1주 전
 1
1
 1
1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