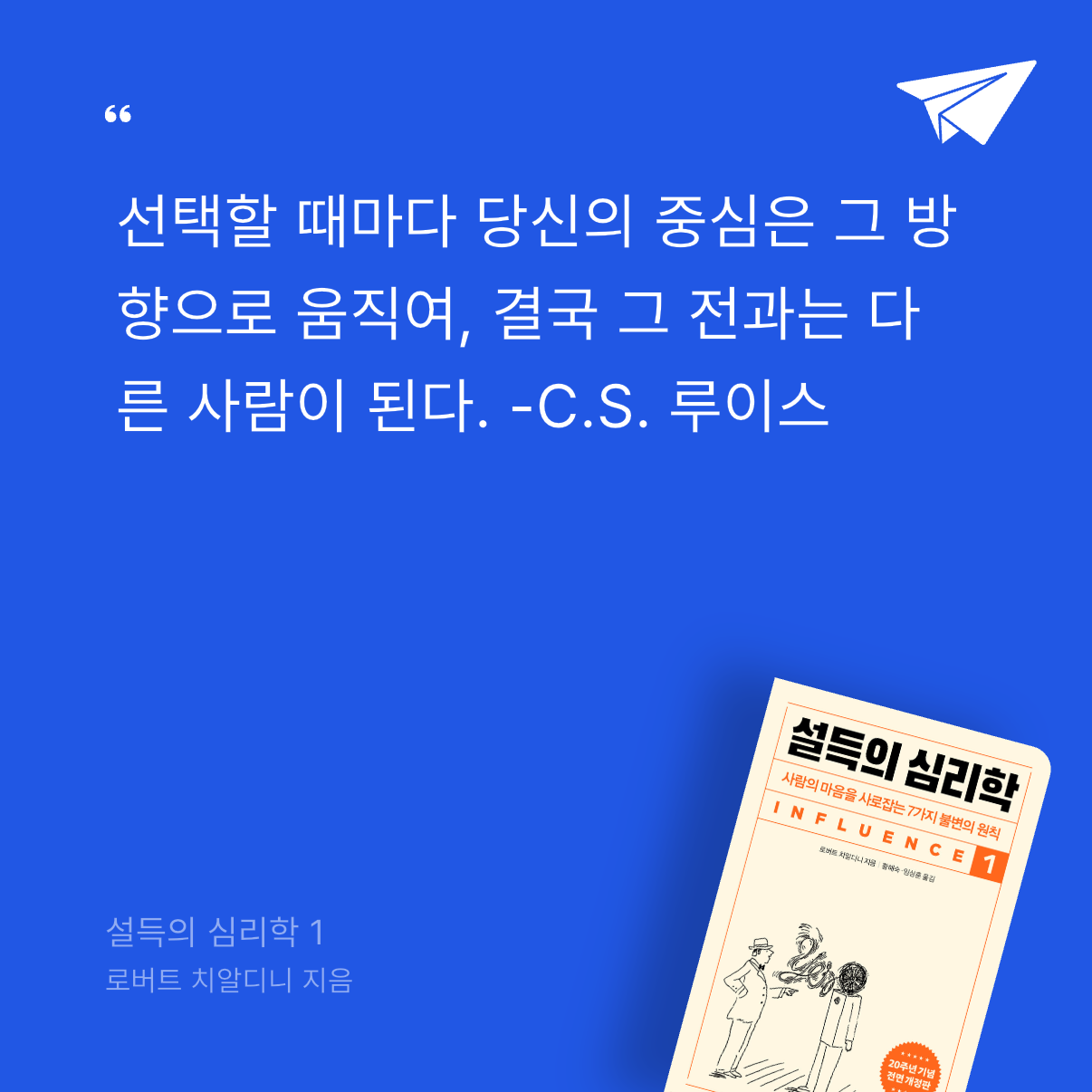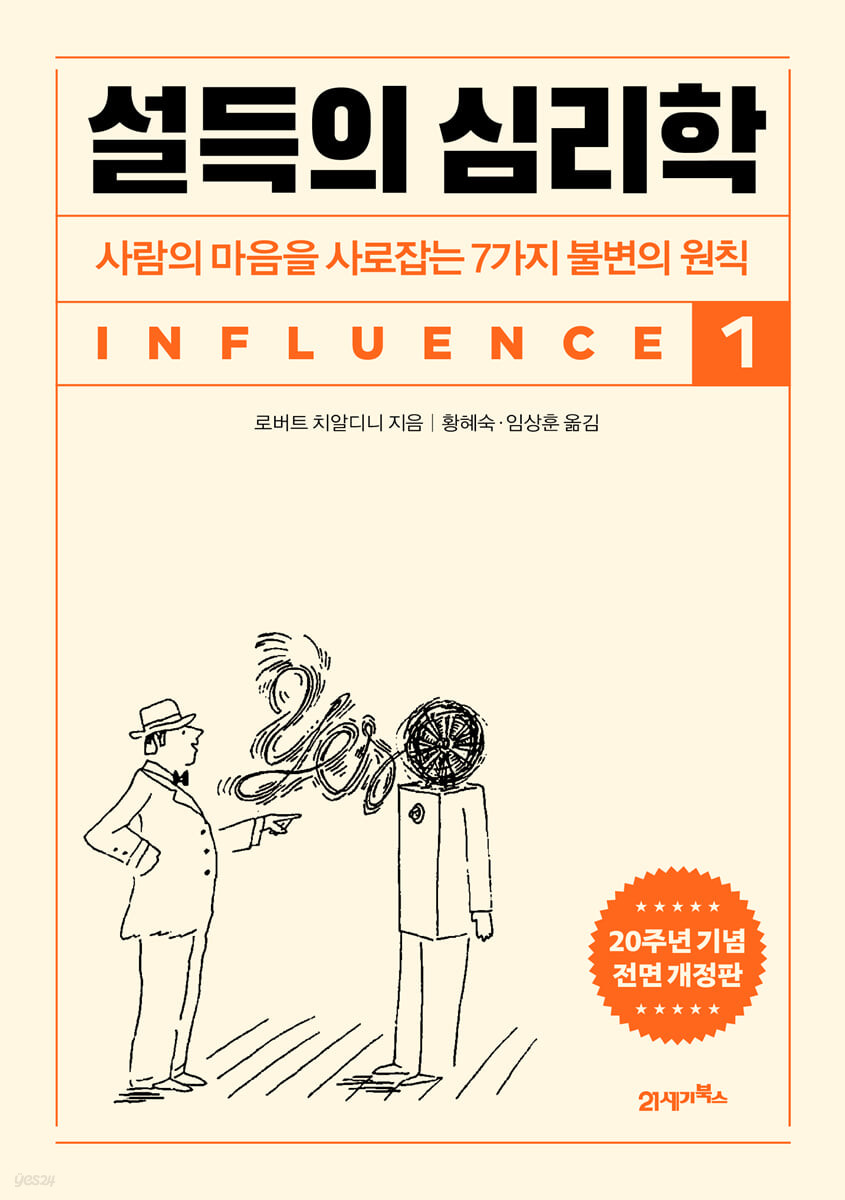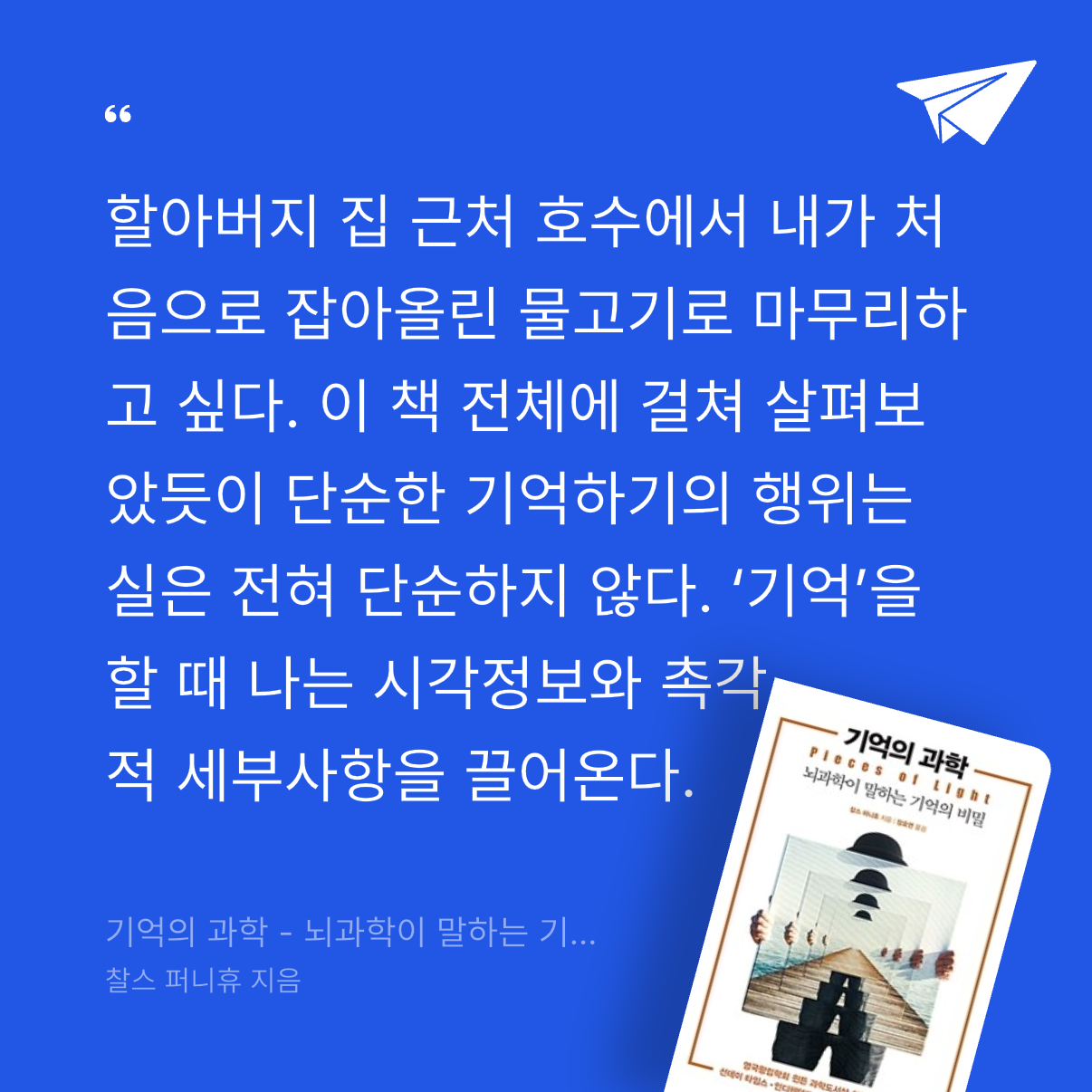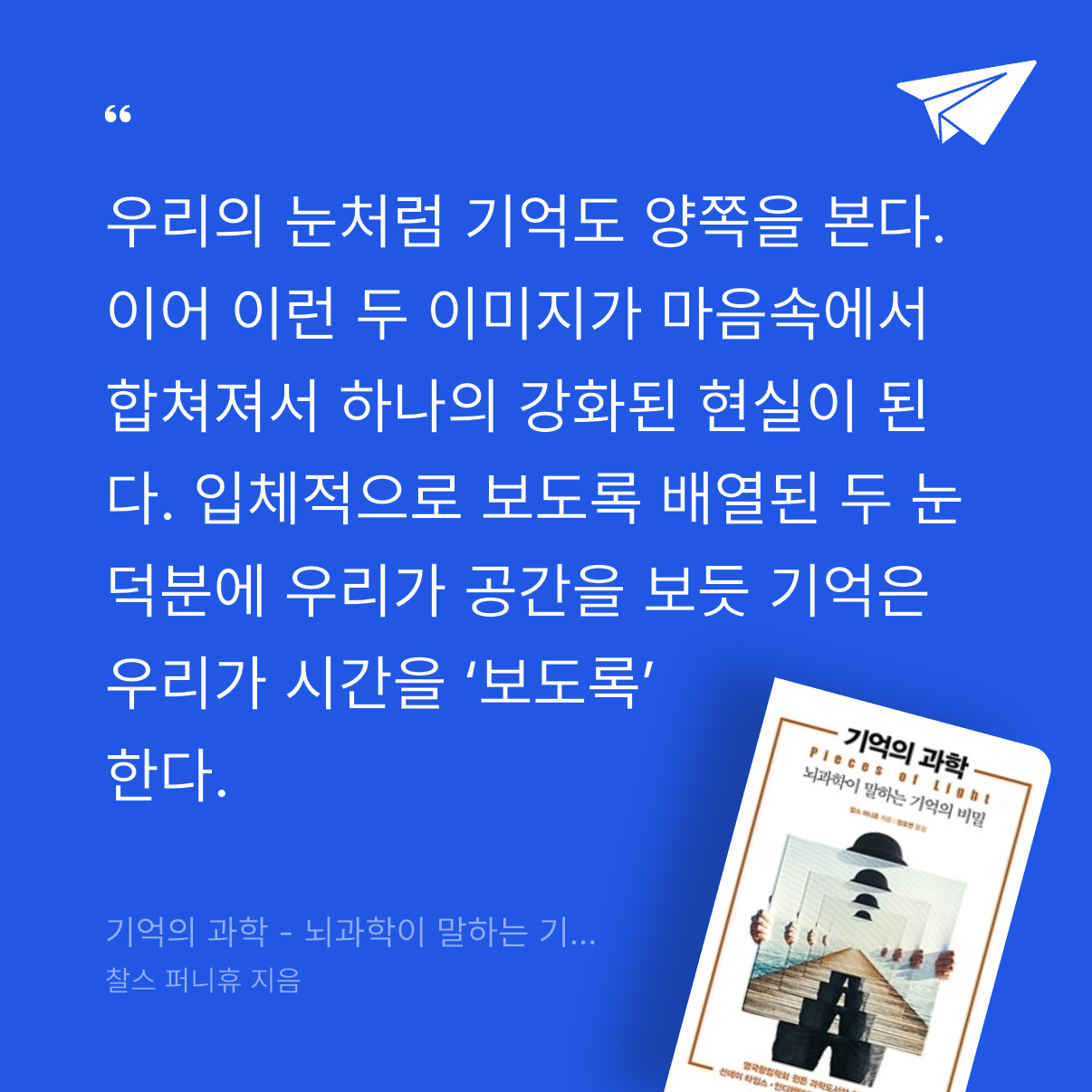god님의 다른 게시물

god
@godd
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집 풍경,
함께 살던 고모들의 얼굴,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께 호되게 맞았던 기억,
대학교 때 처음 얻었던 자취방,
입대 전 둑방길에 서서 바라보던 강물.
이러한 기억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건 나의 최초 기억이다.
한여름이었던 것 같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기 전에 둥글고 기다란 고무 통 속에 나를 내려놓는 장면인데, 눈을 말똥말똥 뜬 나는 중력을 느끼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좁다란 하늘과 나를 내려놓는 팔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팔이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나의 최초 기억으로 아마 두 세살 때가 아닐까 한다.
책에선 최초의 기억이 자아의 탄생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는데, 나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왜냐하면 내가 고무통으로 들어간 다는 것을 알려면 ‘나’라는 경험의 주체가, 그 상황이 싫고 두렵다는 것들 느끼기 위해서라면 감정의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억은 나를 만들어 내는 필수 요소이다.
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기억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이어주고, 또 미래에 대한 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면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도 잃는 다고 한다.
그러니까 과거든 미래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활동인 기억과 상상은 뿌리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기억의 실체를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억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주 멋지게 표현해주었다.
과거의 나는 과거의 기억에 메달려있고, 현재의 나는 현재의 기억에 메달려 있다.
기억은 각각의 다른 나를 연결시켜 나에게 정체성이라는 태양을 선물한다.
나는 경험을 다시 체험한다기보다는 경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집 풍경,
함께 살던 고모들의 얼굴,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께 호되게 맞았던 기억,
대학교 때 처음 얻었던 자취방,
입대 전 둑방길에 서서 바라보던 강물.
이러한 기억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건 나의 최초 기억이다.
한여름이었던 것 같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기 전에 둥글고 기다란 고무 통 속에 나를 내려놓는 장면인데, 눈을 말똥말똥 뜬 나는 중력을 느끼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좁다란 하늘과 나를 내려놓는 팔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팔이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나의 최초 기억으로 아마 두 세살 때가 아닐까 한다.
책에선 최초의 기억이 자아의 탄생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는데, 나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왜냐하면 내가 고무통으로 들어간 다는 것을 알려면 ‘나’라는 경험의 주체가, 그 상황이 싫고 두렵다는 것들 느끼기 위해서라면 감정의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억은 나를 만들어 내는 필수 요소이다.
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기억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이어주고, 또 미래에 대한 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면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도 잃는 다고 한다.
그러니까 과거든 미래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활동인 기억과 상상은 뿌리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기억의 실체를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억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주 멋지게 표현해주었다.
과거의 나는 과거의 기억에 메달려있고, 현재의 나는 현재의 기억에 메달려 있다.
기억은 각각의 다른 나를 연결시켜 나에게 정체성이라는 태양을 선물한다.
나는 경험을 다시 체험한다기보다는 경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기억의 과학 - 뇌과학이 말하는 기억의 비밀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3일 전
 0
0
 0
0

god
@godd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로 엮기 위해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감정체계가 작동하여 순간의 흥분을, 거대한 세상과 너무도 작은 나의 존재를 느낀다.
해마가 공간적 틀을 제공하여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놓이는 나만의 설계도를 마련한다. 그러는 동안 기억 검색과 인출 과정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과거로 낚싯줄을 던져 나를 신경의 타임머신에 태우고 시간대를 거슬러 가게 한다.
나는 환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일곱 살로 되돌아간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의 나와 당시의 나, 이렇게 두 사람으로 동시에 존재한다. 두 사람 모두 이런 기억에서 맡은 바가 있다. 그들이 느끼는 바가 여기에 형태를 만들고, 그들의 목표가 구조를 부여한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병치하면서 비로소 기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경험을 다시 체험한다기보다 경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해마가 공간적 틀을 제공하여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놓이는 나만의 설계도를 마련한다. 그러는 동안 기억 검색과 인출 과정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과거로 낚싯줄을 던져 나를 신경의 타임머신에 태우고 시간대를 거슬러 가게 한다.
나는 환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일곱 살로 되돌아간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의 나와 당시의 나, 이렇게 두 사람으로 동시에 존재한다. 두 사람 모두 이런 기억에서 맡은 바가 있다. 그들이 느끼는 바가 여기에 형태를 만들고, 그들의 목표가 구조를 부여한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병치하면서 비로소 기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경험을 다시 체험한다기보다 경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기억의 과학 - 뇌과학이 말하는 기억의 비밀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4일 전
 0
0
 0
0

god
@godd
기억은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기억의 과학 - 뇌과학이 말하는 기억의 비밀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4일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