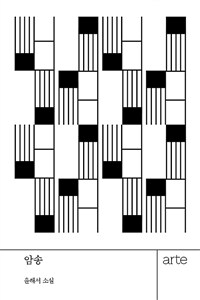beebi
@beebi
+ 팔로우


윤해서의 움푹한을 읽어본 적 있는 터라 여러 인물들의 단편적인 글들이 유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애초에 짐작하고 읽었다. 모르고 읽었더라면 조금은 헤맸을지라도 더 즐겁게 읽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알고 읽었기에 시야에 잡히는 것이 더 많아서 즐거웠을 수도 있다. 이미애, 이미소. 정애길, 모로. 그리고 다시 미소와 현웅. 모로와 선주. 선주와 미소. 각자의 슬픔. 너는 타인에게 네 진실된 목소리를 들려주어 본 적이 있니. 자꾸만 그런 환청이 들리는 기분으로 읽었다. 대화 없는 사랑은 사그라드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소와 현웅은 그렇지 않았고. 서로의 목소리를 갈구하며 사랑을 이어왔다. 나는 그것이 서로의 진실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리라 짐작한다. 그리고 애길과 모로, 애길과 미애, 미소. 그들은 음악으로 목소리를 대신한다. 선율에 영혼을 얹고, 서로에게 파동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랑을 나눈다. 모로와 선주 또한 음성의 파동 얘기를 나누며 사이가 깊어지고, 선주와 미소는 수신인이 잘못된 목소리와 부름을 통해 유대감을 얻는다. 윤해서가 적어내는 관계란 잡아내기 어려우면서도 어딘가 실존하리라 확신하게 하는 믿음을 준다. 나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구의 목소리도 놓치고 싶지 않단 생각을 한다.
“무서워요.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걸까 봐. 나한테 이 목소리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그걸 계속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면 어떡하죠?”
“네 목소리는 루카스의 것도 내 것도 아니야. 독일의 것도 한국의 것도 아니란다. 그건 오직 네 것이야, 아가.”
“사는 게 결국 미로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로를 지으면서 미로에 갇히는 일, 갇히기 위해 미로를 짓는 일.”
“무서워요.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걸까 봐. 나한테 이 목소리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그걸 계속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면 어떡하죠?”
“네 목소리는 루카스의 것도 내 것도 아니야. 독일의 것도 한국의 것도 아니란다. 그건 오직 네 것이야, 아가.”
“사는 게 결국 미로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로를 지으면서 미로에 갇히는 일, 갇히기 위해 미로를 짓는 일.”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시간 전
 0
0
 0
0
beebi님의 다른 게시물

beebi
@beebi
빛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슬픔이 있다 따스해서 슬프고 더 나아가 행복한 기분이라 허무한 경우가 있다 상실과 죽음으로부터의 나직한 공포에 난데없이 우울해지는 때가 있다
그 난데없음에 대한 고백 일지
입술을 스쳐간 눈물들
“좋았어요 울고 싶은 날들이 많았거든요 손끝은 모두 천사가 됐을 거예요”
내가 울며 보내준 모든 말단들은 천사가 됐을까
약점이 곧 정체성이 되고 수많은 구석들이 개체를 이룬다
잔잔한 줄로만 알았던 시들과 그 이미지를 깨부수는 혼란함, 괴로움, 옅은 숨에 가려진 불구덩이…
그의 시는 “바람에 영원히 불어날 것 같고 세상의 빈틈을 채울(당신과 나는 한 뼘, 내 눈과 내 깊은 곳은 1파섹)” 것 같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내가 읽음으로써 나의 세계로 그렇게 빈틈없이 구석구석…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이상함은 동질감과 연민 애틋함 친밀감 익숙함으로 전환된다 그의 세계와 나의 세계의 공통 분모를 찾는 일이 기껍다 그의 무사유가 유사한 사유가 되고 내 사유를 불러일으키므로 나는 그를 본다 그는 내게 ‘들킴’을 당하고 나 또한 그에게 들키므로 그는 나를 볼 수 있다
이 시집은 우리의 서사 같다
보다 긴밀해질 수 있다 그와 나는
“너는 다음과 같이 써라. 망해라.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일어서라. 손목에 언동을 덧칠해라. 기도가 될 수 없는 기도를 해라. 빈볼이 네 안면을 강타할 때까지. 너는 너와 함께 죽을 시를 쓴다. 너는 마지막 문장의 다음 문장을 쓰며 네 생의 첫 잠에 빠지기로 한다. 이 발견은 누군가의 몫으로, 다른 누군가의 슬픔에 맡긴다.(부록)”
그 난데없음에 대한 고백 일지
입술을 스쳐간 눈물들
“좋았어요 울고 싶은 날들이 많았거든요 손끝은 모두 천사가 됐을 거예요”
내가 울며 보내준 모든 말단들은 천사가 됐을까
약점이 곧 정체성이 되고 수많은 구석들이 개체를 이룬다
잔잔한 줄로만 알았던 시들과 그 이미지를 깨부수는 혼란함, 괴로움, 옅은 숨에 가려진 불구덩이…
그의 시는 “바람에 영원히 불어날 것 같고 세상의 빈틈을 채울(당신과 나는 한 뼘, 내 눈과 내 깊은 곳은 1파섹)” 것 같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내가 읽음으로써 나의 세계로 그렇게 빈틈없이 구석구석…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이상함은 동질감과 연민 애틋함 친밀감 익숙함으로 전환된다 그의 세계와 나의 세계의 공통 분모를 찾는 일이 기껍다 그의 무사유가 유사한 사유가 되고 내 사유를 불러일으키므로 나는 그를 본다 그는 내게 ‘들킴’을 당하고 나 또한 그에게 들키므로 그는 나를 볼 수 있다
이 시집은 우리의 서사 같다
보다 긴밀해질 수 있다 그와 나는
“너는 다음과 같이 써라. 망해라.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일어서라. 손목에 언동을 덧칠해라. 기도가 될 수 없는 기도를 해라. 빈볼이 네 안면을 강타할 때까지. 너는 너와 함께 죽을 시를 쓴다. 너는 마지막 문장의 다음 문장을 쓰며 네 생의 첫 잠에 빠지기로 한다. 이 발견은 누군가의 몫으로, 다른 누군가의 슬픔에 맡긴다.(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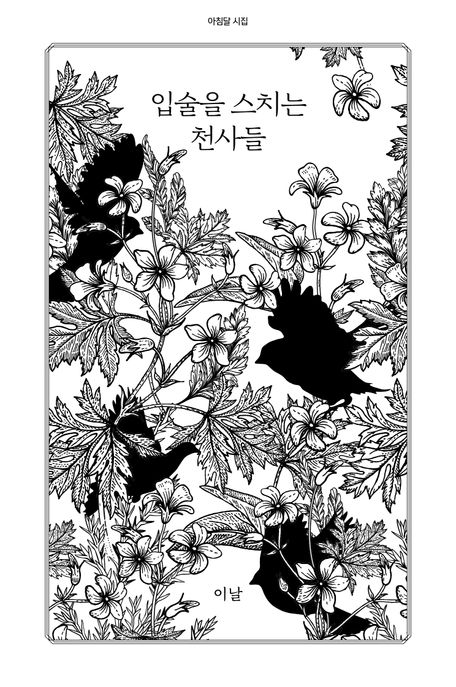
입술을 스치는 천사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일 전
 0
0
 0
0

beebi
@beebi
초반부를 읽을 땐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서술 방식 탓에 당황스러움이 컸다. 배수아의 번역만 익숙했지 그가 직접 써내려 간 책은 처음이었기에. 의식의 흐름은 나 또한 현대 문학에서 좋아하는 기법이고, 덕분에 즐거이 읽을 수 있었다.
단편적인 면들의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반부에서 그 파편들이 어떤 사건—누군가의 일대기—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중반부를 읽다보면 초반부에서 알 수 없었던 맥락들이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나름의 소소한 추리를 하는 재미도 있었다.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문체나 어딘가 개별적으로 보이는 짧은 문장들이 한 축에 속해있다는 점에서도.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 좋았고.
나는 잠재적인 현실을 산다
미래는 선취하는 불안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왜냐하면 사실 아닌 것은 사실에서 나오는 법이므로, 그러니 쓰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MJ는 편지에 썼다. 편지는 일기와 달리 MJ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는 떠나기 위해서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의 편지. 첫장부터 책의 말미까지 허투루 쓰이지 않았던. 시나 소설과는 다른 형식의 글.
지켜보는 것은 사랑하는 것. 그가 사랑하는 방식은 지켜보고, —혹은 보지 않음으로써—시야에 존재하게 두는 것. 속삭임으로 남는 것. 우묵히 팬 땅에 머무르는 것.
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다(257p).
수많은 가능성이 잠재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앎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따라가는 것, 그 속삭임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원하는 대로 그의 이미지를 그려내도 괜찮고 시답잖은 의미 부여를 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여행(258p)’이 될지니.
배수아의 동어 반복은 기껍다. 몇 번이고 되뇌일 수 있는, 그를 좇게 하는… 그런 단어들. 생활 속에서 접하면 배수아가 떠오를 것만 같은. 언제든 그의 세계에 고일 법한. 그가 의도한 바에 따라 내 일상을 해석할지도 모른다.
단편적인 면들의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반부에서 그 파편들이 어떤 사건—누군가의 일대기—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중반부를 읽다보면 초반부에서 알 수 없었던 맥락들이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나름의 소소한 추리를 하는 재미도 있었다.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문체나 어딘가 개별적으로 보이는 짧은 문장들이 한 축에 속해있다는 점에서도.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 좋았고.
나는 잠재적인 현실을 산다
미래는 선취하는 불안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왜냐하면 사실 아닌 것은 사실에서 나오는 법이므로, 그러니 쓰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MJ는 편지에 썼다. 편지는 일기와 달리 MJ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는 떠나기 위해서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의 편지. 첫장부터 책의 말미까지 허투루 쓰이지 않았던. 시나 소설과는 다른 형식의 글.
지켜보는 것은 사랑하는 것. 그가 사랑하는 방식은 지켜보고, —혹은 보지 않음으로써—시야에 존재하게 두는 것. 속삭임으로 남는 것. 우묵히 팬 땅에 머무르는 것.
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다(257p).
수많은 가능성이 잠재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앎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따라가는 것, 그 속삭임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원하는 대로 그의 이미지를 그려내도 괜찮고 시답잖은 의미 부여를 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여행(258p)’이 될지니.
배수아의 동어 반복은 기껍다. 몇 번이고 되뇌일 수 있는, 그를 좇게 하는… 그런 단어들. 생활 속에서 접하면 배수아가 떠오를 것만 같은. 언제든 그의 세계에 고일 법한. 그가 의도한 바에 따라 내 일상을 해석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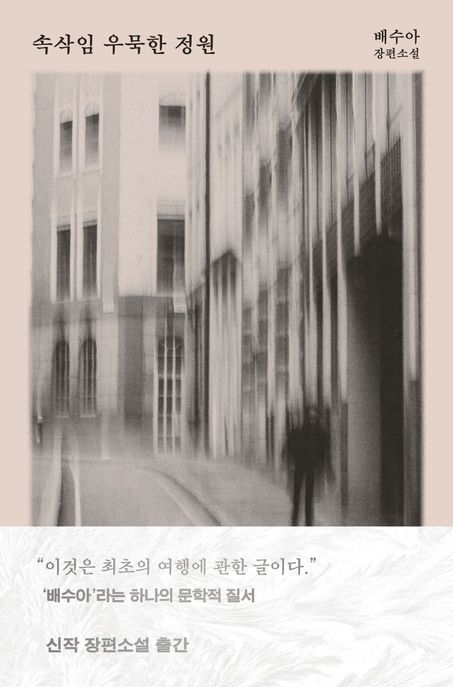
속삭임 우묵한 정원

1명이 좋아해요
2일 전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