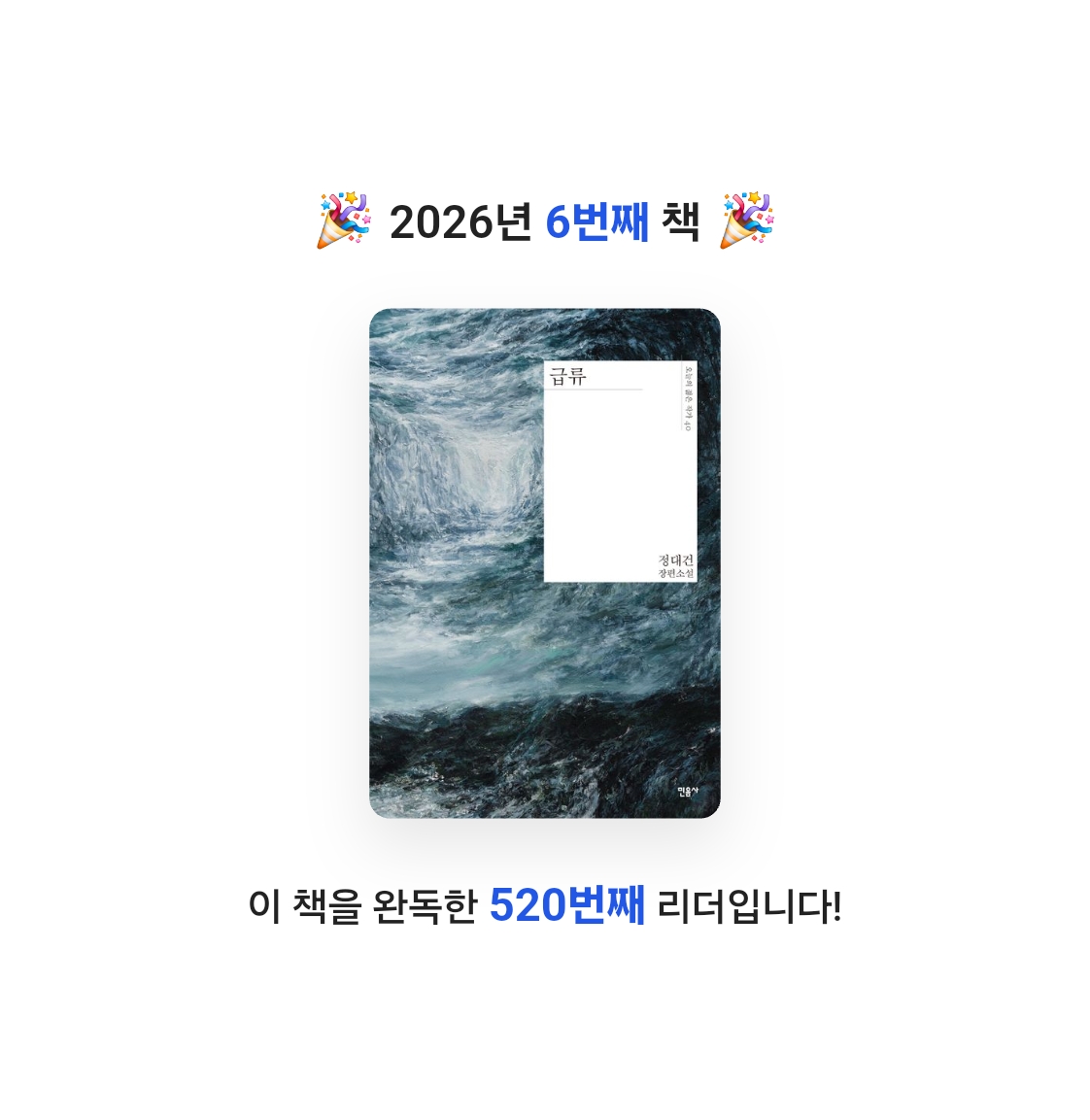xllee
@xllee_
+ 팔로우


현재 스스로에 대한 감상, 내가 하는 생각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자조적 감상을 듣던 친구가 나 같다며 추천해준 책.
원래도 읽으려 했으나, '너가 하는 얘기나 생각들을 들으니 넌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주인공이 하는 말들이 너와 똑같다.'라는 말을 듣고 당장 구매를 갈겨버린 책이었다.
인생을 알코올과 온갖 도파민, 사람들에 둘러쌓여 있으나 내게 안겨지는 건 한시적인 관계들에 대한 회의감, 인생에 대한 불만과 괴로움, 고독, 버려진단 두려움 등을 한 데 뭉쳐 '대3병'이라 칭하던 시기. 나는 이방인을 만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있구나 싶어 위로를 받게 된다.
장황하게 말하고 나서 하기엔 부끄러운 고백이나, 아이러니한 건, 막상 이 책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불분명한 기억 속 드문드문 기억나는 건 어떤 장례식... 그리고 문득 조금씩 엿보이던 카뮈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아주 크게 묻어나던 인생과 인간에 대한 회의감... 상실... 고독... 그 어떠한 것들.
글을 쓰다보니 기억나는 것은, 마지막까지 주인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직과 미련함, 신념과 고집 그 어디 사이에서 제 자리를 지키던 주인공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그마저도 공감이 갔던 기억도 새삼 다시 떠오른다. 누군가는 전혀 공감 못할 사고방식인 걸 알지만, 나였어도 그 상황에서 그랬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누군가 '왜'라고 묻는다면, 대답할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릴 것을 알기에. 그렇다. 나도 '왜'인지를 몰라서, 주인공도 그 이유를 못 찾아서, 혹은 카뮈가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버려서. 아마 그래서 책의 내용이 더 불분명한 기억으로 남았는지도 모르겠다.
조금이나마 삶의 의미를, 활력을 되찾은 지금은,
낙관적 허무주의와, 매 순간에서 가치를 찾으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하는, 속히 말하는 '소확행' 그 두 경계의 사이를 넘나들며,
나도 나를 모르는 채로, 하루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 터져나오려 하는 에너지를 주체 못해서 곤욕을 치루고, 하루는 바닥한 에너지를 긁어모으려 애쓰며 고요한 나날을 보내고.
그런 혼동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지금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난 여전히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에 공감하고,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무엇보다 나와 정말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으며 책을 덮게 될까?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음에도,
어떤 결말이 기다릴지 몰라
다시 건들지 못한 채로
책장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나의 이방인.
원래도 읽으려 했으나, '너가 하는 얘기나 생각들을 들으니 넌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주인공이 하는 말들이 너와 똑같다.'라는 말을 듣고 당장 구매를 갈겨버린 책이었다.
인생을 알코올과 온갖 도파민, 사람들에 둘러쌓여 있으나 내게 안겨지는 건 한시적인 관계들에 대한 회의감, 인생에 대한 불만과 괴로움, 고독, 버려진단 두려움 등을 한 데 뭉쳐 '대3병'이라 칭하던 시기. 나는 이방인을 만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있구나 싶어 위로를 받게 된다.
장황하게 말하고 나서 하기엔 부끄러운 고백이나, 아이러니한 건, 막상 이 책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불분명한 기억 속 드문드문 기억나는 건 어떤 장례식... 그리고 문득 조금씩 엿보이던 카뮈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아주 크게 묻어나던 인생과 인간에 대한 회의감... 상실... 고독... 그 어떠한 것들.
글을 쓰다보니 기억나는 것은, 마지막까지 주인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직과 미련함, 신념과 고집 그 어디 사이에서 제 자리를 지키던 주인공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그마저도 공감이 갔던 기억도 새삼 다시 떠오른다. 누군가는 전혀 공감 못할 사고방식인 걸 알지만, 나였어도 그 상황에서 그랬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누군가 '왜'라고 묻는다면, 대답할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릴 것을 알기에. 그렇다. 나도 '왜'인지를 몰라서, 주인공도 그 이유를 못 찾아서, 혹은 카뮈가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버려서. 아마 그래서 책의 내용이 더 불분명한 기억으로 남았는지도 모르겠다.
조금이나마 삶의 의미를, 활력을 되찾은 지금은,
낙관적 허무주의와, 매 순간에서 가치를 찾으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하는, 속히 말하는 '소확행' 그 두 경계의 사이를 넘나들며,
나도 나를 모르는 채로, 하루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 터져나오려 하는 에너지를 주체 못해서 곤욕을 치루고, 하루는 바닥한 에너지를 긁어모으려 애쓰며 고요한 나날을 보내고.
그런 혼동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지금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난 여전히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에 공감하고,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무엇보다 나와 정말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으며 책을 덮게 될까?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음에도,
어떤 결말이 기다릴지 몰라
다시 건들지 못한 채로
책장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나의 이방인.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시간 전
 0
0
 0
0
xllee님의 다른 게시물

xllee
@xllee_
음울하고 감정적이면, 다 명작이 되는가?
<급류>는 명작같기도 하고, 지랄맞은 한국 멘헤라 커플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로맨스가 아닐까 싶다.
적어도 확실한 건, '급류'만큼 그 둘의 관계를 아주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없을 거라는 것. 음울하고, 축축하고, 끈덕진 게 여름의 습기같다가도, 그 안에 강렬하게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이 아주 강렬해서, 둘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적절해서.
다만 서로가 서로밖에 이해해줄 수 없는, 서로가 서로 뿐인 단 하나의 exclusive한 커플 같아서 명작 로맨스의 주연 남녀 같다가도, 한편으론 다 읽고 나면 드는 찝찝한 생각. '이것 참 지랄맞은 로맨스잖아?'
취향에 맞는다면 명작이 되겠지만,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의구심이 피어오를 수도 있는
한국의 노란장판 감성 소설.
<급류>는 명작같기도 하고, 지랄맞은 한국 멘헤라 커플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로맨스가 아닐까 싶다.
적어도 확실한 건, '급류'만큼 그 둘의 관계를 아주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없을 거라는 것. 음울하고, 축축하고, 끈덕진 게 여름의 습기같다가도, 그 안에 강렬하게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이 아주 강렬해서, 둘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적절해서.
다만 서로가 서로밖에 이해해줄 수 없는, 서로가 서로 뿐인 단 하나의 exclusive한 커플 같아서 명작 로맨스의 주연 남녀 같다가도, 한편으론 다 읽고 나면 드는 찝찝한 생각. '이것 참 지랄맞은 로맨스잖아?'
취향에 맞는다면 명작이 되겠지만,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의구심이 피어오를 수도 있는
한국의 노란장판 감성 소설.

급류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시간 전
 0
0
 0
0

xllee
@xllee_

급류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시간 전
 0
0
 1
1

xllee
@xllee_
결말이 궁금해서 반나절만에 다 읽은 작품.
옛적에 친구가 추천해줬던 책이었는데, 밀리에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다. 아아... 그 때 알았어야 했는데......
방학 때 집에서 아침 먹기 전, 기상 한 직후 7시부터 읽기 시작한 책은, 도대체 그놈의 범인이 누군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조금만 더 읽는다는 게 어느샌가 시계는 9시... 10시... 11시를... 향해갔고... 아침을 먹을 때도 .. 점심을 먹을 때도.... 손에 붙잡고 있던 테블릿. 결국 오후 2~3시쯤 그놈의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고, 결말에 다다를 수록 밀리의 베스트 리뷰였던 '나도 모르게 김준후를 응원했다가 마지막에 경멸함'이 무슨 의미였는지... 뒷통수를 얼얼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격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다만 나는 이미 친구에게 주인공의 정체를 스포당하고 책을 본 뒤라, 그건 그다지 내게 놀라운 점이 아니었음에도, 여전히 그놈의 망할 범인이 누군지 도저히 추리되지 않아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전부 읽어버린 기억이 난다.
오히려 반전이나 마지막 범인을 던져주는 방식이 지나치게 ... 뭐랄까.. 피상적으로 지나갔다 해야할지 무심하게 지나갔다 해야 할지... 반전이 아닌 것처럼.. 별 거 아닌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묘사하니까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너무 모노톤으로 무관심하게 연출하려 하다보니 오히려 반전이 반전답지 않아 아쉬웠다. 차라리 마지막에 김준후 독백이 그나마 반전에 가까웠달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 글쎄,
반전이 아니어서 반전인 책이랄까?
사족: 읽어보면 무슨 의민지 안다.
이미 처음부터 힌트를 줘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그게 아닐 거야', '뭔가 더 있을 거야' 하며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고 시작하게끔 작가가 유도해버리니, 마지막에 가선 속았다는 생각에 허탈하게 웃게 되니까.
옛적에 친구가 추천해줬던 책이었는데, 밀리에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다. 아아... 그 때 알았어야 했는데......
방학 때 집에서 아침 먹기 전, 기상 한 직후 7시부터 읽기 시작한 책은, 도대체 그놈의 범인이 누군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조금만 더 읽는다는 게 어느샌가 시계는 9시... 10시... 11시를... 향해갔고... 아침을 먹을 때도 .. 점심을 먹을 때도.... 손에 붙잡고 있던 테블릿. 결국 오후 2~3시쯤 그놈의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고, 결말에 다다를 수록 밀리의 베스트 리뷰였던 '나도 모르게 김준후를 응원했다가 마지막에 경멸함'이 무슨 의미였는지... 뒷통수를 얼얼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격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다만 나는 이미 친구에게 주인공의 정체를 스포당하고 책을 본 뒤라, 그건 그다지 내게 놀라운 점이 아니었음에도, 여전히 그놈의 망할 범인이 누군지 도저히 추리되지 않아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전부 읽어버린 기억이 난다.
오히려 반전이나 마지막 범인을 던져주는 방식이 지나치게 ... 뭐랄까.. 피상적으로 지나갔다 해야할지 무심하게 지나갔다 해야 할지... 반전이 아닌 것처럼.. 별 거 아닌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묘사하니까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너무 모노톤으로 무관심하게 연출하려 하다보니 오히려 반전이 반전답지 않아 아쉬웠다. 차라리 마지막에 김준후 독백이 그나마 반전에 가까웠달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 글쎄,
반전이 아니어서 반전인 책이랄까?
사족: 읽어보면 무슨 의민지 안다.
이미 처음부터 힌트를 줘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그게 아닐 거야', '뭔가 더 있을 거야' 하며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고 시작하게끔 작가가 유도해버리니, 마지막에 가선 속았다는 생각에 허탈하게 웃게 되니까.

홍학의 자리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시간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