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카콘을 만들 남자
@izrin
+ 팔로우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수능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수능 성적으로 대학이 갈리고, 그 대학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쉽게 인식되고, 전문대를 나온 사람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수능을 잘봤다는 것은 정해진 시험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고, 수능을 못 봤다는 것은 평균보다 한참 뒤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두가 이런 의심을 품어보았을 것이다. 과연 수능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게 맞는가?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렇게 고결한 평가방식인가?
이 책은 위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 평균은 그저 평균일 뿐,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 우월한 것도, 평균보다 낮은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전 세계의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왜 이런 관념이 전 세계에 펴졌을까?
평균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과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과거 어떤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할 때, 기술이 아직 부족해 개인마다 측정한 수치가 모두 다 달랐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 수치들을 모아 평균을 내면, 그게 가장 정확한 수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여기서의 평균은 어떤 측정이 더 좋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다 이런 방식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천체를 이해하는 데에 평균이 도움이 되니,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평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뒤부터 사람들의 신체부터 성격까지 평균을 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평균을 이용하면 어떤 집단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평균을 각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과거 진화론을 바탕으로 우생학을 주장했던 사람들 처럼, 이런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으면 우월한 것, 낮으면 열등한 것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학생 10명이 수학 문제를 10문제 푸는 데에 평균 20분이 소요된다고 하자. 그 중 20분 보다 빨리 푸는 학생은 더 똑똑한 학생이고, 늦으면 더 멍청한 학생이라는 해석을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학을 푸는 시간과 수학 능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 또한, 수학이라는 학문 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등. 누구는 미적분을 좀 더 잘할 것이고, 누군가는 기하를 더 잘할 수도 있다.
즉, 똑같은 수학 100점이라고 해서, 같은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평균의 함정이 여기있다. 수학능력, 신체, 성실성 등 수 많은 것들은 절대 한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세부 요소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진 능력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를 평균을 내 평가를 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사례 중 하나로, 과거 미국 공군 조종사들의 신체 수치를 평균화하여 가장 이상적인 신체구조를 찾으려 했던 연구를 소개한다.
팔 길이, 상체 길이, 가슴 둘레 등 10가지 요소를 측정하여, 이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옷을 만들기도 했는데, 막상 만드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했다.
이유를 알고자 다시 연구를 해보니 10가지 항목의 평균에 들어오는 사람이 400명 중에 겨우 2-3명 밖에 불과했던 것이다. 10가지가 아니라 6-7개라 기준을 낮춰도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이 10%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옷이 당연히 불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래 사례를 보자. 가운데 막대가 평균을 의미한다.
평균을 기준으로 두 사람을 평가하면 어떤 결과를 말해야 할까? 항목마다 평균보다 높거나 낲다. 평균에 들어오는 항목은 겨우 1-2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평균에 못 미치는 몸일까? 평균에 안 맞는 항목이 많으니 둘 다 건강하지 못한 몸일까?
둘끼리만 비교 했을 때, 체격이 더 큰 몸매는 어떤 것일까?
책 125P
다음 사례를 보자. 이 사진은 성실성에 대해 두 아이를 평가한 것이다.
성실성 평균 점수는 두 아이가 똑같다. 그렇다면 두 아이는 모든 부문에서 같은 성실도를 보일까?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성실하기도, 덜 성실하기도 하다. 이 둘은 절대 같지 않다. 그런데 이 둘을 똑같이 평가하는게 맞을까?
책 166p
이 책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차원 적이며, 평균과 멀어진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1. 들쭉날쭉의 원칙
2. 맥락의 원칙
3. 경로의 원칙
으로 설명한다.
들쭉날쭉의 원칙은 위 사진처럼 특정 요소마다 가진 능력이 들쭉날쭉 하다는 것이며, 이를 합쳐서 평균으로 내버리면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말한다.
맥락의 원칙은 두번째 성실성의 상황을 말한다. 항상 성실한게 아니라, 항상 게으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이다. 즉, 천성이란 없다고 말한다.
경로의 원칙은 사람들은 다 다른 경로를 거쳐서 발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생아가 뒤집기부터 걷기까지 발달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석적인 순서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예시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아기들을 관찰해보니, 아기들 모두가 걷기까지의 순서가 달랐다. 발달과정의 정석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발달 기간도 모두가 달랐다. 평균이 1년이라고 해서, 그보다 늦게 걷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리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걷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잘 걷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각자마다 순서도 다르고 시기도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후 ...책 내용이 긴데, 여기서 줄인다. 얼른 다음 책을 읽으러 가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의 고정관념에 새로운 금을 만들어준 책이다. 이 책을 만나 너무 기쁘다.
4.0과 4.5를 고민하다가 4.5을 주었는데 이유는 여자친구에게 책 점수를 너무 짜게 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4.0이든 4.5든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만 다음 책을 읽으러 떠난다 안녕
수능 성적으로 대학이 갈리고, 그 대학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쉽게 인식되고, 전문대를 나온 사람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수능을 잘봤다는 것은 정해진 시험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고, 수능을 못 봤다는 것은 평균보다 한참 뒤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두가 이런 의심을 품어보았을 것이다. 과연 수능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게 맞는가?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렇게 고결한 평가방식인가?
이 책은 위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 평균은 그저 평균일 뿐,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 우월한 것도, 평균보다 낮은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전 세계의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왜 이런 관념이 전 세계에 펴졌을까?
평균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과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과거 어떤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할 때, 기술이 아직 부족해 개인마다 측정한 수치가 모두 다 달랐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 수치들을 모아 평균을 내면, 그게 가장 정확한 수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여기서의 평균은 어떤 측정이 더 좋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다 이런 방식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천체를 이해하는 데에 평균이 도움이 되니,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평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뒤부터 사람들의 신체부터 성격까지 평균을 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평균을 이용하면 어떤 집단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평균을 각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과거 진화론을 바탕으로 우생학을 주장했던 사람들 처럼, 이런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으면 우월한 것, 낮으면 열등한 것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학생 10명이 수학 문제를 10문제 푸는 데에 평균 20분이 소요된다고 하자. 그 중 20분 보다 빨리 푸는 학생은 더 똑똑한 학생이고, 늦으면 더 멍청한 학생이라는 해석을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학을 푸는 시간과 수학 능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 또한, 수학이라는 학문 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등. 누구는 미적분을 좀 더 잘할 것이고, 누군가는 기하를 더 잘할 수도 있다.
즉, 똑같은 수학 100점이라고 해서, 같은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평균의 함정이 여기있다. 수학능력, 신체, 성실성 등 수 많은 것들은 절대 한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세부 요소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진 능력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를 평균을 내 평가를 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사례 중 하나로, 과거 미국 공군 조종사들의 신체 수치를 평균화하여 가장 이상적인 신체구조를 찾으려 했던 연구를 소개한다.
팔 길이, 상체 길이, 가슴 둘레 등 10가지 요소를 측정하여, 이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옷을 만들기도 했는데, 막상 만드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했다.
이유를 알고자 다시 연구를 해보니 10가지 항목의 평균에 들어오는 사람이 400명 중에 겨우 2-3명 밖에 불과했던 것이다. 10가지가 아니라 6-7개라 기준을 낮춰도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이 10%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옷이 당연히 불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래 사례를 보자. 가운데 막대가 평균을 의미한다.
평균을 기준으로 두 사람을 평가하면 어떤 결과를 말해야 할까? 항목마다 평균보다 높거나 낲다. 평균에 들어오는 항목은 겨우 1-2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평균에 못 미치는 몸일까? 평균에 안 맞는 항목이 많으니 둘 다 건강하지 못한 몸일까?
둘끼리만 비교 했을 때, 체격이 더 큰 몸매는 어떤 것일까?
책 125P
다음 사례를 보자. 이 사진은 성실성에 대해 두 아이를 평가한 것이다.
성실성 평균 점수는 두 아이가 똑같다. 그렇다면 두 아이는 모든 부문에서 같은 성실도를 보일까?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성실하기도, 덜 성실하기도 하다. 이 둘은 절대 같지 않다. 그런데 이 둘을 똑같이 평가하는게 맞을까?
책 166p
이 책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차원 적이며, 평균과 멀어진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1. 들쭉날쭉의 원칙
2. 맥락의 원칙
3. 경로의 원칙
으로 설명한다.
들쭉날쭉의 원칙은 위 사진처럼 특정 요소마다 가진 능력이 들쭉날쭉 하다는 것이며, 이를 합쳐서 평균으로 내버리면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말한다.
맥락의 원칙은 두번째 성실성의 상황을 말한다. 항상 성실한게 아니라, 항상 게으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이다. 즉, 천성이란 없다고 말한다.
경로의 원칙은 사람들은 다 다른 경로를 거쳐서 발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생아가 뒤집기부터 걷기까지 발달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석적인 순서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예시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아기들을 관찰해보니, 아기들 모두가 걷기까지의 순서가 달랐다. 발달과정의 정석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발달 기간도 모두가 달랐다. 평균이 1년이라고 해서, 그보다 늦게 걷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리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걷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잘 걷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각자마다 순서도 다르고 시기도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후 ...책 내용이 긴데, 여기서 줄인다. 얼른 다음 책을 읽으러 가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의 고정관념에 새로운 금을 만들어준 책이다. 이 책을 만나 너무 기쁘다.
4.0과 4.5를 고민하다가 4.5을 주었는데 이유는 여자친구에게 책 점수를 너무 짜게 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4.0이든 4.5든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만 다음 책을 읽으러 떠난다 안녕


2명이 좋아해요
2022년 10월 18일
 2
2
 0
0
데카콘을 만들 남자님의 다른 게시물

데카콘을 만들 남자
@izrin
다른 창업 연대기와 다르게, 어쩌면 정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이루어낸 이야기라 더 욱 용기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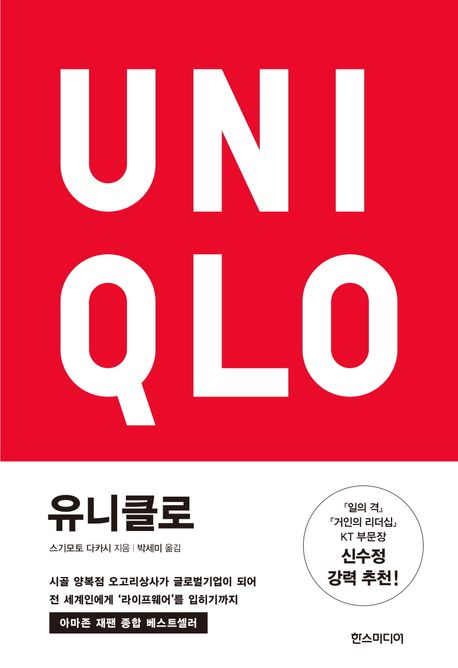
유니클로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주 전
 0
0
 0
0

데카콘을 만들 남자
@iz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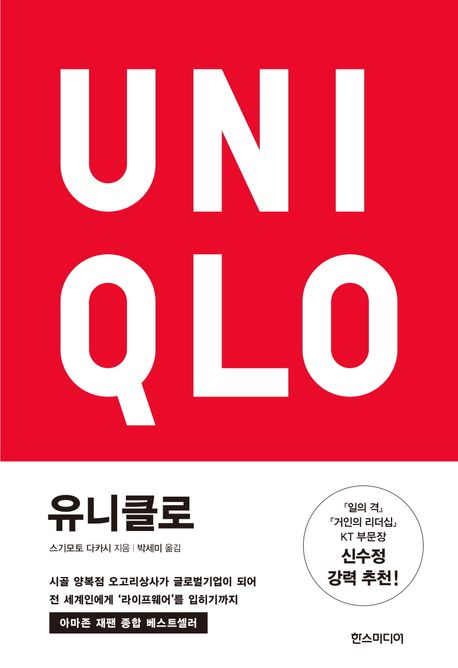
유니클로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주 전
 0
0
 0
0

데카콘을 만들 남자
@izrin
10년 전부터 중국이 뜬다 뜬다 했지만, 그럼에도 늘 미국이 이긴다고 했었다
하지만 중국은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지만 중국은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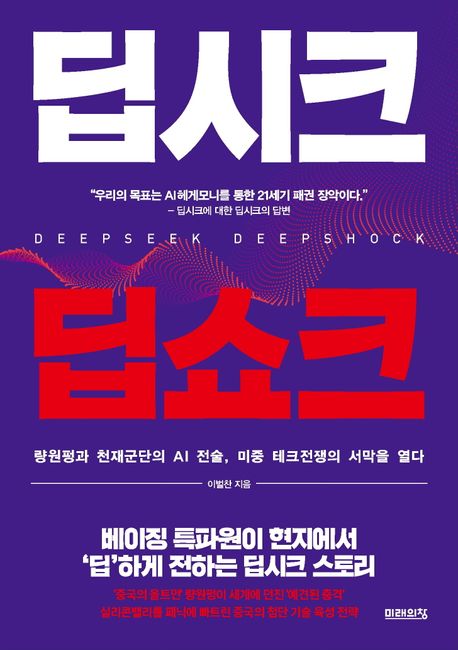
딥시크 딥쇼크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주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