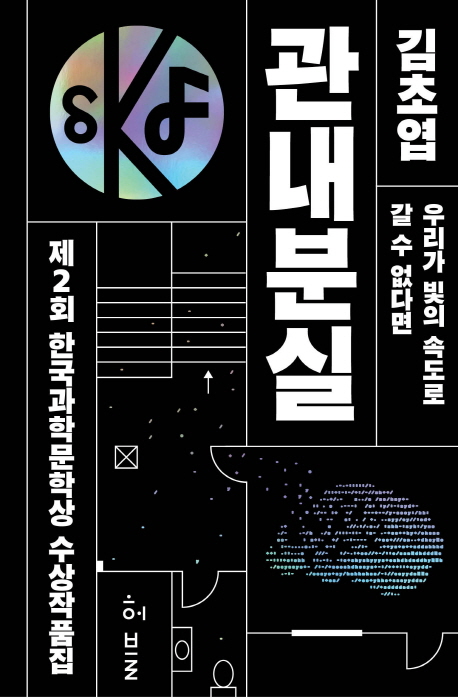김성호
@goldstarsky
+ 팔로우


SF세계까지 끌고온 문제의식이 식상하다. 성취가 없음에도 모두가 어마어마한 성취처럼 상찬하는 심사평이 민망할 지경. 여자이며 엄마라는 치트키는 이제 그만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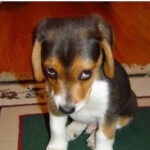
2명이 좋아해요
2024년 1월 14일
 2
2
 0
0
김성호님의 다른 게시물

김성호
@goldstarsky
'사람이 온다는 건 /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유명한 시구를 나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순간에 떠올린다. 캄보디아에서 온 31살 여성 누온 속행이 비닐하우스에서 얼어죽었을 때,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현장에 돼지머리가 놓였을 때,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때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가 긴급체포돼 123회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침을 당했을 때, 올해 1분기에만 20명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단 통계를 찾아냈을 때. 나는 나와, 내 이웃과, 내 나라가 다른 누구의 일생을 존중하며 맞이하고 있는가를 의심한다.
소설은 반세기 전 독일의 한국 노동자들과 오늘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같은 시선에서 바라보도록 이끈다. 그 시절 한국 노동자에게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땅의 이주노동자에게도 귀한 마음들이 깃들어 있음을 알도록 한다.
정현종의 유명한 시구를 나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순간에 떠올린다. 캄보디아에서 온 31살 여성 누온 속행이 비닐하우스에서 얼어죽었을 때,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현장에 돼지머리가 놓였을 때,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때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가 긴급체포돼 123회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침을 당했을 때, 올해 1분기에만 20명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단 통계를 찾아냈을 때. 나는 나와, 내 이웃과, 내 나라가 다른 누구의 일생을 존중하며 맞이하고 있는가를 의심한다.
소설은 반세기 전 독일의 한국 노동자들과 오늘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같은 시선에서 바라보도록 이끈다. 그 시절 한국 노동자에게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땅의 이주노동자에게도 귀한 마음들이 깃들어 있음을 알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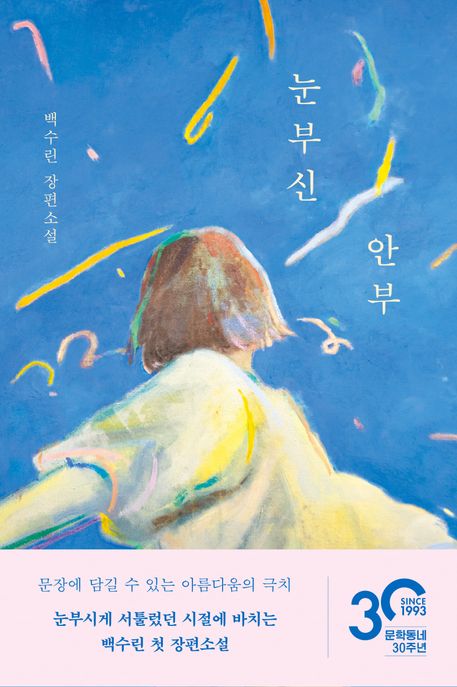
눈부신 안부


2명이 좋아해요
1개월 전
 2
2
 0
0

김성호
@goldstarsky
식민지마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지난 체제의 부조리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봉건사회의 완성형은, 소수의 사디스트와 다수의 마조히스트로 구성된 것'이라는 통찰은 이를 냉철히 되짚어 반성한 적 없는 모든 사회에서 폭력과 존엄의 훼손이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알도록 한다.
잔혹하고 처절한 묘사로 악명 높은 작품이다. 잔혹을 수단 삼아 인간의 극한에 다가선다. 잔혹함을, 또 폭력을 그대로 그를 비판하기 위한 창작의 장치로 활용하는 선택이 천재적이다. 폭력이 짙어질수록 폭력에 대한 비판 또한 강렬해지는 이 영리한 설정은 그를 부담스럽게 여겨온 이마저 일거에 감탄케 한다.
이로부터 일본에도 제 역사를 처절하게 반성하는 작가가 있었단 걸 알았다. 이로부터 봉건질서를 지나온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걸 깨우쳤다. 봉건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압제는 마땅히 그를 지나온 모두로부터 통렬히 비판되고 반성돼야 하는 것이다.
잔혹하고 처절한 묘사로 악명 높은 작품이다. 잔혹을 수단 삼아 인간의 극한에 다가선다. 잔혹함을, 또 폭력을 그대로 그를 비판하기 위한 창작의 장치로 활용하는 선택이 천재적이다. 폭력이 짙어질수록 폭력에 대한 비판 또한 강렬해지는 이 영리한 설정은 그를 부담스럽게 여겨온 이마저 일거에 감탄케 한다.
이로부터 일본에도 제 역사를 처절하게 반성하는 작가가 있었단 걸 알았다. 이로부터 봉건질서를 지나온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걸 깨우쳤다. 봉건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압제는 마땅히 그를 지나온 모두로부터 통렬히 비판되고 반성돼야 하는 것이다.

시구루이 1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개월 전
 0
0
 0
0

김성호
@goldstarsky
노미영 작가의 데뷔작으로 원나라 침입에 맞선 고려의 무장이 실은 현재로부터의 시간여행을 한 고등학생이라는 상상으로부터 흥미롭게 빚어낸 작품이다. 요즘 또 유행하는 전형적 회귀물이지만 당대에선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원나라 침입 시기를 다뤄 눈길을 끈다.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을 적극 버무린 픽션의 결합. 그 결과물이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판타지적 사극으로 귀결됐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려의 박서 장군이 살리타가 이끌던 원나라 군대를 귀주에서 격파하고, 재차 처들어온 살리타를 승장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사살한 건 의미 있는 전공임에도 널리 알려지진 못한 사실이었다. 노미영 작가는 역사책 한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던 사건으로부터 매력적인 드라마를 뽑아냈고 이것으로 이 만화가 생명력을 얻었다.
매력적이고 아기자기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구성, 자기색깔이 분명한 필치까지 압도적이진 않지만 모든 면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좋았다.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을 적극 버무린 픽션의 결합. 그 결과물이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판타지적 사극으로 귀결됐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려의 박서 장군이 살리타가 이끌던 원나라 군대를 귀주에서 격파하고, 재차 처들어온 살리타를 승장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사살한 건 의미 있는 전공임에도 널리 알려지진 못한 사실이었다. 노미영 작가는 역사책 한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던 사건으로부터 매력적인 드라마를 뽑아냈고 이것으로 이 만화가 생명력을 얻었다.
매력적이고 아기자기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구성, 자기색깔이 분명한 필치까지 압도적이진 않지만 모든 면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좋았다.

살례탑 1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개월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