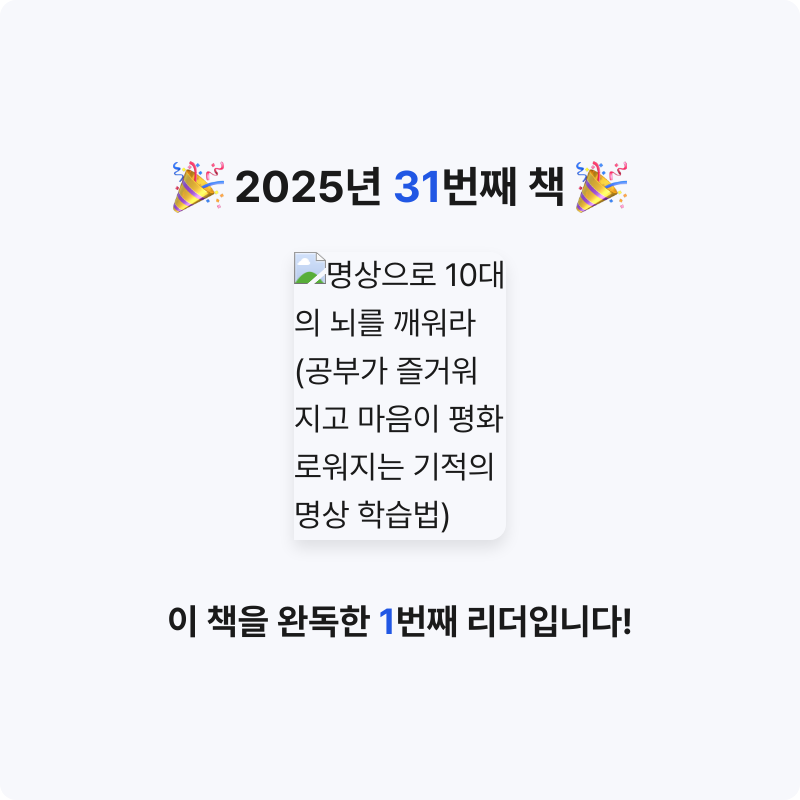자유이
@jayuyi
+ 팔로우


걱정이라는 이름의 뒷담화
—
“이미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그동안 마리아 이모님 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지, 이제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함께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하늘 높이 아름답게》, 107p
죽은 마리아를 애도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기도라는 명분 아래 그녀의 삶을 들춰본다. 진심 어린 위로라기보다는, 삶을 마친 사람을 소재 삼아 이야깃거리로 삼는 분위기.
기도는 거들 뿐, 결국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복잡하고 고단했던 생애는 누군가의 궁금증으로 추락하고 만다.
같은 신자로서 부끄럽다. 하느님의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위선적인 말들이 배려와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쏟아졌는지 돌아보게 된다.
대화 주제가 없어 시작된 가십은, 어느새 걱정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불쌍하다”는 말로 소비되는 누군가의 불행에는, 사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걱정이라는 말 아래 숨어버린 참견과 뒷말. 기도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소비하는 태도. 그 모든 것 앞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말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겠다.
—
“이미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그동안 마리아 이모님 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지, 이제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함께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하늘 높이 아름답게》, 107p
죽은 마리아를 애도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기도라는 명분 아래 그녀의 삶을 들춰본다. 진심 어린 위로라기보다는, 삶을 마친 사람을 소재 삼아 이야깃거리로 삼는 분위기.
기도는 거들 뿐, 결국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복잡하고 고단했던 생애는 누군가의 궁금증으로 추락하고 만다.
같은 신자로서 부끄럽다. 하느님의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위선적인 말들이 배려와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쏟아졌는지 돌아보게 된다.
대화 주제가 없어 시작된 가십은, 어느새 걱정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불쌍하다”는 말로 소비되는 누군가의 불행에는, 사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걱정이라는 말 아래 숨어버린 참견과 뒷말. 기도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소비하는 태도. 그 모든 것 앞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말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겠다.

1명이 좋아해요
21시간 전
 1
1
 0
0
자유이님의 다른 게시물

자유이
@jayuyi
반희씨와 울엄마
—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관심도 간섭도 다 폭력 같아. 모욕 같고.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고요하게 사는 게 내 목표야. 마지막 자존심이고,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
— 《실버들 천만사》, 75p
반희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던 인물이다. 더는 자신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결국 가족을 떠나기로 한다. 그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안에서 반희의 마지막 자존심과 생존 의지를 본다.
우리 엄마는 반희와는 달랐다. 이기적인 남편으로부터 우리 남매를 지키고자, 엄마는 끝까지 희생하는 쪽을 택했다. 그 모든 결정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성인이 되고 나서야 머리로는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혼한 이후에도 엄마는 매달 나를 보고 싶어 한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딸과의 데이트를 이제라도 하고 싶으신가 보다.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만나러 나가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는다. 이제 와서 평범한 모녀 역할을 하려는 엄마의 모습이, 솔직히 말해 때때로 역겹게 느껴지기도 한다.
차라리 엄마가 반희처럼 이기적이었더라면, 그땐 서운했겠지만 지금쯤은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일방적인 희생이 만든 끈은 나를 옭아매고, 되려 내 감정을 눌러왔다.
반희처럼 살았다면, 엄마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도 채운이처럼, 지금쯤 엄마에게 더 솔직하게 고백하고, 더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관심도 간섭도 다 폭력 같아. 모욕 같고.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고요하게 사는 게 내 목표야. 마지막 자존심이고,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
— 《실버들 천만사》, 75p
반희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던 인물이다. 더는 자신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결국 가족을 떠나기로 한다. 그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안에서 반희의 마지막 자존심과 생존 의지를 본다.
우리 엄마는 반희와는 달랐다. 이기적인 남편으로부터 우리 남매를 지키고자, 엄마는 끝까지 희생하는 쪽을 택했다. 그 모든 결정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성인이 되고 나서야 머리로는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혼한 이후에도 엄마는 매달 나를 보고 싶어 한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딸과의 데이트를 이제라도 하고 싶으신가 보다.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만나러 나가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는다. 이제 와서 평범한 모녀 역할을 하려는 엄마의 모습이, 솔직히 말해 때때로 역겹게 느껴지기도 한다.
차라리 엄마가 반희처럼 이기적이었더라면, 그땐 서운했겠지만 지금쯤은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일방적인 희생이 만든 끈은 나를 옭아매고, 되려 내 감정을 눌러왔다.
반희처럼 살았다면, 엄마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도 채운이처럼, 지금쯤 엄마에게 더 솔직하게 고백하고, 더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각각의 계절
 읽고있어요
읽고있어요

1명이 좋아해요
1일 전
 1
1
 0
0

자유이
@jayuyi

명상으로 10대의 뇌를 깨워라
 읽었어요
읽었어요

1명이 좋아해요
3일 전
 1
1
 0
0

자유이
@jayuyi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
“나도 안 그려져 부영아, 난 그냥 과정이 재밌어.
장면이 하나 있으면, 관객들은 쓱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걸 쓸 때는 거기 들어갈 배경, 인물, 구도, 제스처, 대사
그런 걸 하나하나 상상하면서 다듬어가야 되거든.
빈칸을 메우듯이 친근하게 해나가는 그 과정이 난 좋아.
그러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좋기만 하다 아무것도 안 되면?
배우 되는 재능 따로 있고, 연출에서 감독 되는 능력 따로 있다.
둘은 아주 다른 파트라고.
그렇게 근사하게 꿈만 꾸다 아무것도 안 되고,
평생 아마추어로만 살아도 행복하겠냐?
한평생 난 연극 한다 그런 자부심만으로 버틸 수 있어?”
— 《사슴벌레식 문답》, 24p
정원이는 결과보다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연극을 선택했다.
무엇이 될지 불분명했지만, 그 과정을 사랑했고,
그 감정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그래서 뭐가 될 건데?” 같은 질문이었다.
왜 사람들은 ‘좋아한다’로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꼭 뭔가를 이뤄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걸까?
—
“나도 안 그려져 부영아, 난 그냥 과정이 재밌어.
장면이 하나 있으면, 관객들은 쓱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걸 쓸 때는 거기 들어갈 배경, 인물, 구도, 제스처, 대사
그런 걸 하나하나 상상하면서 다듬어가야 되거든.
빈칸을 메우듯이 친근하게 해나가는 그 과정이 난 좋아.
그러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좋기만 하다 아무것도 안 되면?
배우 되는 재능 따로 있고, 연출에서 감독 되는 능력 따로 있다.
둘은 아주 다른 파트라고.
그렇게 근사하게 꿈만 꾸다 아무것도 안 되고,
평생 아마추어로만 살아도 행복하겠냐?
한평생 난 연극 한다 그런 자부심만으로 버틸 수 있어?”
— 《사슴벌레식 문답》, 24p
정원이는 결과보다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연극을 선택했다.
무엇이 될지 불분명했지만, 그 과정을 사랑했고,
그 감정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그래서 뭐가 될 건데?” 같은 질문이었다.
왜 사람들은 ‘좋아한다’로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꼭 뭔가를 이뤄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걸까?

각각의 계절
 읽고있어요
읽고있어요

1명이 좋아해요
3일 전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