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식마
@bearcc98
+ 팔로우


내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도서관에 도서대출카드가 있었다. 왜인지 고등학교 도서관에 대한 기억이 없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바코드로 빌렸는데 가끔 오래된 책을 빌리면 뒤에 대출카드가 꼽혀있었다. 그런 책은 빌리면서 괜히 기분이 으쓱해졌다.
516도로, 4.3학살 제주도도 아픔이 많은 도시였네..
글은 참 신기하다.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떤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사람에 대한 묘사를 읽고 나면 꼭 아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
전주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지내는 5년동안에도 몇명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도 전주를 거쳐갔다. 그 도시는 뭐가 그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일까?
다시 목차를 봤다. 분명히 '맛의 발견' 챕터가 맞다. '물고기의 발견'이 아니다. 물고기를 엄청 좋아하시나부다. 물고기요리가 89프로인 것 같다. 물고기를 먹지 않는 나로서는 좀 과장해서 고문에 가까운(?) 챕터.
북한이라는 존재는 나에게는 딴 나라로 이민 가 버린 형제같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만나지 못한다. 북한의 주의가 좋고 나쁨 이런건 사실 모르겠다. 그냥 안도현 시인이 표현하는 글처럼 문득문득 떠오르고, 나는 추억이 전혀 없지만 오래전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째서 좋고 나쁨으로만 판단 해야하는 것일까. 멋대로 흑백논리를 펼치고 멋대로 분류해 버린다. 그리고 자신과 다르면 마녀사냥을 당연하다는 듯이 한다. 그래봤자 자기얼굴에 침뱉는격 아닌가..
가끔은 내가 지금 2014년에 살고있는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냥 나는 백두산에 올라가 보고싶고, 진짜 평양랭면을 먹고 싶고 중국을 기차타고 가보고 싶을 뿐이다.
꽃하면 철쭉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학교 다닐때 봄이 되면 우리 단대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꽃이었다. 심지어 색깔도 통일했는지 전부 빨간색이었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인문대, 농대랑 다르게 공대는 항상 빨간 철쭉이었다. 우리 단대로 넘어오면 벚꽃나무가 사라졌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벚꽃구경하러 옆단대로 놀러가곤 했다. 돌아오는 봄. 이제 벚꽃구경은 어디로 가야하나.
'공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읽고 있으면 그냥 차분해지고 그의 앞마당에, 작업실에, 술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141224
516도로, 4.3학살 제주도도 아픔이 많은 도시였네..
글은 참 신기하다.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떤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사람에 대한 묘사를 읽고 나면 꼭 아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
전주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지내는 5년동안에도 몇명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도 전주를 거쳐갔다. 그 도시는 뭐가 그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일까?
다시 목차를 봤다. 분명히 '맛의 발견' 챕터가 맞다. '물고기의 발견'이 아니다. 물고기를 엄청 좋아하시나부다. 물고기요리가 89프로인 것 같다. 물고기를 먹지 않는 나로서는 좀 과장해서 고문에 가까운(?) 챕터.
북한이라는 존재는 나에게는 딴 나라로 이민 가 버린 형제같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만나지 못한다. 북한의 주의가 좋고 나쁨 이런건 사실 모르겠다. 그냥 안도현 시인이 표현하는 글처럼 문득문득 떠오르고, 나는 추억이 전혀 없지만 오래전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째서 좋고 나쁨으로만 판단 해야하는 것일까. 멋대로 흑백논리를 펼치고 멋대로 분류해 버린다. 그리고 자신과 다르면 마녀사냥을 당연하다는 듯이 한다. 그래봤자 자기얼굴에 침뱉는격 아닌가..
가끔은 내가 지금 2014년에 살고있는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냥 나는 백두산에 올라가 보고싶고, 진짜 평양랭면을 먹고 싶고 중국을 기차타고 가보고 싶을 뿐이다.
꽃하면 철쭉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학교 다닐때 봄이 되면 우리 단대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꽃이었다. 심지어 색깔도 통일했는지 전부 빨간색이었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인문대, 농대랑 다르게 공대는 항상 빨간 철쭉이었다. 우리 단대로 넘어오면 벚꽃나무가 사라졌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벚꽃구경하러 옆단대로 놀러가곤 했다. 돌아오는 봄. 이제 벚꽃구경은 어디로 가야하나.
'공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읽고 있으면 그냥 차분해지고 그의 앞마당에, 작업실에, 술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141224


2명이 좋아해요
2017년 6월 25일
 2
2
 0
0
구식마님의 다른 게시물

구식마
@bearcc98
기나긴 여정의 시작.
나가 도깨비 레콘 그리고 나가를 먹는 인간
이 여정의 끝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케이건은 그토록 염원한 왕일까?
종이책으로 몇번 도전하다가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워가지고 완독을 실패했는데 이북리더기 생기면서 드디어 완독!
초반엔 인물 소개같은 부분들이 쪼오금 지루 할 수 있는데 어느정도를 넘어서면 몰입감이 장난 아니다.
자꾸만 레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나가의 목소리가 대체 어느정도길래?! 하는 궁금증도 생긴다.
혹시 영상미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다면 유툽에 눈물을 마시는 새를 검색해보길 추천! 진짜 그래픽이 압도적이고 나가의 비늘 움직이는게 이런걸까 싶어지면서 책에 몰입도를 한층 더! 올려준다.
24.09.22
나가 도깨비 레콘 그리고 나가를 먹는 인간
이 여정의 끝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케이건은 그토록 염원한 왕일까?
종이책으로 몇번 도전하다가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워가지고 완독을 실패했는데 이북리더기 생기면서 드디어 완독!
초반엔 인물 소개같은 부분들이 쪼오금 지루 할 수 있는데 어느정도를 넘어서면 몰입감이 장난 아니다.
자꾸만 레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나가의 목소리가 대체 어느정도길래?! 하는 궁금증도 생긴다.
혹시 영상미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다면 유툽에 눈물을 마시는 새를 검색해보길 추천! 진짜 그래픽이 압도적이고 나가의 비늘 움직이는게 이런걸까 싶어지면서 책에 몰입도를 한층 더! 올려준다.
24.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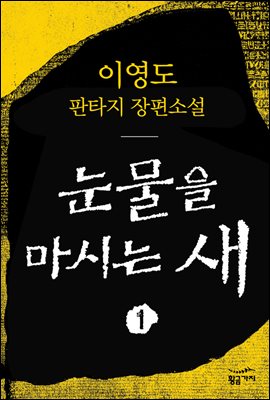
눈물을 마시는 새 1
👍
인생이 재미 없을 때
추천!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024년 9월 26일
 0
0
 0
0

구식마
@bearcc98
드라마는 보지 않고 책부터 시작
난해한 과학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흡입력이 미친 책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우주에 있는 또다른 외계 문명에 대해 말한다. 그 외계생명체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정말 찾아낸 목적이 지구 침공이라면?
중간중간 반전들때문에 읽으면서 눈이 ㅇ0ㅇ 이렇게 됐었다. 육성으로 아니! 아니?! 아니이!!? 를 몇번을 외쳤는지ㅋㅋㅋㅋ
읽다가 드라마로 대체!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너무 궁금해서 유투브 검색까지 해봤다.
인간은 아무튼 대단해
24.09.26
난해한 과학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흡입력이 미친 책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우주에 있는 또다른 외계 문명에 대해 말한다. 그 외계생명체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정말 찾아낸 목적이 지구 침공이라면?
중간중간 반전들때문에 읽으면서 눈이 ㅇ0ㅇ 이렇게 됐었다. 육성으로 아니! 아니?! 아니이!!? 를 몇번을 외쳤는지ㅋㅋㅋㅋ
읽다가 드라마로 대체!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너무 궁금해서 유투브 검색까지 해봤다.
인간은 아무튼 대단해
24.0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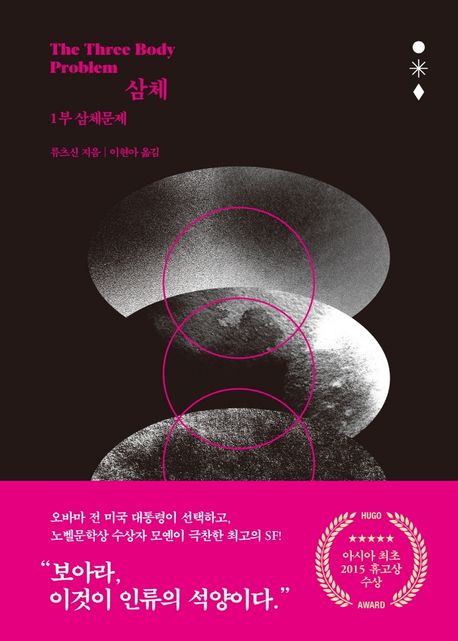
삼체 1부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024년 9월 26일
 0
0
 0
0

구식마
@bearcc98
우물 안 개구리 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글.
그래서 무사히 황야를 벗어났을까?
그래서 무사히 황야를 벗어났을까?

꿰맨 눈의 마을

1명이 좋아해요
2024년 9월 8일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