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경
@dongkyung
+ 팔로우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목적 없이 서성이다 발견했다. 제목이 아주 익숙하고 누군가 읽는 장면을 많이 보았던 책이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빌려 집으로 왔다. 제법 무거운 두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작가를 꿈꾸는 ‘나’와 해보지 않은 일이 없는 신밧드 ‘조르바’에 대한 이야기다. 어쩌면 ‘나’는 작가일테고, 조르바는 그의 친구-학교-동료 등등 이었을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첫장면에 이별하는 ‘친구’를 사랑했고 그 이후 조르바를 사랑한 것 같다. 우정…으로 사랑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이놈들. 여튼, 둘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이 책에 대한 내 감상을 남기려면 일단 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뭐가 문제일까. 작가? 시대 배경? 모조리 다 문제가 많다. 여성을 자기 발가락보다 못하게 여긴다. 책을 한 장만 읽어도 오만가지 단어로 여성을 비하한다. 누구네 딸은 이래서 문제고, 저 과부는 이래서 문제다. 혼자사는 그 여자는 이래서 문제가 많다. 너무 적나라하고 충격적인 말들로 여성을 무시한다. 읽는 내내 조소가 끊이지 않았고 뒷목을 타고 분노가 올라왔다. 잊을 수 없는 빡치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차마 기록으로 남겨 내 기분이 더 나빠지고 싶지는 않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냐는 김첨지는 가소로운 수준이다.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 숨은 뜻을 담고 있더라도 이런 책을 계속 읽어’줘’서는 안된다. 그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고 넘기기엔 도를 넘은 혐오이고 무시이며 죄악이다. 앞으로 나무들에게 싹싹 빌어 사죄해야 하는 책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실존주의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관심이 있던 주제여서 책을 읽으면서도 어? 이거? 싶었다. 조르바가 가진 여러 생각은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곱씹게 되기도 한다. 필사한 문장도 여럿 있다.
근데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난다. 600페이지가 조금 안되는 이 책을 중간에 놓지 않고 끝까지 읽은 건 정말 오기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 혹은 작가가 어디까지 못돼쳐먹은 말만 하는지 보자. 근데 괜히 읽었다. 삼일? 동안 읽은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다른 이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p. 107 “아무것도 믿지 않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이 조르바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조르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오. -결코, 결단코 더 낫지 않소! 조르바란 녀석 또한 같은 야수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조르바를 믿는 이유는,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유일하게 내가 아는 존재이기 때문이오. 그 외의 존재들은 죄다 유령이오. 조르바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소화시키거든. 하지만 다시 말하건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유령일 뿐이오. 내가 죽으면 모든게 사라지는 거요. 조르바의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이오.”
p. 222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아무런 야망도 없으면서 모든 야망을 품은 듯 끈질기게 일하는 것.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되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크리스마스를 맞아 거나하게 먹고 마시는 것. 그러고 난 뒤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혼자서 머리 위에는 별들을, 왼쪽에는 육지를, 오른쪽에는 바다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갑자기 삶이 마음 속에서 기적을 이뤄냈다는 사실, 그래서 삶이 동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p. 478 나는 여전히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필연에 긍정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것을 자유의지의 행위로 바꾸어 놓는 것이 어쩌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잘 알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작가를 꿈꾸는 ‘나’와 해보지 않은 일이 없는 신밧드 ‘조르바’에 대한 이야기다. 어쩌면 ‘나’는 작가일테고, 조르바는 그의 친구-학교-동료 등등 이었을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첫장면에 이별하는 ‘친구’를 사랑했고 그 이후 조르바를 사랑한 것 같다. 우정…으로 사랑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이놈들. 여튼, 둘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이 책에 대한 내 감상을 남기려면 일단 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뭐가 문제일까. 작가? 시대 배경? 모조리 다 문제가 많다. 여성을 자기 발가락보다 못하게 여긴다. 책을 한 장만 읽어도 오만가지 단어로 여성을 비하한다. 누구네 딸은 이래서 문제고, 저 과부는 이래서 문제다. 혼자사는 그 여자는 이래서 문제가 많다. 너무 적나라하고 충격적인 말들로 여성을 무시한다. 읽는 내내 조소가 끊이지 않았고 뒷목을 타고 분노가 올라왔다. 잊을 수 없는 빡치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차마 기록으로 남겨 내 기분이 더 나빠지고 싶지는 않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냐는 김첨지는 가소로운 수준이다.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 숨은 뜻을 담고 있더라도 이런 책을 계속 읽어’줘’서는 안된다. 그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고 넘기기엔 도를 넘은 혐오이고 무시이며 죄악이다. 앞으로 나무들에게 싹싹 빌어 사죄해야 하는 책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실존주의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관심이 있던 주제여서 책을 읽으면서도 어? 이거? 싶었다. 조르바가 가진 여러 생각은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곱씹게 되기도 한다. 필사한 문장도 여럿 있다.
근데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난다. 600페이지가 조금 안되는 이 책을 중간에 놓지 않고 끝까지 읽은 건 정말 오기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 혹은 작가가 어디까지 못돼쳐먹은 말만 하는지 보자. 근데 괜히 읽었다. 삼일? 동안 읽은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다른 이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p. 107 “아무것도 믿지 않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이 조르바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조르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오. -결코, 결단코 더 낫지 않소! 조르바란 녀석 또한 같은 야수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조르바를 믿는 이유는,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유일하게 내가 아는 존재이기 때문이오. 그 외의 존재들은 죄다 유령이오. 조르바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소화시키거든. 하지만 다시 말하건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유령일 뿐이오. 내가 죽으면 모든게 사라지는 거요. 조르바의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이오.”
p. 222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아무런 야망도 없으면서 모든 야망을 품은 듯 끈질기게 일하는 것.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되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크리스마스를 맞아 거나하게 먹고 마시는 것. 그러고 난 뒤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혼자서 머리 위에는 별들을, 왼쪽에는 육지를, 오른쪽에는 바다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갑자기 삶이 마음 속에서 기적을 이뤄냈다는 사실, 그래서 삶이 동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p. 478 나는 여전히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필연에 긍정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것을 자유의지의 행위로 바꾸어 놓는 것이 어쩌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잘 알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3명이 좋아해요
2021년 8월 29일
 3
3
 0
0
동경님의 다른 게시물

동경
@dongkyung
너무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았다. 처음 이 책을 추천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저 나중에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딘가 적어두고 떠올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친구가 이 책을 읽으며 다른 이들과 감상을 나누고 싶다고 하자 문득 궁금해졌다. 그 어떤 내용도 모르는 채로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후기는 물론 책 표지도 제대로 안 보고 이북을 결제했다. 그리고 다 읽은 지금은… 내가 뭘 본 건지 잘 모르겠다.
혹시나 이 책을 읽을 예정이라면 나처럼 어떠한 예고편 없이 곧장 읽는 것을 추천한다. 이어지는 글은 물론 출판사의 책 소개도 읽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소문내고 다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좋았던 부분은 매우 좋았고 그 외 어떤 부분은 그저 그랬다. 분명 순간순간 나타나는 문장이 좋아서 소름돋은 팔로 필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단히 새롭거나 신선하거나 생각치 못한 반전의 결말이라거나 하는 종류의 ‘좋음’은 아니었다.
내용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읽는 것이 좋다보니 어떤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내가 과학, 특히 생물학에 전혀 관심이 없어 덜 재미있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다윈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당연한 거지만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쉽게 흥미를 느끼니 말이다.
주인공 아빠가 하는 말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남았다. 좋고 싫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내가 평소 종종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결이라서 그랬다. 주인공의 마음이 단단한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은 좋았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그 상태로 잠에 들었다가, 언젠가 다시 깨어나 설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아, 초반에 등장한 ‘혼돈’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다. 정확한 뜻의 범위가 없고 때에 따라 무엇이든 되고, 또한 무엇도 되지 않는 단어를 사랑한다. 혼돈이 그렇고 고결, 신뢰, 성장 같은 글자들이 그렇다.
이북으로 읽어 정확한 페이지를 표시하지 못하지만, 좋았던 문장 몇 개를 적는다.
“나 자신에 대해 가당치 않게 커다란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던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은, 바보의 표지가 아니라 승리자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혼돈은 우리의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동도. 절대 잊지 마라.” … “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너 좋을 대로 살아.”
혹시나 이 책을 읽을 예정이라면 나처럼 어떠한 예고편 없이 곧장 읽는 것을 추천한다. 이어지는 글은 물론 출판사의 책 소개도 읽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소문내고 다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좋았던 부분은 매우 좋았고 그 외 어떤 부분은 그저 그랬다. 분명 순간순간 나타나는 문장이 좋아서 소름돋은 팔로 필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단히 새롭거나 신선하거나 생각치 못한 반전의 결말이라거나 하는 종류의 ‘좋음’은 아니었다.
내용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읽는 것이 좋다보니 어떤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내가 과학, 특히 생물학에 전혀 관심이 없어 덜 재미있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다윈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당연한 거지만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쉽게 흥미를 느끼니 말이다.
주인공 아빠가 하는 말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남았다. 좋고 싫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내가 평소 종종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결이라서 그랬다. 주인공의 마음이 단단한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은 좋았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그 상태로 잠에 들었다가, 언젠가 다시 깨어나 설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아, 초반에 등장한 ‘혼돈’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다. 정확한 뜻의 범위가 없고 때에 따라 무엇이든 되고, 또한 무엇도 되지 않는 단어를 사랑한다. 혼돈이 그렇고 고결, 신뢰, 성장 같은 글자들이 그렇다.
이북으로 읽어 정확한 페이지를 표시하지 못하지만, 좋았던 문장 몇 개를 적는다.
“나 자신에 대해 가당치 않게 커다란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던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은, 바보의 표지가 아니라 승리자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혼돈은 우리의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동도. 절대 잊지 마라.” … “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너 좋을 대로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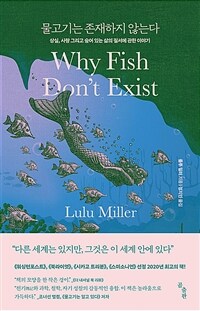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명이 좋아해요
2022년 4월 19일
 2
2
 0
0

동경
@dongkyung
테드 창의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만 보이면 손이 간다. 소설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 천천히 읽히긴 하지만 다 읽고 책장을 덮었을 때의 쾌감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영화 <컨택트>의 원작 소설이 담긴 단편집이다. 그러나 나는 그걸 책 다 읽고 알았다. 그 원작 소설에서 더 나아가 다시 쓴 글인줄 알았는데, 그냥 각색이 되어서 내가 못 알아본거다! 두둥. 그리고 내가 매우 재미있게 읽은 그의 책 <숨> 보다 먼저 나온 책이라고 한다. 어째,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
책 제목인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8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예 짧은 단편은 아니고 중단편 정도? 책 전체가 450페이지 가량 되니 제법 두껍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이야기가 정말 신선하고 획기적으로 느껴졌다.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거지? 싶고, 인간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어떤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하는 등장인물을 배치하여 나는 누구와 가장 비슷한 의견인지 누구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지 자연스럽게 고민하도록 만든 부분이 좋았다. 독자 생각의 한계를 두지 않도록 배려하는 느낌이 들었다.
8개의 단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글은, 아무래도 책의 제목인 <네 인생의 이야기>이다. 영화 <컨택트>를 본지 너무 오래되어 또렷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이 소설의 결말과 매우 달랐던 것 같다. 아무튼 소설 속에서 루이즈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결심을 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깊었다. 이야기의 시점이 과거, 혹은 현재와 미래를 왔다갔다 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더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은 글이 가진 큰 장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글을 읽을 누군가가 나 때문에 결말을 미리 알아버리지 않았으면 해서 더 자세한 말은 못하겠지만, 루이즈는 직업적으로도 또한 ‘인간’적으로도 매우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전례가 없던 일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좌절할 것을 알지만 시작한다는 점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도 정말 재미있다. 특히 무분별한 미디어가 폭력적으로 인간을, 인류를 공격하는 장면에서는 나도 등장인물 몇몇과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에 더욱 재미있었다. 칼리아그노시아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의무화는 안된다는 사실 뿐이지만, 실제로 그런 기술이 발명된다면 작가의 창작노트에 적힌 것과 같이 나도 시험해보고 싶다.
p.122 <영으로 나누면>
1과 2는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잘 알려진 ‘증명’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런 정의로 시작된다. “a=1, b=1이라고 하자.” 그리고 a=2a, 즉 1은 2라는 결론으로 끝난다. 증명 과정 중간쯤 눈에 안 띄게 숨어 있는 것은 0으로 나누기이다. 그 시점에서 이 증명은 벼랑 너머로 한 발을 내딛으며 모든 법칙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0으로 나누는 것을 인정한다면 1과 2는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두개의 수도-실수이든 허수이든, 유리수이든 무리수이든-같다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영화 <컨택트>의 원작 소설이 담긴 단편집이다. 그러나 나는 그걸 책 다 읽고 알았다. 그 원작 소설에서 더 나아가 다시 쓴 글인줄 알았는데, 그냥 각색이 되어서 내가 못 알아본거다! 두둥. 그리고 내가 매우 재미있게 읽은 그의 책 <숨> 보다 먼저 나온 책이라고 한다. 어째,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
책 제목인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8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예 짧은 단편은 아니고 중단편 정도? 책 전체가 450페이지 가량 되니 제법 두껍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이야기가 정말 신선하고 획기적으로 느껴졌다.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거지? 싶고, 인간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어떤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하는 등장인물을 배치하여 나는 누구와 가장 비슷한 의견인지 누구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지 자연스럽게 고민하도록 만든 부분이 좋았다. 독자 생각의 한계를 두지 않도록 배려하는 느낌이 들었다.
8개의 단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글은, 아무래도 책의 제목인 <네 인생의 이야기>이다. 영화 <컨택트>를 본지 너무 오래되어 또렷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이 소설의 결말과 매우 달랐던 것 같다. 아무튼 소설 속에서 루이즈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결심을 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깊었다. 이야기의 시점이 과거, 혹은 현재와 미래를 왔다갔다 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더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은 글이 가진 큰 장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글을 읽을 누군가가 나 때문에 결말을 미리 알아버리지 않았으면 해서 더 자세한 말은 못하겠지만, 루이즈는 직업적으로도 또한 ‘인간’적으로도 매우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전례가 없던 일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좌절할 것을 알지만 시작한다는 점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도 정말 재미있다. 특히 무분별한 미디어가 폭력적으로 인간을, 인류를 공격하는 장면에서는 나도 등장인물 몇몇과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에 더욱 재미있었다. 칼리아그노시아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의무화는 안된다는 사실 뿐이지만, 실제로 그런 기술이 발명된다면 작가의 창작노트에 적힌 것과 같이 나도 시험해보고 싶다.
p.122 <영으로 나누면>
1과 2는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잘 알려진 ‘증명’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런 정의로 시작된다. “a=1, b=1이라고 하자.” 그리고 a=2a, 즉 1은 2라는 결론으로 끝난다. 증명 과정 중간쯤 눈에 안 띄게 숨어 있는 것은 0으로 나누기이다. 그 시점에서 이 증명은 벼랑 너머로 한 발을 내딛으며 모든 법칙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0으로 나누는 것을 인정한다면 1과 2는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두개의 수도-실수이든 허수이든, 유리수이든 무리수이든-같다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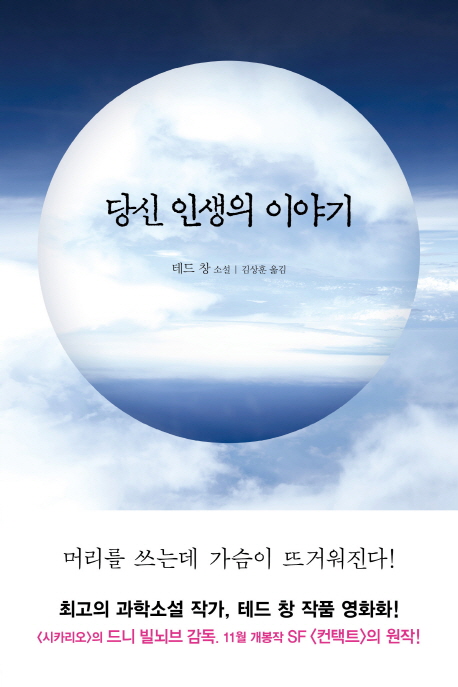
당신 인생의 이야기



3명이 좋아해요
2022년 2월 23일
 3
3
 0
0

동경
@dongkyung
존엄이라는 말에 이끌려 읽게 되었다. 분명 알고 있지만 그다지 쓸 일이 많지 않은, 하지만 파고들자면 너무도 중요한 ‘존엄’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그 누구도 타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없다. 그러나 헌법과 별개로 우리는 살면서 존엄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떠올릴까? 나는 존엄한 사람이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그리고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가? 존엄은 곧 인간의 필요요소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없이 존엄을 설명할 순 없다. 존엄하다는 말은 곧 인간답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곧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작가는 여러 시야로 존엄을 바라본다. 교육, 환경 혹은 자연, 경제, 과학과 의학적 관점에서 말이다. 또한 존엄이 언제부터 존재한 개념인지 그 역사적으로 가진 의미도 훑는다. 매우 다양한 정보를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다지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그러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 나머지 깊이가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건 곧 전문 지식 없이도 책 읽기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존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책 전체가 추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와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무의식 중에 쳐박혀 있던 존엄이라는 말이 다시 내 머릿속을 돌아다니게, 그리하여 존엄에 대한 나의 생각을 환기하고 재정립 하는 데에 무척 도움이 되었다.
지금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읽기 매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상깊어 필사한 문장 몇 개를 함께 적는다.
p. 49 우리는 인간 두뇌의 처리 능력을 넘어선 정보를 폭식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로 지나치게 분주하며,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 온갖 추측과 편견, 평가와 의도의 포로가 된 것이다.
p. 73-74 한 사람의 존엄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타인에 의해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할 때도 상처입는다. …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인간 고유의 강한 본성이자,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자 상태.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늘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언가.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존재할 무언가. 바로 그것이 존엄인 것이다.
작가는 여러 시야로 존엄을 바라본다. 교육, 환경 혹은 자연, 경제, 과학과 의학적 관점에서 말이다. 또한 존엄이 언제부터 존재한 개념인지 그 역사적으로 가진 의미도 훑는다. 매우 다양한 정보를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다지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그러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 나머지 깊이가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건 곧 전문 지식 없이도 책 읽기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존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책 전체가 추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와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무의식 중에 쳐박혀 있던 존엄이라는 말이 다시 내 머릿속을 돌아다니게, 그리하여 존엄에 대한 나의 생각을 환기하고 재정립 하는 데에 무척 도움이 되었다.
지금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읽기 매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상깊어 필사한 문장 몇 개를 함께 적는다.
p. 49 우리는 인간 두뇌의 처리 능력을 넘어선 정보를 폭식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로 지나치게 분주하며,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 온갖 추측과 편견, 평가와 의도의 포로가 된 것이다.
p. 73-74 한 사람의 존엄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타인에 의해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할 때도 상처입는다. …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인간 고유의 강한 본성이자,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자 상태.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늘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언가.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존재할 무언가. 바로 그것이 존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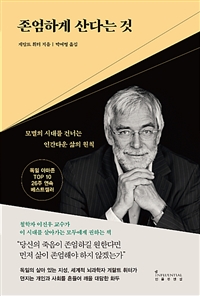
존엄하게 산다는 것

1명이 좋아해요
2022년 2월 15일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