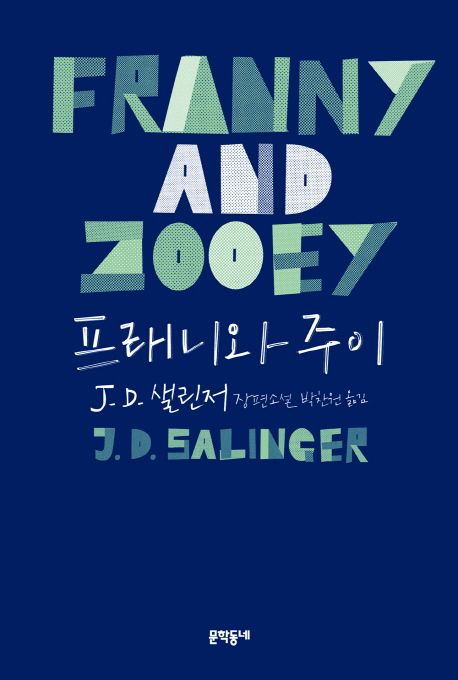김성호
@goldstarsky
+ 팔로우


처음엔 단편적으로, 그러다가 아예 똑바로, 그는 창문 아래 다섯 층 밑 길 건너에서, 한 장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작가도, 연출자도, 제작자도 끼어들지 않고 펼쳐지고 있는 연기였다. 꽤 큰 단풍나무 한 그루가-이 거리에서 운이 좋은 쪽에 있는 네댓 그루 중 하나였다-여자사립 고등학교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일고여덟 살 정도의 여자아이 하나가 그 나무 뒤에 숨고 있었다. 아이는 짙은 파란색 리퍼 재킷에 빵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는 반 고흐의 <아를의 방>에 있던 침대 위 담요와 아주 흡사한 빨간색이었다. 아이의 빵모자는 사실 주이의 위치에서는 물감을 한 번 톡 칠해놓은 것처럼 보였다. 아이로부터 4~5미터 떨어진 곳에 아이의 개가, 줄이 달린 초록색 개목걸이를 한 어린 닥스훈트 한 마리가 아이를 찾기 위해 킁킁 원을 그리며 정신없이 맴돌고 있었고, 개줄이 그 뒤에서 질질 끌리고 있었다. 헤어짐의 괴로움은 개에게 거의 견딜 수 없는 것이었기에 마침내 주인 아이의 냄새를 맡게 되었을 때에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만 같았다. 다시 만난 기쁨은 둘 모두에게 아주 큰 것이었다. 닥스훈트는 작게 짖으며, 희열로 춤을 추듯 앞으로 몸을 움찔거렸고, 아이는 마침내 무언가 개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나무를 두르고 있는 철사 울타리를 서둘러 넘어가 개를 안아올렸다. 아이는 그들만의 은어로 몇 마디 개를 칭찬한 후 개를 내려놓고 줄을 잡았으며, 둘은 즐겁게 서쪽으로 피프스 애비뉴와 센트럴파크를 향해 걸어가며 주이의 시선에서 벗어났다. 주이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어 둘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는 것처럼, 창유리 사이 가로대에 반사적으로 손을 올렸다. 그런데 그 손엔 시가가 쥐여 있었고 주저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다. 그는 시가를 한 모금 빨았다. "젠장." 그가 말했다. "세상엔 좋은 것들도 있어, 진짜 좋은 것들 말이야. 우리 모두 바보 멍청이들이라 딴 길로 새버리지만. 늘, 늘, 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에고로 끌어당기면서." -192, 193p
어쩌면 우리는 오래 전 샐린저가 경고한 세상을 이미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호밀밭을 지키는 단 한 명의 파수꾼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의 온갖 순수한 것들이 절벽으로 밀려 떨어지는, 그런 세상을.
어쩌면 우리는 오래 전 샐린저가 경고한 세상을 이미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호밀밭을 지키는 단 한 명의 파수꾼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의 온갖 순수한 것들이 절벽으로 밀려 떨어지는, 그런 세상을.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023년 11월 11일
 0
0
 0
0
김성호님의 다른 게시물

김성호
@goldstarsky
한국 진보정치는 폭망했다. 한때 비례대표 투표율 10%를 넘나든 진보정당, 또 교섭단체까지 바라봤던 정의당의 오늘은 국회의원 0명, 대선 득표율 0%대다. 노동, 생태, 복지, 소수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페미니즘 의제만 붙들고 있단 시각도 팽배하다.
저자는 비례위성정당 난립, 재정적 파탄, 청년여성의원에 쏟아진 비난, 코로나19로 조직이 멈춘 영향, 당대표의 성추행, 물질적 기반 해체로 인한 악순환 등을 하나씩 풀어간다. 이어 진보정당이 영향력을 키우기 어려운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다.
실망이다. 무엇보다 정의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이 얼마 없단 게 그렇다. 페미니즘이 다른 의제를 압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 없단 입장을 견지한다.
납득할 수 없다. 세상이 정의당을 망치기 전에, 그 스스로 망쳤다고 여겨서다. 반성과 분석을 원했으나 변명과 항변 뿐. 정의당, 또 그 지지자와 먼 거리만을 확인한다.
저자는 비례위성정당 난립, 재정적 파탄, 청년여성의원에 쏟아진 비난, 코로나19로 조직이 멈춘 영향, 당대표의 성추행, 물질적 기반 해체로 인한 악순환 등을 하나씩 풀어간다. 이어 진보정당이 영향력을 키우기 어려운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다.
실망이다. 무엇보다 정의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이 얼마 없단 게 그렇다. 페미니즘이 다른 의제를 압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 없단 입장을 견지한다.
납득할 수 없다. 세상이 정의당을 망치기 전에, 그 스스로 망쳤다고 여겨서다. 반성과 분석을 원했으나 변명과 항변 뿐. 정의당, 또 그 지지자와 먼 거리만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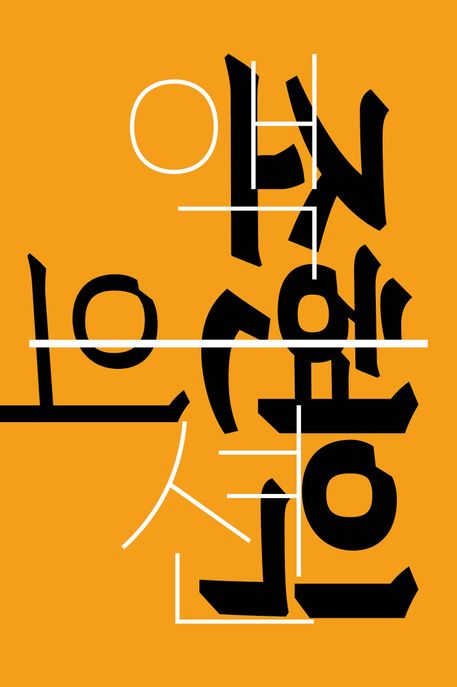
조현익의 액션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4주 전
 0
0
 0
0

김성호
@goldstarsky
조숙은 불행한 아이의 방어기제다. 두터운 외피를 갑주처럼 두르는 일이다. 판단할 수 없는 걸 판단하고 감내할 수 없는 걸 감내하려 힘을 다해 쌓은 벽이다. 오늘의 생존과 내일의 생장을 바꾸는 것이다. 성벽 바깥, 찬란한 미래를.
<새의 선물>은 성장담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다. 생엔 의미가 있고 사랑은 아름답다 말하는 이와 소설 속 진희는 대척점에 있다. 기대하지 않음으로 실망하지도 않는 것이 열둘, 또 서른여덟 진희의 생존법이다. 열둘 진희가 외가를 제 집으로 여길 때쯤 아버지는 찾아온다. 서른 여덟 진희는 여전히 사랑을 믿지 않는다. 구태여 처음과 끝에 불유쾌한 연애를 둔 것도 마찬가지. 성벽 바깥, 그러니까 생이란 늘 악의적이니.
나는 반대한다. 기대 않고 실망도 않기보다 기대하고 실망하는 편이 낫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그 또한 확신할 수 없는 건 나 역시 생에는 이면이 있다고 믿고 있는 탓이다. 진희처럼.
<새의 선물>은 성장담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다. 생엔 의미가 있고 사랑은 아름답다 말하는 이와 소설 속 진희는 대척점에 있다. 기대하지 않음으로 실망하지도 않는 것이 열둘, 또 서른여덟 진희의 생존법이다. 열둘 진희가 외가를 제 집으로 여길 때쯤 아버지는 찾아온다. 서른 여덟 진희는 여전히 사랑을 믿지 않는다. 구태여 처음과 끝에 불유쾌한 연애를 둔 것도 마찬가지. 성벽 바깥, 그러니까 생이란 늘 악의적이니.
나는 반대한다. 기대 않고 실망도 않기보다 기대하고 실망하는 편이 낫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그 또한 확신할 수 없는 건 나 역시 생에는 이면이 있다고 믿고 있는 탓이다. 진희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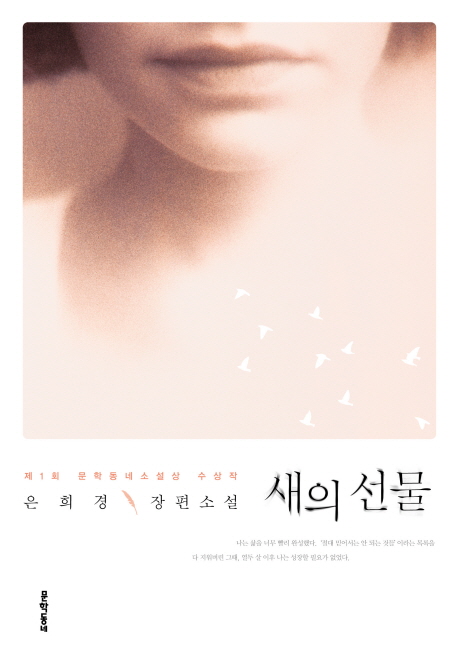
새의 선물

1명이 좋아해요
1개월 전
 1
1
 0
0

김성호
@goldstarsky
다큐멘터리 감독 이은혜와 마주 앉은 일이 있다. 그는 영화제가 끝나면 곧 출국할 예정이라 했는데, 한국에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때문이라 했다. 동성 간 결혼을 한국은 막고, 미국은 허용한단 이야기. 그러고보면 몇년 전 그런 뉴스를 접한 것도 같았다.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50개 주 모두에서 합법화된 동성결혼 이야기를 나는 저기 케냐 북부 자연보호구역에서 기린 개체수가 급감한다는 사실처럼 여겼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테니까. 그러나 가까운 이들마저,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들까지도 동성애에 혐오를 감추지 않으니 나는 이것이 더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혐오가 인간을 잠식하는 비결이 무지와 무관심, 쫄보근성에 있단 걸 알기에 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했다.
레즈비언도 산부인과도 관심 없는 내게 이 또한 사람과 병원의 이야기란 걸 알게 해줬다. 여기까지.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50개 주 모두에서 합법화된 동성결혼 이야기를 나는 저기 케냐 북부 자연보호구역에서 기린 개체수가 급감한다는 사실처럼 여겼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테니까. 그러나 가까운 이들마저,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들까지도 동성애에 혐오를 감추지 않으니 나는 이것이 더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혐오가 인간을 잠식하는 비결이 무지와 무관심, 쫄보근성에 있단 걸 알기에 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했다.
레즈비언도 산부인과도 관심 없는 내게 이 또한 사람과 병원의 이야기란 걸 알게 해줬다. 여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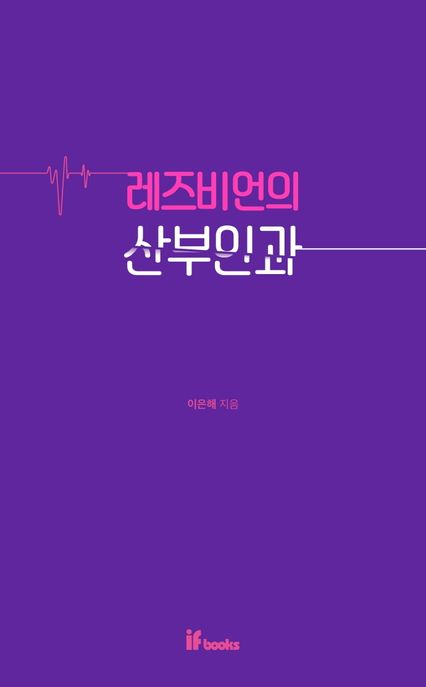
레즈비언의 산부인과


2명이 좋아해요
1개월 전
 2
2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