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숲
@winterforest
+ 팔로우


여행에서 돌아오는 낮 비행기에서 운 좋게도 6화 짜리 시리즈인 이 책 원작의 드라마를 끝까지 볼 수 있었다. 책 두 권을 모두 읽고 돌이켜보니, 드라마 쪽이 조금 더 촘촘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글은 영상보다 독자가 채워넣을 부분이 많다고들 하지만, 그보다는 아마 20년이라는 시간차가 만들어낸 어떤 간극 같기도 하다. 20대부터 결혼 압박에 시달린다든가, 역사적/정치적 반감을 개인의 연애사까지 확장한다든가, 민준의 오랜 짝사랑과 일방적인 청혼이라든가, 책에는 2000년대에 20대를 보낸 나로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드라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두 주인공의 상황과 성격 차이로 풀어내며 이야기가 더 설득력을 갖춘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플라이북이 던진 숙제 같은 책을 끝냈군. ㅎㅎ
어쨌든 이렇게 플라이북이 던진 숙제 같은 책을 끝냈군. ㅎㅎ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0개월 전
 0
0
 0
0
겨울숲님의 다른 게시물

겨울숲
@winterforest
젊은 작가가 상도 받고 여러 평론가들이 극찬도 했다길래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솔직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지루한 건가, 작가가 학자들을 등장시켜 온갖 텍스트를 인용하는데 내가 그걸 잘 몰라서 지루한 건가, 지적 허영을 허용하는 이야기 자체에 대해 내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가 고민하고 의심하며 절반을 읽었다.
하지만 모두 읽고 나니 평이 좋은 이유가 이해는 되더라. 이전에 읽었던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 떠오르기도 하는, 인용과 번역과 오해 또는 재해석과 창작과 거짓말을 넘나드는 작가 연구는 이야기의 줄기를 이룬다. 그리고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사랑은 모든 것을 혼란시키지 않고 섞는다”는 문장은 주인공 도이치의 괴테 이론과, 단골 술집과, 좋아하는 칵테일과, 뒤로 가며 밝혀지는 그의 여러 인간관계들과, 아내가 취미로 만드는 테라리움과, 오랜 지인이나 딸의 비밀들까지 모든 것을 관통한다. 다 읽고 나서야 그 짜임새와 은유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작가의 치밀함에 조금 감탄하게 된달까. 다시 읽으면 또 숨은 것들을 찾을 수 있어 즐거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쩐지 다시 읽지는 않을 거라는 예감도 든다. 후후.
하지만 모두 읽고 나니 평이 좋은 이유가 이해는 되더라. 이전에 읽었던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 떠오르기도 하는, 인용과 번역과 오해 또는 재해석과 창작과 거짓말을 넘나드는 작가 연구는 이야기의 줄기를 이룬다. 그리고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사랑은 모든 것을 혼란시키지 않고 섞는다”는 문장은 주인공 도이치의 괴테 이론과, 단골 술집과, 좋아하는 칵테일과, 뒤로 가며 밝혀지는 그의 여러 인간관계들과, 아내가 취미로 만드는 테라리움과, 오랜 지인이나 딸의 비밀들까지 모든 것을 관통한다. 다 읽고 나서야 그 짜임새와 은유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작가의 치밀함에 조금 감탄하게 된달까. 다시 읽으면 또 숨은 것들을 찾을 수 있어 즐거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쩐지 다시 읽지는 않을 거라는 예감도 든다. 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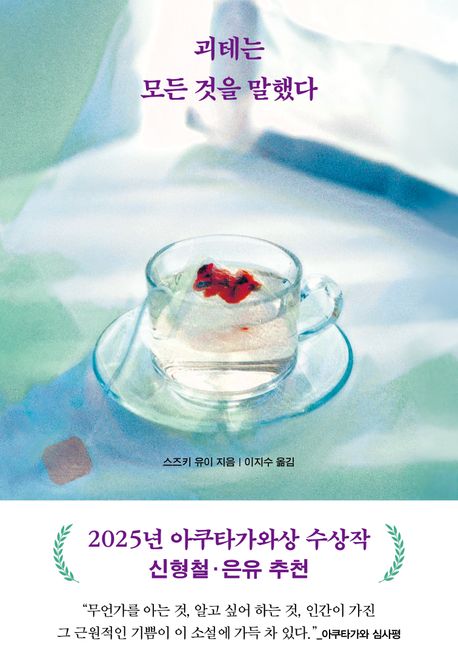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3일 전
 0
0
 0
0

겨울숲
@winterforest
어린이를 어른이 되는 과정의 일부인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준 작가님. 일과 생활 속에 그런 생각과 고민이 녹아, 어린이와 소수들을 위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진심이 느껴지는 글.

어떤 어른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주 전
 0
0
 0
0

겨울숲
@winterforest
허무에 관한 짧은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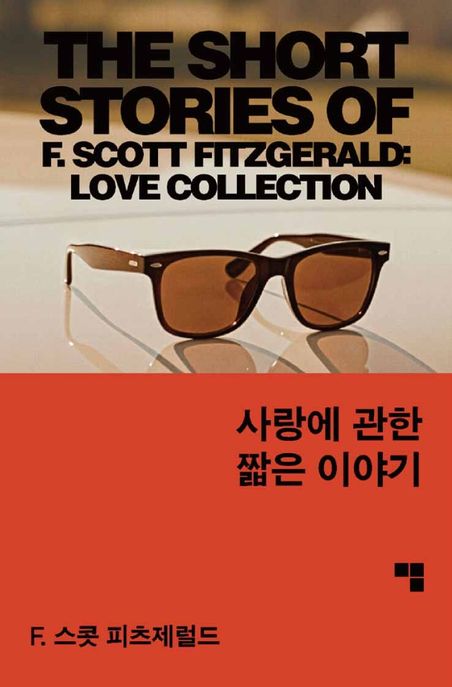
사랑에 관한 짧은 이야기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주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