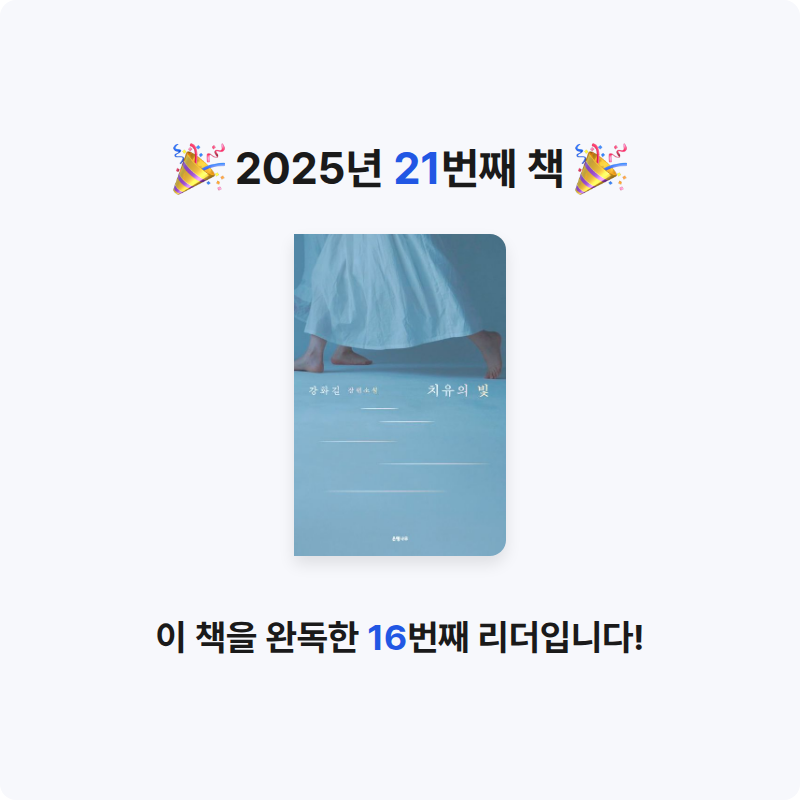수지
@soojiht4a
+ 팔로우


"여기서 절대악이란 악한 동기로 이해되거나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것으로 묘사된다. 바로 그 때문에 절대악은 용서하거나 응징할 수 없다. 절대악은 인간의 악한 동기와 무관하므로 인간의 죄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그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절대악의 내용은 '인간을 잉여적 존재,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체계'와 연결된다."
"절대악이란 거대한 악을 의미하는 것으로,즉 악의 크기 내성을 말한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 탈출구인 죽음도 방해 정도로 편히 죽지도 못하는 체제, 어떠한 탈출도 허용되지 않는 최악의 지경이리는 말이다. 이 개념과 관련하여 아렌트는 정치 라는 어휘를 등장시킨다. 수용소는 정치가 완전히 중지된 곳이며. 인간이 인간이기를 멈춘 것은 정치의 중지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을."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개념을 말과 사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의도한 점이 있다. 나치스의 만행이 특수한 지정학적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 아이히만의 무사유는 현대인 누구에게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 정치적 행위의 바탕이 되는 사유와 판단의 작용 없이도 사회 내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흉악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러한 일이나 책임을 조직이나 사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각을 멈추고 기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었다. '악(evil'이란 말이 지칭하는 나쁨의 크기가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성과 직결된다는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악의 평범성'이다."
"아이히민은 이처럼 많은 고위직과 사교모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 더욱이 이들이 최종해결책이라는 피투성이의 문제를 놓고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자기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히만은 "당시 나는 일종의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과 같은 것을 느꼈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느꼈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에게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의 청을 받아들여 십자가 사형선고를 내린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 이후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며 스스로 면책했던 것처럼,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실무를 진행해야 하는 죄를 회의에 참석한 고위직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죄책감으로부터, 즉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회의 이후 아이히만은 모든 일이 점점 더 쉬워지고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말이 하는 역할은 현실의 참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말은 우리를 현실과 연결한다. 나치스가 언어 규칙을 만든 이유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절대악이란 거대한 악을 의미하는 것으로,즉 악의 크기 내성을 말한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 탈출구인 죽음도 방해 정도로 편히 죽지도 못하는 체제, 어떠한 탈출도 허용되지 않는 최악의 지경이리는 말이다. 이 개념과 관련하여 아렌트는 정치 라는 어휘를 등장시킨다. 수용소는 정치가 완전히 중지된 곳이며. 인간이 인간이기를 멈춘 것은 정치의 중지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을."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개념을 말과 사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의도한 점이 있다. 나치스의 만행이 특수한 지정학적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 아이히만의 무사유는 현대인 누구에게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 정치적 행위의 바탕이 되는 사유와 판단의 작용 없이도 사회 내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흉악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러한 일이나 책임을 조직이나 사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각을 멈추고 기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었다. '악(evil'이란 말이 지칭하는 나쁨의 크기가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성과 직결된다는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악의 평범성'이다."
"아이히민은 이처럼 많은 고위직과 사교모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 더욱이 이들이 최종해결책이라는 피투성이의 문제를 놓고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자기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히만은 "당시 나는 일종의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과 같은 것을 느꼈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느꼈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에게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의 청을 받아들여 십자가 사형선고를 내린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 이후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며 스스로 면책했던 것처럼,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실무를 진행해야 하는 죄를 회의에 참석한 고위직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죄책감으로부터, 즉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회의 이후 아이히만은 모든 일이 점점 더 쉬워지고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말이 하는 역할은 현실의 참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말은 우리를 현실과 연결한다. 나치스가 언어 규칙을 만든 이유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7개월 전
 0
0
 0
0
수지님의 다른 게시물

수지
@soojiht4a

치유의 빛
 읽었어요
읽었어요

1명이 좋아해요
1개월 전
 1
1
 0
0

수지
@soojiht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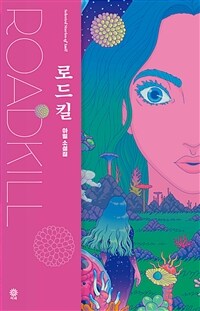
로드킬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개월 전
 0
0
 0
0

수지
@soojiht4a
물론 다른 이들의 불운을 열거해야만 자신의 행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삶을 찾았고, 펜션을 운영하거나 9급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보다는 휠씬 안정적 일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갈채를 받으며 무대에서 퇴장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저는 그중 하나가 아니었을 뿐이라는 현실입니다. 철저한 배경으로서만 존재하다가 소실점 너머로 사라진 다른 수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요.
오래된 단도라든지 수도원의 필사본이라든지 그시대에밖에 볼 수 없었던 중세의 물건 같 은걸 하나 지니고 있을 걸 그랬나. 그래봤자 어떤 고고학자의 유물을 훔쳤다는 오해나 사겠지. 지금 상용하지 않는 먼 옛날의 언어는 혀뿌리에서 녹아 잊힌 지 오래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여기 존재한 다는 것에 어떤 논거가 붙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세상 어느 저울로도 달아볼 수 없는 무한한 공허와 고독을, 무슨 수로 증명한다는 것인가?
"사라질 거니까, 닳아 없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아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그것은 기억하기로 그들이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구두였을 것이며, 안은 숙명이나 법칙과 무관하고 부나 명예나 아름다움에의 탐닉이 아닌, 다만 누군가의 미소와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구두를 지은 것이 그들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않았다.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의 켜가 쌓이고 가난한 구두장이 부부의 작업대에 매일 밤 한 컬레 두 켤레 네 컬레의 구두를 올려놓으며 여덟 컬레에 이른 어느 날 새벽, 부부가 준비한 답례품을 입고 신은뒤 사람의 몸을 갖게 되고 나서도 그들은 최초의 구두를 오랫동안 떠올리곤 했다. 그들이 이 같은 불완전한 몸, 신이 배열하고 조율한 자연의 순 리에 어긋나는 육신을 입게 된 것이 오랜 노동 끝의 선물인지 저주인지, 이 몸의 의미가 어디있는 지는 알 수없으나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최초의 마음을 윗지 않는다면.
오래된 단도라든지 수도원의 필사본이라든지 그시대에밖에 볼 수 없었던 중세의 물건 같 은걸 하나 지니고 있을 걸 그랬나. 그래봤자 어떤 고고학자의 유물을 훔쳤다는 오해나 사겠지. 지금 상용하지 않는 먼 옛날의 언어는 혀뿌리에서 녹아 잊힌 지 오래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여기 존재한 다는 것에 어떤 논거가 붙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세상 어느 저울로도 달아볼 수 없는 무한한 공허와 고독을, 무슨 수로 증명한다는 것인가?
"사라질 거니까, 닳아 없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아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그것은 기억하기로 그들이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구두였을 것이며, 안은 숙명이나 법칙과 무관하고 부나 명예나 아름다움에의 탐닉이 아닌, 다만 누군가의 미소와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구두를 지은 것이 그들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않았다.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의 켜가 쌓이고 가난한 구두장이 부부의 작업대에 매일 밤 한 컬레 두 켤레 네 컬레의 구두를 올려놓으며 여덟 컬레에 이른 어느 날 새벽, 부부가 준비한 답례품을 입고 신은뒤 사람의 몸을 갖게 되고 나서도 그들은 최초의 구두를 오랫동안 떠올리곤 했다. 그들이 이 같은 불완전한 몸, 신이 배열하고 조율한 자연의 순 리에 어긋나는 육신을 입게 된 것이 오랜 노동 끝의 선물인지 저주인지, 이 몸의 의미가 어디있는 지는 알 수없으나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최초의 마음을 윗지 않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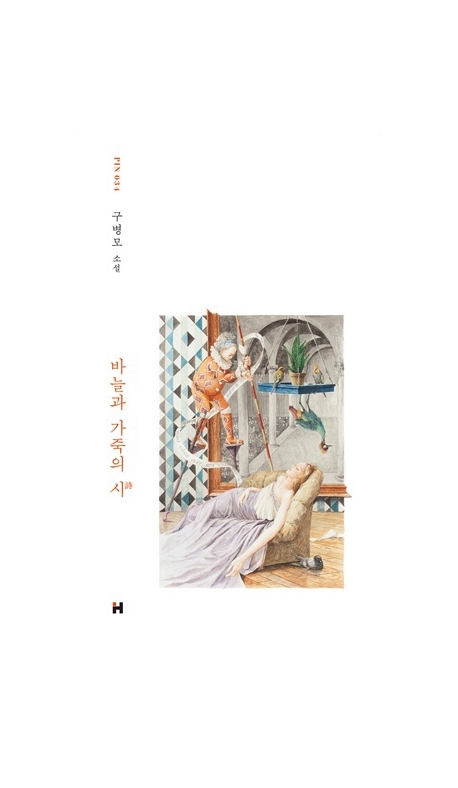
바늘과 가죽의 시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개월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