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빈
@gimyubinv7zw
+ 팔로우


지하철에서 보다, 미간이 찌푸려지길 여러번.
그야말로 이 소설은 불쾌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다 읽고 나니, 이상하리만큼 안타깝다고 해야할까..
그리고 조금이나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린시절 불완전한 성장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몰랐고, 가족에게도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 결국엔 하면 안된다는 방법 혹은 도피처로 그녀의 기억을 채워버렸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사랑, 행복 등은 오랜 시간 삶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큰 발판을 만들어준다.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가난하더라도 따뜻한 환경이나 부유하지만 웃음기 없는 환경이나.. 모든게 완벽한 가정은 없다.
사랑하는 법, 자신을 아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내기 어렵지 아니한가. 아마도..
뭐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다는 . 누구나 좋을 순 없다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그야말로 이 소설은 불쾌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다 읽고 나니, 이상하리만큼 안타깝다고 해야할까..
그리고 조금이나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린시절 불완전한 성장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몰랐고, 가족에게도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 결국엔 하면 안된다는 방법 혹은 도피처로 그녀의 기억을 채워버렸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사랑, 행복 등은 오랜 시간 삶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큰 발판을 만들어준다.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가난하더라도 따뜻한 환경이나 부유하지만 웃음기 없는 환경이나.. 모든게 완벽한 가정은 없다.
사랑하는 법, 자신을 아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내기 어렵지 아니한가. 아마도..
뭐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다는 . 누구나 좋을 순 없다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4시간 전
 0
0
 0
0
김유빈님의 다른 게시물

김유빈
@gimyubinv7zw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결국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화자는 어둡고도 절망적인 분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과연 원도가 찾은건 무엇인가..
화자는 어둡고도 절망적인 분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과연 원도가 찾은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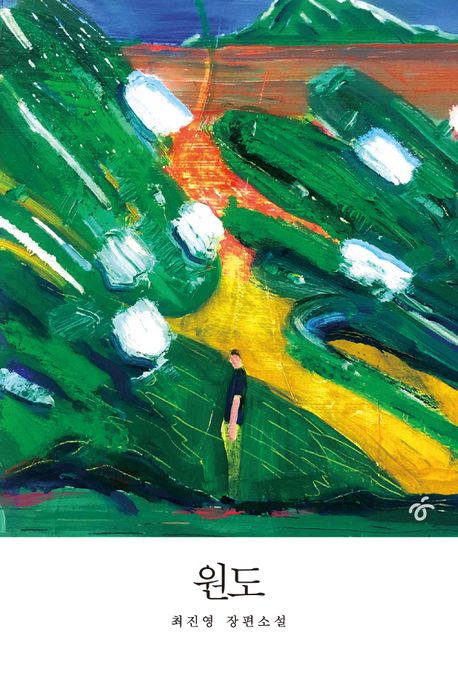
원도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4일 전
 0
0
 0
0

김유빈
@gimyubinv7zw
서른이 되고 저지른 일이 많다.
발 한번 내딛기 어려워 묵혀뒀던 일들을,
까치발만 들고 서 있던 일들을,
이제 발의 모든 밑면을 사용하여 내딛었을 때는, 조금의 짜릿함 용기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나날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나는 까치발로 서 있는게 아닌가 ? 다시 버티고 있는게 아닌가 ?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에 대한 고찰을 종종 하게 되는데 꽤나 어렵다. ‘나를 사랑하기’, ‘나를 알아가기’, ’나와 친해지기‘ 등 모든 성장과정에서 ’나‘는 항상 전제조건이 된다.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회고 하듯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생각도 한 적이 더러 있지만, 막상 생각이 오래가진 않는다. 이 또한 귀찮음일지, 여전히 나와 친해지고 싶지 않은지.. 나의 오랜 숙제와도 같다.
서른이 끝나기 전, 이 과정을 마치고 싶으나 실상 저지른 일이 많아 여전히 7월이 된 지금도 까치발이다.
이 책은 철학적이며, 종교적이고 ‘나의 삶’ 을 끝까지 물고 잡아 늘어지는 듯이 싱클레어 곁에 머무는 것 같다.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나를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를 느끼게 해준다.
오랜만에 어려운 소설이라 내가 글자를 읽고 있는건지 뭔지..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읽어 내려간 결과, 결국엔 ‘나’ 였다.
인생이 지기 전까지 발악하며 탐구해야 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표본과도 같은 책.
다시 ’완독’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며,
주절 주절 글을 써본다.
발 한번 내딛기 어려워 묵혀뒀던 일들을,
까치발만 들고 서 있던 일들을,
이제 발의 모든 밑면을 사용하여 내딛었을 때는, 조금의 짜릿함 용기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나날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나는 까치발로 서 있는게 아닌가 ? 다시 버티고 있는게 아닌가 ?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에 대한 고찰을 종종 하게 되는데 꽤나 어렵다. ‘나를 사랑하기’, ‘나를 알아가기’, ’나와 친해지기‘ 등 모든 성장과정에서 ’나‘는 항상 전제조건이 된다.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회고 하듯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생각도 한 적이 더러 있지만, 막상 생각이 오래가진 않는다. 이 또한 귀찮음일지, 여전히 나와 친해지고 싶지 않은지.. 나의 오랜 숙제와도 같다.
서른이 끝나기 전, 이 과정을 마치고 싶으나 실상 저지른 일이 많아 여전히 7월이 된 지금도 까치발이다.
이 책은 철학적이며, 종교적이고 ‘나의 삶’ 을 끝까지 물고 잡아 늘어지는 듯이 싱클레어 곁에 머무는 것 같다.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나를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를 느끼게 해준다.
오랜만에 어려운 소설이라 내가 글자를 읽고 있는건지 뭔지..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읽어 내려간 결과, 결국엔 ‘나’ 였다.
인생이 지기 전까지 발악하며 탐구해야 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표본과도 같은 책.
다시 ’완독’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며,
주절 주절 글을 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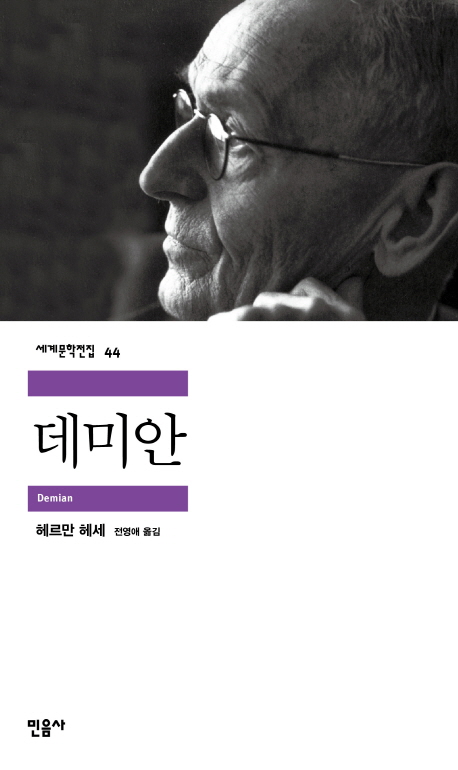
데미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주 전
 0
0
 0
0

김유빈
@gimyubinv7zw
버틴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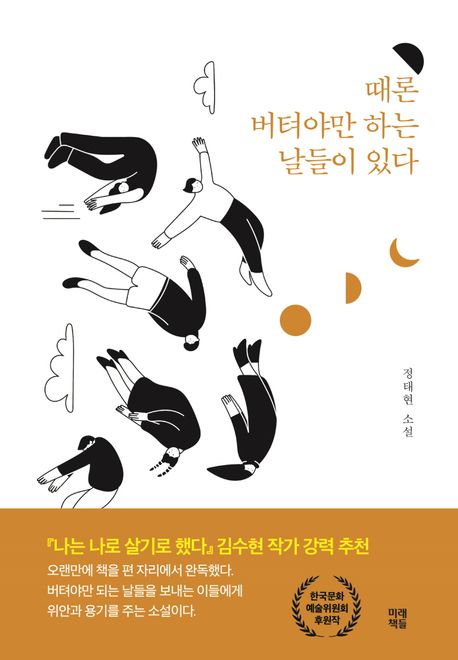
때론 버텨야만 하는 날들이 있다

1명이 좋아해요
2주 전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