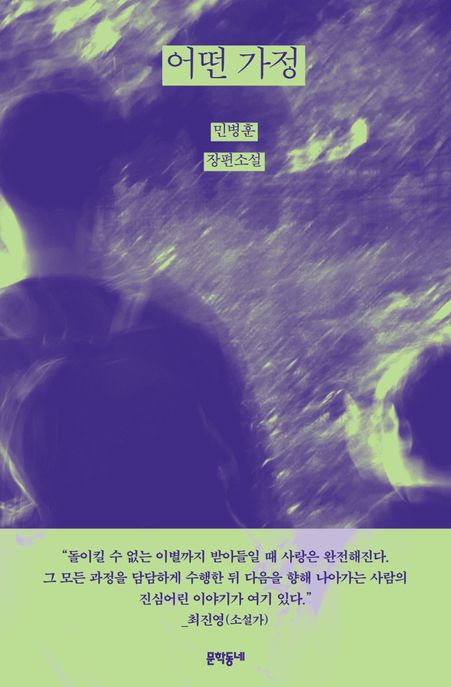시온
@ahrr
+ 팔로우


빗나간 것들 사이에서, 천천히.
이 소설에서는,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상처 앞에 서서, 천천히 그것을 바라보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었다. 아버지의 부재 이후 흩어진 가족들, 서로를 탓하고 멀어졌던 시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꿈꾸지만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
읽는 내내 ‘나’가 묻는 질문들이 낯설지 않았다. 과연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만 멀어지는 이 감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민병훈 작가는 이 물음들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는다. 대신 과거와 현재를 겹쳐 놓으며, 빗나간 순간들을 하나씩 들여다본다. 달라질 수도 있었을 가능성들을 조용히 가정해보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받아들여간다.
누나가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준’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느끼며, ‘나’는 계속 걷는다. 그 여정이 외롭고 더디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에 있기를 선택한다.
이 소설을 읽으며 나 역시 내 안의 무언가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오래 외면해왔던 질문들,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들. 그것들을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책의 마지막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명확한 결말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어떤 시간. 완전히 치유되지도,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도 모르겠다.
민병훈 작가는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보여주며, 당신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당신의 이야기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그 다정한 손길이, 오래 남을 것 같다..
이 소설에서는,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상처 앞에 서서, 천천히 그것을 바라보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었다. 아버지의 부재 이후 흩어진 가족들, 서로를 탓하고 멀어졌던 시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꿈꾸지만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
읽는 내내 ‘나’가 묻는 질문들이 낯설지 않았다. 과연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만 멀어지는 이 감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민병훈 작가는 이 물음들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는다. 대신 과거와 현재를 겹쳐 놓으며, 빗나간 순간들을 하나씩 들여다본다. 달라질 수도 있었을 가능성들을 조용히 가정해보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받아들여간다.
누나가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준’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느끼며, ‘나’는 계속 걷는다. 그 여정이 외롭고 더디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에 있기를 선택한다.
이 소설을 읽으며 나 역시 내 안의 무언가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오래 외면해왔던 질문들,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들. 그것들을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책의 마지막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명확한 결말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어떤 시간. 완전히 치유되지도,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도 모르겠다.
민병훈 작가는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보여주며, 당신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당신의 이야기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그 다정한 손길이, 오래 남을 것 같다..
👍
이별을 극복하고 싶을 때
추천!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9시간 전
 0
0
 0
0
시온님의 다른 게시물

시온
@ahrr
『자기 앞의 생』은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에밀아자르는 보여준다.
주인공 모모는 열네 살이다. 창녀의 아들이고, 아랍인이고, 버림받은 아이다. 로자 아줌마는 창녀 출신의 늙은 유태인 여자다. 너무 뚱뚱해서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밤마다 독일군이 올까봐 두려워 떤다. 세상이 보기엔 둘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둘은 서로를 사랑한다.
모모가 금발의 예쁜 여자, 나딘을 만났던 장면은 참 가슴이 아렸다. 잠깐의 친절에 희망을 품었던 모모.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모모는 그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살아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모모에게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모모에게는 로자 아줌마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오히려 망가진 사람. 그런 아줌마를 모모는 사랑한다.
“내게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로자 아줌마 곁에 앉아 있고 싶다는 것.”
로자 아줌마가 무서울 때 숨는 지하실, 유태인의 둥지. 그곳에서 모모는 묻는다. “뭐가 무서운데요?” 아줌마는 대답한다. “무서워하는 데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다.” 이 말이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 가장 진실되다고 모모는 말한다.
로자 아줌마가 죽었을 때, 모모는 아줌마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로자 아줌마가 위안을 얻던 그 지하실, 유태인의 둥지로 모신다. 로자 아줌마 곁에 누워 함께 있어준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열네 살 소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 한다.”가 이 소설의 전부다. 모모는 묻는다.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냐고. 대답은 명확하다. 살 수는 있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은 잔인하다. 모모 같은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강하다. 로자 아줌마와 모모의 사랑처럼.
나는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것이니까.
주인공 모모는 열네 살이다. 창녀의 아들이고, 아랍인이고, 버림받은 아이다. 로자 아줌마는 창녀 출신의 늙은 유태인 여자다. 너무 뚱뚱해서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밤마다 독일군이 올까봐 두려워 떤다. 세상이 보기엔 둘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둘은 서로를 사랑한다.
모모가 금발의 예쁜 여자, 나딘을 만났던 장면은 참 가슴이 아렸다. 잠깐의 친절에 희망을 품었던 모모.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모모는 그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살아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모모에게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모모에게는 로자 아줌마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오히려 망가진 사람. 그런 아줌마를 모모는 사랑한다.
“내게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로자 아줌마 곁에 앉아 있고 싶다는 것.”
로자 아줌마가 무서울 때 숨는 지하실, 유태인의 둥지. 그곳에서 모모는 묻는다. “뭐가 무서운데요?” 아줌마는 대답한다. “무서워하는 데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다.” 이 말이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 가장 진실되다고 모모는 말한다.
로자 아줌마가 죽었을 때, 모모는 아줌마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로자 아줌마가 위안을 얻던 그 지하실, 유태인의 둥지로 모신다. 로자 아줌마 곁에 누워 함께 있어준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열네 살 소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 한다.”가 이 소설의 전부다. 모모는 묻는다.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냐고. 대답은 명확하다. 살 수는 있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은 잔인하다. 모모 같은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강하다. 로자 아줌마와 모모의 사랑처럼.
나는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것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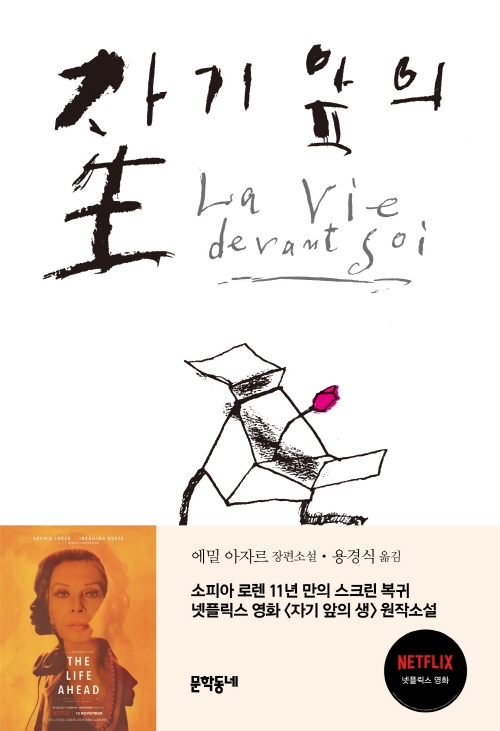
자기 앞의 生
👍
힐링이 필요할 때
추천!

1명이 좋아해요
3일 전
 1
1
 0
0

시온
@ahrr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SF라는 장르를 빌렸지만, 결국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고, 시간의 시차를 다루지만, 그 안에서 김초엽이 묻는 질문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불완전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타자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빛의 속도로 갈 수 없기에 생기는 시차는 곧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의 은유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결국 각자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
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 안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지쳐 보이는 안나는 마지막 여행을 허락해달라고 청한다. 시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안나의 마지막 여행은, 그 불가능을 뛰어넘으려는 처절한 시도였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불가능 앞에 서 있다. 함께할 수 없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타자, 완벽하지 않은 세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읽는 내내 위로받았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어도 괜찮다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김초엽은 말해준다. 불가능을 껴안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김초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간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함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기에 생기는 시차는 곧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의 은유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결국 각자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
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 안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지쳐 보이는 안나는 마지막 여행을 허락해달라고 청한다. 시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안나의 마지막 여행은, 그 불가능을 뛰어넘으려는 처절한 시도였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불가능 앞에 서 있다. 함께할 수 없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타자, 완벽하지 않은 세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읽는 내내 위로받았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어도 괜찮다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김초엽은 말해준다. 불가능을 껴안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김초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간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함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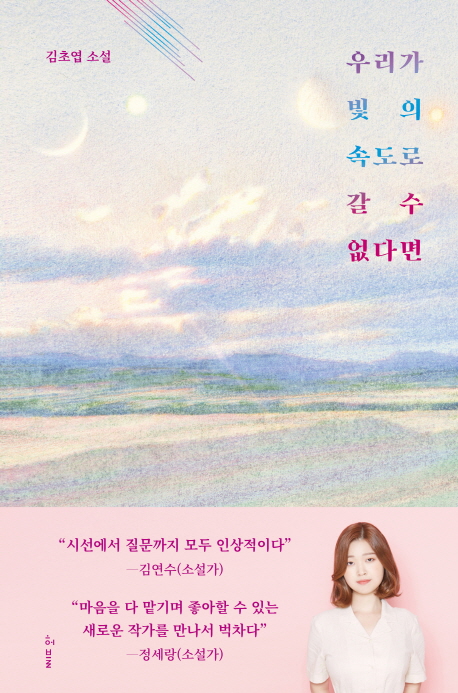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1명이 좋아해요
4일 전
 1
1
 0
0

시온
@ahrr
퐁, 하고 사라지는 것들
이유리 작가의 『비눗방울 퐁』을 읽으며 자꾸만 웃었다. 슬픈 이야기인데도.
이별에 대한 소설집이었다. 사랑이 끝나고, 사람이 떠나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야기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다. 이유리 작가는 이별의 고통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냈다.
특히 좋았던 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몇몇 작품에서 보이는 그들의 사랑은 로맨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다. 집세와 생활비를 걱정하고, 지친 하루를 서로 위로하며 버티는 모습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마음이 아렸다.
그러면서도 이유리 작가는 SF적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사랑의 기억을 남에게 팔아버리고, 이별의 감정을 우려내어 술을 빚고, 비눗방울이 되는 약을 먹는다. 현실은 냉정하지만 상상은 따뜻했다. 그 간극 속에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을 견뎌냈다.
책을 덮고 나니 제목의 의미가 선명해졌다.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퐁 하고 사라지는 것들. 사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유리 작가는 그 남은 것들을 명랑하게 보듬어주었다.
이유리 작가의 『비눗방울 퐁』을 읽으며 자꾸만 웃었다. 슬픈 이야기인데도.
이별에 대한 소설집이었다. 사랑이 끝나고, 사람이 떠나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야기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다. 이유리 작가는 이별의 고통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냈다.
특히 좋았던 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몇몇 작품에서 보이는 그들의 사랑은 로맨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다. 집세와 생활비를 걱정하고, 지친 하루를 서로 위로하며 버티는 모습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마음이 아렸다.
그러면서도 이유리 작가는 SF적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사랑의 기억을 남에게 팔아버리고, 이별의 감정을 우려내어 술을 빚고, 비눗방울이 되는 약을 먹는다. 현실은 냉정하지만 상상은 따뜻했다. 그 간극 속에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을 견뎌냈다.
책을 덮고 나니 제목의 의미가 선명해졌다.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퐁 하고 사라지는 것들. 사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유리 작가는 그 남은 것들을 명랑하게 보듬어주었다.

비눗방울 퐁



3명이 좋아해요
2주 전
 3
3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