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
@ahrr
+ 팔로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끝까지 이 여자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는 거였다. 분명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한 그 순수한 절망이 계속 마음을 건드렸다. 특히 마지막에 요셉이 진실을 깨닫고 나서의 반응들.. 그 처참함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 같은 것까지 느껴져서 더욱 복잡했다.
나미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오래 남는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그녀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광기와 한 끗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애의 모성애도 가슴을 저몄다. 아이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뿐.. 결국 그녀도 사랑하고 싶었던 것뿐이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다.
90년대 말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이 모든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시절의 공기, 뭔가 끝나가는 것들에 대한 허무함과 동시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그 모든 것이 소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였다. 이 여자들의 사랑이 비뚤어졌다고 해서, 그 감정 자체가 가짜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무서웠다.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이 보여준 그 복잡한 감정들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증오와 연민, 그리고 어떤 이해 같은 것들이 뒤섞인..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니,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경계선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을 단순히 미치광이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무엇보다, 이희주라는 작가가 보여준 인간에 대한 시선이 인상 깊었다.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인간의 어둡고 복잡한 면까지도 그대로 껴안으려는 그 용기가 대단했다.
한동안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강렬하고, 아프고, 아름다운 소설이었다.
나미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오래 남는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그녀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광기와 한 끗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애의 모성애도 가슴을 저몄다. 아이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뿐.. 결국 그녀도 사랑하고 싶었던 것뿐이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다.
90년대 말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이 모든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시절의 공기, 뭔가 끝나가는 것들에 대한 허무함과 동시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그 모든 것이 소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였다. 이 여자들의 사랑이 비뚤어졌다고 해서, 그 감정 자체가 가짜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무서웠다.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이 보여준 그 복잡한 감정들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증오와 연민, 그리고 어떤 이해 같은 것들이 뒤섞인..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니,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경계선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을 단순히 미치광이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무엇보다, 이희주라는 작가가 보여준 인간에 대한 시선이 인상 깊었다.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인간의 어둡고 복잡한 면까지도 그대로 껴안으려는 그 용기가 대단했다.
한동안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강렬하고, 아프고, 아름다운 소설이었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시간 전
 0
0
 0
0
시온님의 다른 게시물

시온
@ahrr
빗나간 것들 사이에서, 천천히.
이 소설에서는,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상처 앞에 서서, 천천히 그것을 바라보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었다. 아버지의 부재 이후 흩어진 가족들, 서로를 탓하고 멀어졌던 시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꿈꾸지만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
읽는 내내 ‘나’가 묻는 질문들이 낯설지 않았다. 과연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만 멀어지는 이 감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민병훈 작가는 이 물음들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는다. 대신 과거와 현재를 겹쳐 놓으며, 빗나간 순간들을 하나씩 들여다본다. 달라질 수도 있었을 가능성들을 조용히 가정해보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받아들여간다.
누나가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준’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느끼며, ‘나’는 계속 걷는다. 그 여정이 외롭고 더디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에 있기를 선택한다.
이 소설을 읽으며 나 역시 내 안의 무언가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오래 외면해왔던 질문들,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들. 그것들을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책의 마지막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명확한 결말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어떤 시간. 완전히 치유되지도,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도 모르겠다.
민병훈 작가는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보여주며, 당신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당신의 이야기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그 다정한 손길이, 오래 남을 것 같다..
이 소설에서는,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상처 앞에 서서, 천천히 그것을 바라보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었다. 아버지의 부재 이후 흩어진 가족들, 서로를 탓하고 멀어졌던 시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꿈꾸지만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
읽는 내내 ‘나’가 묻는 질문들이 낯설지 않았다. 과연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만 멀어지는 이 감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민병훈 작가는 이 물음들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는다. 대신 과거와 현재를 겹쳐 놓으며, 빗나간 순간들을 하나씩 들여다본다. 달라질 수도 있었을 가능성들을 조용히 가정해보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받아들여간다.
누나가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준’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느끼며, ‘나’는 계속 걷는다. 그 여정이 외롭고 더디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에 있기를 선택한다.
이 소설을 읽으며 나 역시 내 안의 무언가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오래 외면해왔던 질문들,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들. 그것들을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책의 마지막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명확한 결말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어떤 시간. 완전히 치유되지도,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도 모르겠다.
민병훈 작가는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보여주며, 당신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당신의 이야기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그 다정한 손길이, 오래 남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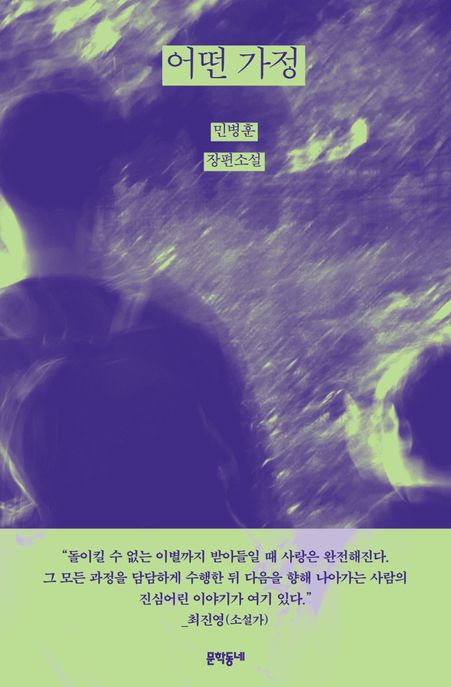
어떤 가정
👍
이별을 극복하고 싶을 때
추천!

1명이 좋아해요
6일 전
 1
1
 0
0

시온
@ahrr
『자기 앞의 생』은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에밀아자르는 보여준다.
주인공 모모는 열네 살이다. 창녀의 아들이고, 아랍인이고, 버림받은 아이다. 로자 아줌마는 창녀 출신의 늙은 유태인 여자다. 너무 뚱뚱해서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밤마다 독일군이 올까봐 두려워 떤다. 세상이 보기엔 둘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둘은 서로를 사랑한다.
모모가 금발의 예쁜 여자, 나딘을 만났던 장면은 참 가슴이 아렸다. 잠깐의 친절에 희망을 품었던 모모.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모모는 그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살아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모모에게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모모에게는 로자 아줌마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오히려 망가진 사람. 그런 아줌마를 모모는 사랑한다.
“내게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로자 아줌마 곁에 앉아 있고 싶다는 것.”
로자 아줌마가 무서울 때 숨는 지하실, 유태인의 둥지. 그곳에서 모모는 묻는다. “뭐가 무서운데요?” 아줌마는 대답한다. “무서워하는 데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다.” 이 말이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 가장 진실되다고 모모는 말한다.
로자 아줌마가 죽었을 때, 모모는 아줌마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로자 아줌마가 위안을 얻던 그 지하실, 유태인의 둥지로 모신다. 로자 아줌마 곁에 누워 함께 있어준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열네 살 소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 한다.”가 이 소설의 전부다. 모모는 묻는다.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냐고. 대답은 명확하다. 살 수는 있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은 잔인하다. 모모 같은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강하다. 로자 아줌마와 모모의 사랑처럼.
나는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것이니까.
주인공 모모는 열네 살이다. 창녀의 아들이고, 아랍인이고, 버림받은 아이다. 로자 아줌마는 창녀 출신의 늙은 유태인 여자다. 너무 뚱뚱해서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밤마다 독일군이 올까봐 두려워 떤다. 세상이 보기엔 둘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둘은 서로를 사랑한다.
모모가 금발의 예쁜 여자, 나딘을 만났던 장면은 참 가슴이 아렸다. 잠깐의 친절에 희망을 품었던 모모.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모모는 그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살아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모모에게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모모에게는 로자 아줌마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오히려 망가진 사람. 그런 아줌마를 모모는 사랑한다.
“내게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로자 아줌마 곁에 앉아 있고 싶다는 것.”
로자 아줌마가 무서울 때 숨는 지하실, 유태인의 둥지. 그곳에서 모모는 묻는다. “뭐가 무서운데요?” 아줌마는 대답한다. “무서워하는 데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다.” 이 말이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 가장 진실되다고 모모는 말한다.
로자 아줌마가 죽었을 때, 모모는 아줌마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로자 아줌마가 위안을 얻던 그 지하실, 유태인의 둥지로 모신다. 로자 아줌마 곁에 누워 함께 있어준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열네 살 소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 한다.”가 이 소설의 전부다. 모모는 묻는다.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냐고. 대답은 명확하다. 살 수는 있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은 잔인하다. 모모 같은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강하다. 로자 아줌마와 모모의 사랑처럼.
나는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것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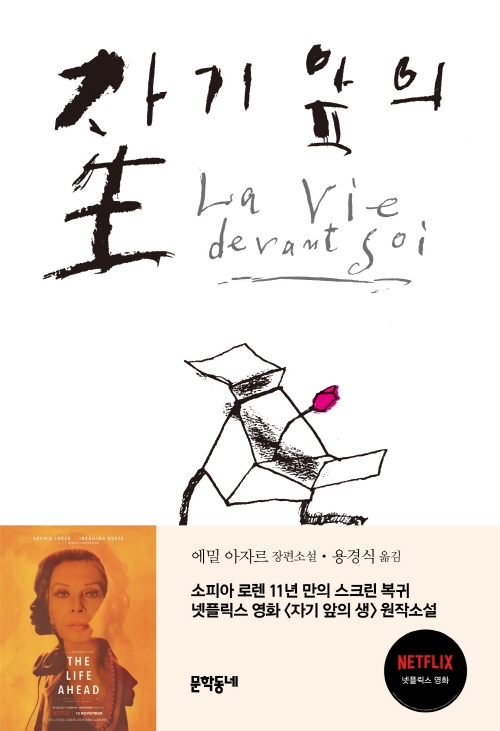
자기 앞의 生
👍
힐링이 필요할 때
추천!

1명이 좋아해요
1주 전
 1
1
 0
0

시온
@ahrr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SF라는 장르를 빌렸지만, 결국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고, 시간의 시차를 다루지만, 그 안에서 김초엽이 묻는 질문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불완전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타자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빛의 속도로 갈 수 없기에 생기는 시차는 곧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의 은유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결국 각자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
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 안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지쳐 보이는 안나는 마지막 여행을 허락해달라고 청한다. 시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안나의 마지막 여행은, 그 불가능을 뛰어넘으려는 처절한 시도였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불가능 앞에 서 있다. 함께할 수 없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타자, 완벽하지 않은 세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읽는 내내 위로받았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어도 괜찮다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김초엽은 말해준다. 불가능을 껴안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김초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간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함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기에 생기는 시차는 곧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의 은유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결국 각자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
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 안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지쳐 보이는 안나는 마지막 여행을 허락해달라고 청한다. 시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안나의 마지막 여행은, 그 불가능을 뛰어넘으려는 처절한 시도였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불가능 앞에 서 있다. 함께할 수 없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타자, 완벽하지 않은 세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읽는 내내 위로받았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어도 괜찮다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김초엽은 말해준다. 불가능을 껴안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김초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간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함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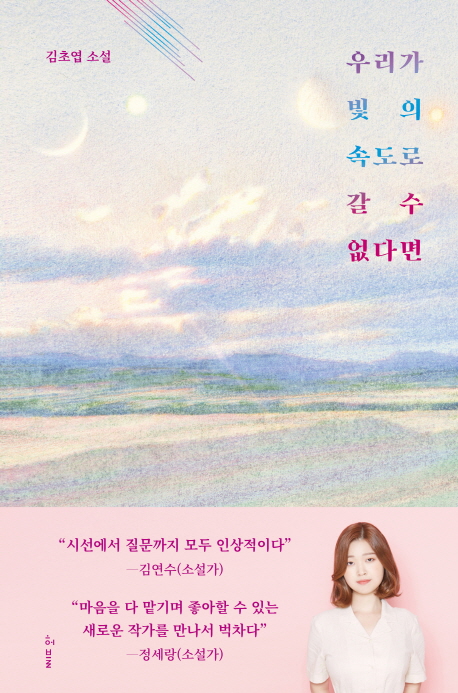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1명이 좋아해요
1주 전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