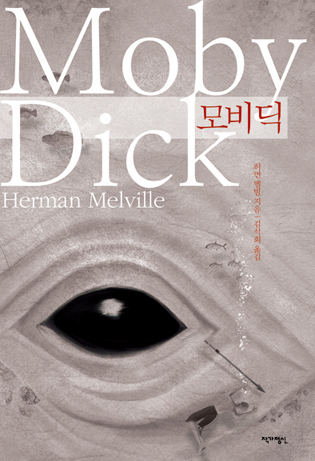예림
@cd4cimmmtzc6
+ 팔로우


소설은 깊다. 그 배경인 대양만큼 넓고, 영광스럽게도 제목을 차지한 백경(白鯨)만큼 거대하다. 소설은 심연을 감춘 맑은 바다에 흩뿌려진 금박 같은 태양의 잔해처럼 영롱한 비유와 잠언들로 빛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가버린 결말에 이르면, 새삼 '일개' 향유고래를 칭한 제목이 묵직하게 가슴이 닿아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허구의 세계의 '리바이어던'이 현실의 독자에게 주는 무게감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마지막 장을 덮자마자, 독자는 묻는다. 40여 년에 걸쳐 모비 딕을 쫓았다는 에이해브의 집념이, 단순히 광기 혹은 증오를 넘어 과연 어느 것에 가까운 형체를 지닌 것이었는지를. 그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감히 또 다은 대문호의 작품을 빌리자면, "그는 무엇으로 살았는가"를 말이다. 700페이지를 거뜬히 넘기는 대작을 시간을 들여 완독했다는 후련함보다, 모비 딕과 함께 솟아오르며 수정처럼 흩날려 떨어지던 파도처럼 줄곧 밀려오고 높아지는 생각에 막막한 침묵이 앞선다.
마지막 장을 덮자마자, 독자는 묻는다. 40여 년에 걸쳐 모비 딕을 쫓았다는 에이해브의 집념이, 단순히 광기 혹은 증오를 넘어 과연 어느 것에 가까운 형체를 지닌 것이었는지를. 그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감히 또 다은 대문호의 작품을 빌리자면, "그는 무엇으로 살았는가"를 말이다. 700페이지를 거뜬히 넘기는 대작을 시간을 들여 완독했다는 후련함보다, 모비 딕과 함께 솟아오르며 수정처럼 흩날려 떨어지던 파도처럼 줄곧 밀려오고 높아지는 생각에 막막한 침묵이 앞선다.



3명이 좋아해요
2017년 3월 23일
 3
3
 0
0
예림님의 다른 게시물

예림
@cd4cimmmtzc6
이전 편까지 돈키호테는 한결같이 한심했고, 처량하리만치 아둔해 보였다. 그러나 조금씩, 이 편력 기사의 잠 못 이루는 밤에 공감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온전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돈키호테와 산초의 모습도 마음을 움직였다. 이윽고 삼손 카라스코에 의해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강'의 여정에선 뭉근한 쓸쓸함마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로소, 알로노 키하노로 '돌아온' 이 기사의 최후에 나는 펑펑 울었다. 1700여 쪽 내내 비웃기도,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때론 연민을 느끼기도 한 이달고의 마지막은 놀랍도록 정중해 더욱 오열하게 했다. 역자의 번역후기마저도 더없이 좋았던 책. 두꺼운 책을 끝냈다는 후련함보다, 더없이 순박하고 충직했던 한 기사와 종자의 기억이 더 남는다. 아마도 오래 지속되리라. 언제고 또 보고 싶은 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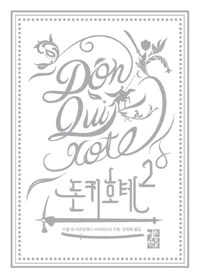
돈키호테 2
 읽었어요
읽었어요

1명이 좋아해요
2017년 3월 23일
 1
1
 0
0

예림
@cd4cimmmtzc6
그들의 '광기'는 유쾌했다. 사실 광기라 이름하기엔 어딘지 거창한 구석이 있었다. 내겐 우스꽝스런 몽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1권인 이 책을 읽을 때까진, 그래서 돈키호테란 인물에 그 어떤 감정적 접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현실적인 구석이라도 있었던 산초라면 모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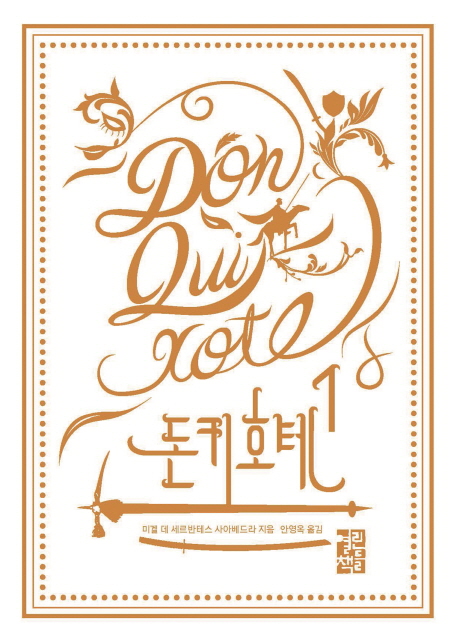
돈키호테 1
 읽었어요
읽었어요

1명이 좋아해요
2017년 3월 23일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